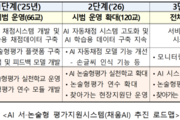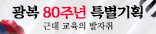
성리학의 영향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 뿌리내린 우리나라에서는 쉽사리 여학교를 설립하기 어려워 기독교 선교사들이 먼저 이 땅의 여성 교육을 시작했다.
1885년에 미국인 스크랜턴 여사가 의사이자 선교사에 임명된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 왔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한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는 “일본에서의 생활은 즐거우며 선교사들의 생활 조건도 훌륭하나, 나는 내 민족(한국인)에게 가서 그들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그녀는 한국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최초로 여성들에게 학교 교육을 시작했다. 1885년 학교를 설립하려 했으나 여성 교육을 기피하는 전통적인 관념과 서양인에 대한 배타성 때문에 학생 확보가 어려웠다. 1886년 5월 31일, 단 한 명의 여성이 첫 학생으로 입학했다.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의 영문 교명에서 여성을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 Womans university를 사용하고 있다.
이후 학부모들의 관심과 스크랜턴 여사의 노력으로 이듬해 학생 수가 일곱 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명성황후가 ‘배꽃같이 순결하며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는 뜻의 ‘이화학당(梨花學堂)’이라는 교명을 내려 오늘날의 이화학교가 됐다.
이때부터 서서히 여성 교육 기관이 생겨났는데, 순헌황귀비(영친왕의 어머니인 엄귀비)가 세운 진명학교와 숙명학교, 미국 선교사 애니 앨러스(Annie J. Ellers)가 세운 정신여학교, 미국 여성 선교사 조세핀 필 캠벨(Josephine Eaton Peel Campbell) 여사가 세운 배화학교가 대표적이다. 이때도 남자와 여자는 엄격히 분리되어 남녀 공학은 한 곳도 없었다.
‘남녀칠세부동석’의 여성교육
우리나라 여성은 신분과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유교 사상에 의해 피해를 받아 매우 차별적 교육을 받았다. 모든 결정이 남성에 의해 이루어져 여성은 부지런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남편과 아이들을 잘 봉양하면 됐고 삼종지도(三從之道)를 강요한 까닭에 여성 교육은 늘 뒷전이었다.
처음으로 여성 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학교를 세웠지만,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스크랜튼 여사. 그녀의 끈임없는 노력으로 여학생이 늘어나긴 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 하여 남녀의 구별을 엄격히 하던 시절로 남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한문과 체육이 문제였다. 교실에 칸막이를 하거나 휘장을 치고 가르쳤다. 또, 기침과 같은 신호에 의해 학생들이 움직였다.
예를 들면 교실에 들어오기 전 ‘교실에 들어간다’는 신호로 기침을 하면 학생들이 얼굴을 책상이나 운동장 쪽을 바라보게 하고,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를 한다’는 신호로 기침을 하면 학생들은 칠판을 바라보며 수업을 받았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기침을 하면 학생들이 얼굴을 돌렸고 선생님은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갔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대면(對面)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교감이 없었다.
한국을 사랑한 스크랜턴 여사
스크랜턴 여사는 1905년 이후 이화학당 교장직을 후배인 룰프 푸라이 단장에게 물려준 후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권유에도 “조선 땅에서 죽겠다”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갔다. 결국 미국으로 가지 않고 평생 지방을 돌아다니며 선교를 했고 수원의 삼일소학당(현재의 매향중‧고)을 설립하는 등의 교육 활동을 펼쳤다.
1909년 10월 8일, 스크렌턴 여사는 25년 가까이 몸 바친 한국 땅에서 눈을 감았다. 평소 그녀가 입버릇처럼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했던 말에 따라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묻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