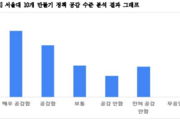십 년 만에 만난 제자로부터 느낀 교사의 보람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우리 가족은 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오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개학을 하기 전에, 그 미안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근사한 외식이었다.
우선 깜짝 쇼를 하기 위해 아이들 몰래 이곳에서 유명한 식당 한곳을 예약해 두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차에 태워 예약해 둔 식당으로 향했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행선지를 물었으나 나는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저녁 시간에도 식당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우선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것 모두를 주문하라고 하였다. 평소 돈 쓰는데 인색한 내 말에 아이들은 의아해하며 평소 먹고 싶은 음식 모두를 시켰다. 어차피 아이들을 위해 돈을 쓰기로 마음먹은 만큼 주문량에 신경 쓰지 않았다.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아이들과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로 그때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가씨 2명이 우리 가족이 앉아 있는 식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화들짝 놀라며 말을 했다.
“혹시 ○○○선생님 아니세요?”
그러고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들이었다. 졸업한 제자들이었다. 졸업한 지 십 년이 지났지만,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너희 이름이 ○○와 ○○지?”
내가 이름을 불러주자 아이들은 놀라운 듯 더 좋아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직 내 마음 한편에 미운 정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돌이켜 보면 담임을 역임하면서 그 당시만큼 힘든 적도 없었던 것 같다. 매일 반복되는 아이들의 사고로 교사로서 환멸을 느낀 적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졸업식 날 그 아이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기보다 오히려 좋아했었다. 그 이후, 그 아이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십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들이 어엿한 숙녀로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은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고 난 뒤, 예약된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눈빛으로 읽을 수가 있었다.
그 사이에 주문했던 음식이 나왔다. 나오는 음식마다 아이들은 게 눈 감추듯 해치웠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니 내 기분까지 좋아졌다. 한편으로 아이들과 짐작에 이런 시간을 자주 갖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몇 분이 지나자, 식탁 위는 아이들이 먹은 빈 접시로 채워지고 있었다. 쌓인 접시로 보아 음식 값도 만만치 않을 것만 같았다.
주문한 음식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한 명의 제자가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눈치를 보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선생님,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너희가 계산을…? 괜한 일을 했구나.”
“선생님을 속 썩여 드린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는 지난 학창시절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기라도 한 듯 내 손을 꼭 잡으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제자의 행동을 보면서 제자를 잘못 가르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꼭 연락을 하겠다는 제자와 아쉬운 작별을 하며 식당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가족에게 제자와 있었던 지난 일과 밥값을 제자가 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우리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식사를 했다며 좋아하였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