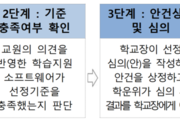배가 물 위에 뜨듯이 인간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시대의 고비마다 인간에게는 큰 시험이 있었으며 특히 한국인은 더욱 시험을 중요시 하기에 시험에 든다. 유치원 입학부터 입사와 승진까지 삶의 전체가 시험으로 점철되는 삶이다.
생존과 출세 여부를 시험 점수가 가름한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정답을 찾아 출제가가 의도한 정답 맞히기에 바쁘다. 그 정답은 의심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한 번쯤 따져 보자. 시험은 옳은가, 시험이 정답인가. 시험은 하나의 현상이다.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사회마다 양상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시험은 ‘나쁜 경우’다. 본질 가운데 선별 수단이자 순치 도구라는 부정적 측면이 극대화한 사회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순응하는 자가 추려지고 오직 점수가 목적이다 보니 부정이 횡행한다. 진짜로 중요한 실력이야 아무래도 상관없다. 고득점은 테크닉으로 가능하다. 패턴에 얼마나 익숙한지가 성패의 관건이다. 시험의 기술은 상당 부분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사교육시장이 부풀어 오르는 이유다. 시험이 평하는 능력은 단 하나.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느냐다. 시험을 위한 시험은 무용하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서울대 우등생의 공부 비법은 필기와 암기, 수용적인 학습 태도다.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이런 경향은 지속된다. 시험의 암묵적 장려 아래서다. 그렇지만 미국 대학은 판이하다.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을 서울대가 죽이는 반면 미시간대는 살리고 있다. 문제는 정답을 찾는 교육이다. 주어진 답만을 찾도록 훈련된 시험형 인재가 미래 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언한다. “‘정답 너머’의 공부를 요구하지 않는 교육이 학생들의 예기를 꺾어 놓는다”고 권재원 서울 성원중 교사는 주장하고 있다. 좋은 시험은 없을까. 프랑스의 대입자격시험(바칼로레아)에는 객관식이 없다. 수학ㆍ과학을 제외하면 패턴도 없다. 채점자는 답안의 적절성ㆍ논리성을 평가한다. 선발을 위한 시험이 아니어서다. 바칼로레아가 추구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력의 배양과 수험생의 성장이다.
우리는 공부에 대한 정의와 시험의 실체에 대하여 회의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사회의 생존을 위하여 가야할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정답이 있는 시험의 유효기간은 이미 지났다.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정답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기본이 다져지기까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교육은 나쁘다. 무엇을 위한 정답 찾기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그 정답이 가치를 갖게 된다. 지금처럼 한눈 팔지 않고 이정표만 따라가다 결국 당도하는 곳은 벼랑이 될 것이다.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 우리교육이 바뀔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제도권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은 공정성에 집착한다. 남에 대한 불신 탓이다. 시험 만한 게 없다. 그러나 이 문제도 더 깊은 회의를 하면서 우거진 숲을 지나야 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