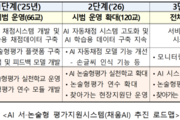광양과 하동에 이어 하루 쉬고 남해로 출발했다. 남해고속도로를 지나 시원하게 뚫린 19번 국도를 달려 드디어 남해로 들어섰다. 예전에 방문한 다랭이마을을 다시 보러 가는 길이다.
남해 들어서 얼마나 달렸을까? 도로가 조금 좁아진다. 오른쪽을 보니 그리 경사가 심하지 않은 비탈길에 말끔한 주택단지가 보였다. 깨끗하고 세련된 양옥집들이 언덕길 양쪽에 늘어서 있어 담박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니 '미국 마을'이라고 쓰여있다. 남해는 독일마을이 유명한데 미국 마을도 있던가? 신기하기도 하여 나는 도롯가에 주차하고 내려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그곳 주민이 보면 '웬 이방인이 무단 침입하여 수상한 짓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 그만큼 미국마을은 훤한 대낮임에도 오가는 사람을 볼 수 없었다. 인적이 드문 동네로 적막감이 도는 가운데 고즈넉한 분위기는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러다 어느 집 앞에 '한 달 살기 문의'라는 광고판이 눈에 들어와 보고 있는데 웬 영감님이 저만치 눈에 들어왔다.
평상시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아내는 늘 뒤로 빠지고 내가 앞장서 물어보거나 관련된 일을 처리하곤 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르다. 아내가 앞장서 먼저 영감님한테 말을 붙이더니 우릴 집안으로까지 불러들인다. 아내의 그동안 숨어있던 잠재된 교섭력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작년 말부터 남해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하자고 조르더니 아내의 마음에 든 집인가 보다. 영감님도 우리가 아마 한 달 살기 고객으로 보였는지 친절하기가 그지없다.
우린 일단 신발까지 벗고 안으로 들어가서 방과 거실 그리고 테라스까지 모두 보게 되었다. 임대료도 물어보고 명함도 받았다. 전망 좋고 깨끗하여 기회가 되면 남해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우린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집도 보려고 골목길을 올라 기웃거리며 실컷 눈요기하고 나서 목적지인 다랭이마을로 핸들을 돌렸다.
가는 길은 천 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한 자연의 신비를 모두 담고 있는 천상의 길이다. 달리는 도로 왼쪽으로 푸르고 깨끗한 남해 청정바다가 우릴 반기며 유혹하고 있다.
드디어 10년 전에 만났던 다랭이마을이 눈앞에 펼쳐졌다. 우리는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고 이끌리듯 차에서 내렸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배 한 척 없는 마을이다. 그것은 마을이 해안 절벽을 끼고 있기에 방파제는 물론 선착장 하나도 만들 수 없다. 마을 주민들은 척박한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명승 제15호로 지정된 다랭이 논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일단 전망 좋은 곳으로 가 다랭이마을을 전체적으로 훑어보았다. 마을이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파란 바다와 굴곡진 골목을 따라 자리 잡은 마을, 파랑, 빨강 등 원색으로 치장한 지붕들, 겹겹이 진한 녹색 띠를 두른 듯한 다랭이 논이 어우러져 환상의 콜라보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내가 탤런트 박원숙 씨의 카페가 이곳에 있다는 방송을 봤다고 먼저 카페를 가보자고 한다. 차 한 대 교행(交行)하기 어려운 좁디좁은 골목길이다. 조심조심 들어가니 카페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골목길 오른쪽은 깎아지른 절벽이라 위험하여 온 신경이 곤두선다.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길을 따라 내려갔다.
골목 왼쪽에 ‘커피 & 스토리’ 간판이 눈에 들어오니 너무 반가웠다. 골목길에는 주차하기가 어렵다. 여태껏 익혀온 나의 운전 기술을 발휘하여 한쪽 벽에 바짝 붙여 주차하고 난 다음, 카페 입구에서 사진을 한 장 찍고 계단을 올라갔다. 기대를 잔뜩 하며 ‘카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커피 맛은 어떨까?’, ‘무슨 커피를 주문할까?’ 등을 머릿속에 그리며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사람의 인기척은 없고, 카페 정원 한쪽 구석에서 남자들이 뭔가 일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때 우릴 먼저 발견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당분간 집수리 공사 중이라며 카페는 휴업 중이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 이런 날벼락이 있나? 나보다도 아내의 실망이 큰 것 같다. 그렇지만 어쩔 것인가? 인터넷 검색이라도 하고 올 걸 그랬다.
아쉬운 대로 출입구의 예쁜 입간판 아래에서 사진이라도 남길 요량으로 갖은 포즈를 잡아가며 찍었다. 우린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며 눈에 담아갈 경치 좋은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이 순간은 나도 아내도 모델이다. 나중에 다시 봐도 감탄할 만한 멋진 사진을 남기려 나름 애쓰며 다녔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동네를 둘러보니 골목의 좌우로 동화 속에 나올법한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도시 생활에 익숙한 우리가 흔히 보기 힘든 귀한 풍경이다. 언덕에 지었기에 바다를 보는 조망은 천혜의 선물이다. 작고 허름한 집이지만, 맑은 공기와 청정 남해를 늘 볼 수 있기에 그 어느 호화주택이 부럽지 않을 듯하다.
조금 더 걸어 들어가니 논이 보였다. 까마득히 보이는 언덕 너머로 화선지에 붓으로 한 줄씩 획을 그은 듯한 녹색 줄띠는 이곳 사람들의 식량창고라니 경이롭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단 한 뼘의 땅도 놀리지 않고 논을 만든 남해인들이 흘린 땀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남해인이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낸 땅이 전국에 소문난 관광지로 바뀌었으니, 아무리 최고의 찬사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탄성이 절로 나왔다.
요동치는 가슴을 진정하며 나는 돌아서 다시 큰 도로로 빠져나왔다. 여기 온 김에 천혜의 절벽을 품은 푸른 바다를 맘껏 보려고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걸터앉았다. 우린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와 깎아지른 절벽의 굴곡진 해안이 함께 만들어낸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절경을 눈에 담고 또 필름에도 담았다. 떠나기 싫은 많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광양의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 바빠 시동을 걸었다.
남해인의 억척스러움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가천 다랭이 논이 주는 감동과 아름다운 천혜의 절경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