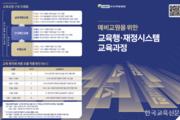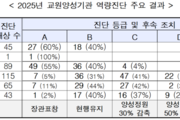고종 황제 시절인 1900년 10월 25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월 25일은 독도와 관련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특별한 날로 남아 있다. 우리가 이날을 ‘독도의 날’로 지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독도는 한반도의 가장 동쪽 끝, 푸른 동해 위에 우뚝 솟은 두 개의 바위로 구성되어 지도에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곳에는 우리 민족의 꿋꿋한 역사와 자존심, 그리고 꺼지지 않는 사랑이 깃들어 있다. 이로써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독도는 늘 우리와 함께였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 수많은 사료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독도의 가치는 단순한 문헌이나 조약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로 오늘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하는 독도는 오늘도 쉼 없이 부서지는 파도와 매서운 바람 속에서 꿋꿋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자리를 함께 지키는 이들이 있다. 독도경비대원, 해양연구원, 독도주민, 그리고 독도를 배우고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다. 그들의 헌신과 관심이 있기에, 독도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깃발을 푸른 바다 위에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각급 학교가 독도 교육의 일환으로 독도 역사와 수호에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지 대한민국의 부속 영토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수업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교육이다. 학생들이 독도를 통해 배우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며, ‘경쟁’이 아니라 ‘평화’이다.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곧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아끼고 지키는 마음으로 확장될 수 있다.
우리에게 독도는 더 이상 단순히 ‘지켜야 할 섬’이 아니라, 함께 꿈꾸고 가꾸어야 할 미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생태를 보존하고, 평화의 바다로 가꾸며,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배우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독도 수호의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길이라 믿는다. 우리가 독도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민족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이며,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이다.
지금도 동해 바다의 파도는 쉼 없이 독도의 바위를 두드리고 있다. 그 파도 소리 속에는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특히 빛나는 이름 중에는 조선 숙종 시에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서 일본 어민들의 무단 출어를 보고,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담판 끝에 도쿠가와 막부가 독도는 조선 땅임을 공식 안정하는 문서를 발급받아 온 안용복 장군,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약 3년 8개월간 독도에 주둔하며 일본의 불법적인 침범을 막아낸 ‘독도의용수비대’, 채취한 미역으로 독도에 머무는 사람들의 비상식량이 되고 판매 수익금으로 독도 경비 자금에 보탰던 ‘제주 해녀들’, 월세 살면서도 200억을 기부한 열렬한 독도지킴이 가수 ‘김장훈’... 그밖의 수많은 애국지사와 시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지켜라, 기억하라, 그리고 사랑하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세 마디가 매년 ‘독도의 날’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동 지침을 전하는 메시지라 할 것이다.
이제 10월의 하늘 아래,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각자의 독도를 세워보자. 그 섬에는 나라를 향한 사랑이 있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있으며,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자긍심이 내포되어야 할 것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가장 중심에 있는 땅이라 할 것이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보내면서 독도 수호와 사랑에 다시 한번 결의를 다져보며 이를 중단없는 교육으로 미래 세대에게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