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세 사람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일명 ‘AI 깐부 회동’이라 불린 이 회동에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작은 치킨집 테이블에 함께 앉은 것입니다. 젠슨황 CEO는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에 26만 개의 GPU를 공급해 AI 팩토리를 짓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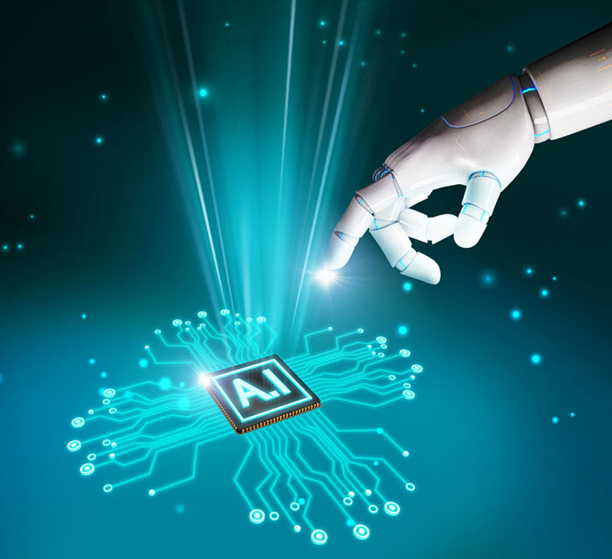
지난 두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름은 단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습니다. 가뜩이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던 반도체주에 APEC 기간 이어진 젠슨황 CEO의 한국 방문, AI 깐부 회동, 엔비디아의 GPU 공급 약속이 이어지며 주가는 더욱 높게 날아갔습니다. 9월부터 현재까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배 이상 오르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7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반도체주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뉴스가 쏟아졌지만 이것만으로 이렇게 강력한 주가 상승의 이유가 모두 설명되진 않을 것입니다. 결국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실적에서 주가 상승의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현재, 2026년 이 두 회사가 벌어들일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연간 50조 원이 넘습니다. 2025년 예상치 40조 원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에 비해서도 25% 이상 향상된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IB, 씨티그룹은 8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까지 기대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2026년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영업이익을 55조 원부터 80조 원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 최종 예상치가 37조 원 정도니 50% 이상, 심지어 100% 이상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2026년 합산 영업이익만 해도 적게는 105조 원에서 많게는 160조 원까지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낙관적 영업이익 전망 경계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의 경우 2026년은 10년에 한 번 오는 메모리 반도체의 해가 될 것이라며, 하이퍼스케일러(아마존, 구글 등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폭발적인 HBM·서버 메모리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분기마다 두 자릿수로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인 그림까지 그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 전망이 좋다’는 말만으로는 왠지 불안함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1년 삼성전자에 대한 장미빛 미래만을 보고 투자했다 9만 원대에 갇혀 마음 고생을 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점에 들어간 투자자들은 최근 겨우 이익으로 전환되어 그나마 오랜 기간의 마음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흔히 반도체 주식은 전형적인 시클리컬(경기 민감) 산업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지만, 수요가 꺾이면 재고 조정과 가격 폭락으로 실적이 급감하는, 전형적인 업황 사이클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재밌는 투자 전략이 바로,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판다’입니다. 즉, 기업의 이익이 바닥일 때 사서 이익이 제일 좋을 때 파는 전략입니다.
이 투자 전략에 따르면 우리는 2021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투자 전략대로 현 시점에서도 우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아야 할지 모릅니다.
11월 13일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608조 원입니다. 내년 영업이익을 60조 원으로 전망한다면 내년도 PER 전망은 ‘608조 원/60조 원=10’이 됩니다. 영업이익을 80조 원으로 전망한다면 PER은 7.5 정도가 됩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현재 시가총액은 약 445조 원입니다. 내년 영업이익을 50조 원으로 전망한다면 내년도 PER 전망은 8.9, 80조 원으로 전망한다면 5.5가 됩니다.
반도체 투자 사이클 분석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반도체를 시클리컬 기업, 경기 민감주로 본다면, 2021년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반도체주를 보유 중인 투자자라면 매도를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사 남은 2025년 동안 조금 더 오르더라도 2026년 장미빛 이익 전망이 과거가 되는 2026년이 된다면, 2027년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경기가 식으면서 영업이익도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이 아닌 다른 큰 그림을 봐야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근거가 바로 젠슨황 CEO가 그리고 있는 ‘AI 팩토리’의 큰 그림과, AI 투자 슈퍼 사이클의 서사입니다.
APEC CEO 서밋에서 젠슨황은 삼성·SK·현대·네이버와 함께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AI 팩토리는 “전기를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을 뽑아내는 새로운 형태의 공장”으로 쉽게 말해 전통적인 제조 공장에 AI라는 옷을 입혀 극적인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똑똑한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팩토리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3조~4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서사 속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더 이상 스마트폰 교체 수요, 데이터 센터 투자에 따라 울고 웃는 부품이 아니라, AI 팩토리의 생산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AI 핵심 반도체 중 하나인 HBM을 포함한 D램 및 낸드 생산 물량이 사실상 완판한 상태라고 밝히며,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 ‘슈퍼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겹쳐 보면, 반도체 주가 상승은 단순히 한두 해의 실적 회복이 아니라 ‘AI 시대의 인프라에 올라타는 장기 구조적 성장주’로의 재평가 과정처럼 보입니다. 지금 시장이 써 내려가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AI 버블 논쟁이 한참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오픈AI와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으로 오픈AI는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사들이는 식의 순환 거래 구조가 여러 곳에서 관찰되면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실제 수요인지, 아니면 AI에 대한 과열 투자이면서 동시에 돌려막기는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젠슨황의 ‘수조 달러 AI 인프라’ 구상이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러한 천문학적인 투자가 실제 기업들의 의미있는 AI 서비스 수익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새로운 슈퍼 사이클로 진입했다는 주장을 맹신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 연구로 성공 투자 실현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최태원 SK회장이 인터뷰와 강연에서 ‘AI는 미·소 냉전식 군비 경쟁과 비슷하다’고 한 비유가 흥미롭습니다. AI 경쟁을 ‘버블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뒤쳐지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생존 경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을 과거 냉전시대 미·소 군비 경쟁에 빗대며, AI·반도체 인프라 투자는 생산성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안 하면 지는 게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AI·반도체 투자는 ‘지나치게 뜨거운 버블’일지언정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군비 경쟁이자 생존 경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소 두 나라가 실제 전쟁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군비 경쟁을 통해 개발하고 생산한 무기가 결과적으로 버블이었고, 무용지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I와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한국 경제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생존과 기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말처럼 생산성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뒤쳐지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경쟁이라면, 우리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현명하게, 더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