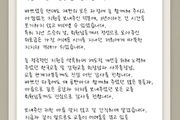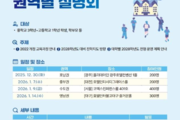딱딱한 형식이 사라지고 말랑말랑한 예술 콘텐츠가 끼어들어 ‘재미’를 추구한다. 지식 콘서트는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명확한 가치가 무너지고 사회적 소외감이 깊어진 사회에서 사람들은 소통을 통해 위로받고 함께 고민을 말하며 희망을 논한다.
지식 콘서트가 품고 있는 함의를 아우르면 ‘통섭’이 튀어나온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우리 사회에 들여온 이 개념은 흔히 ‘융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지식 콘서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뤄진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리더십, 일방적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 넘쳐난다. 논리적 학문과 감성적 문화·예술 영역도 섞이고 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날 포럼 축사에서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려는 신개념 학습법의 경향을 담은 지식콘서트가 여러 교육 포럼을 통해 더 다양하게 변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8분의 마법’ ‘천재의 향연’ ‘지식 페스티벌’
모든 것에 ‘원조’가 있다면 지식콘서트의 원조는 테드(TED)다. 빌 게이츠, 빌 클린턴, 제임스 캐머런, 인드라 누이, 제이미 올리버, 제인 구달, 앨 고어, 보노. 지난 10년간 테드 무대에 선 사람들은 그 이름만으로도 청중의 가슴을 뛰게 하는 명사들이다. TED는 기술(Technology)·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디자인(Desig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1984년 미국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리처드 솔워먼과 방송 디자이너 해리 마크스가 “캘리포니아에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 강연을 듣자”는 뜻을 모아 시작됐다.
초창기에는 평범한 강연회였지만 2001년 언론인 출신 크리스 앤더슨이 인수하면서 전 세계에 ‘지식형 콘서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퍼뜨릴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이라는 모토를 내세운 앤더슨은 유명인을 무대에 세우는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한 강연 콘텐츠 확산에 적극 나섰다.
테드 행사는 매년 봄 캘리포니아 롱비치와 팜스프링스에서 열리는 ‘테드 콘퍼런스’, 여름에 전 세계를 순회하는 ‘테드 글로벌 콘퍼런스’, 지역 기반의 테드x로 구분된다. 강단에 선 사람들은 최대 18분 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재능을 나눈다. 테드의 모든 강연 콘텐츠는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되고, 강연자 역시 강의료를 받지 않는다. 테드의 동영상 클립을 뜻하는 테드토크는 각각 수천만회에서 10억 회가 넘는 조회 수를 자랑한다.
지식콘서트 열기에는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도 기여했다. ‘선진 미국’, ‘하버드대’, ‘대학 교수’에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는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큰 돌풍을 불러온 것은 사실이다. 지난 1월 EBS를 통해 공개되면서 방송시간 조정, 주말 재방송 편성 등의 화제를 낳았다. 샌델 교수의 책과 강의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일상적인 사례, 대중적인 언어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샌델 교수는 1980년대 초반 존 롤스의 정의론을 자유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공동체주의적 정의를 내세운 학자다. 그렇기에 그의 주장에는 자유주의 진영과 공동체주의 진영 간 20여년에 걸친 논쟁이 녹아 있다. 그럼에도 샌델 교수는 기존 정의론의 철학적 배경과 논쟁의 역사부터 읊어대지 않고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툭툭 던져놓는 방식을 택했다. 책도 그렇고, 실제 강의도 그렇다.
또 한 가지 역설적인 점은 샌델 교수는 정의를 정의하지 않고 열린 결론으로 내버려뒀다. 자신의 강의를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에 비유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내가 20여 년 간 논쟁해 봐서 아는데…”라고 전제하지 않고 “나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반론과 주장을 주의 깊게 듣는다. 권위만으로 찍어 누르지 않는 세련된 접근법은 신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