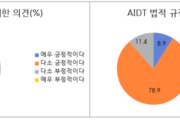“연곡 분교 어린이들은 모두 2층 다목적실로 바이올린 들고 모이세요.”
오늘은 KBS 2TV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을 취재하러 오는 날입니다. 오마이뉴스에 학교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서울에 있는 방송국 작가 선생님들이 자주 전화를 하여 조르더니 실행에 옮긴 거랍니다. 내일 민간 기업과 자매결연으로 갯벌체험 학습을 가게 되는데 사전에 학교생활부터 찍겠다고 해서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전교생 바이올린 학습 장면과 사물놀이 장면, 핸드벨 연습 장면, 계곡 물놀이 장면 등….
금년에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MBC 심야스페셜에 ‘지리산의 봄’으로, 며칠 전에는 KBS 1TV, ‘성장다큐 꿈’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출연했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우리 분교 아이들은 카메라 앞에서도 의젓하게 말하곤 합니다.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역 탤런트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수업 시간 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방송국까지 현장체험 학습을 가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프로듀서와 작가 선생님, 카메라 기자를 통해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으니, 그것도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다양한 직업 세계를 보는 눈, 사물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사고력, 임기응변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까지 생각한다면,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실감합니다. 이곳 피아골에는 일찍부터 이곳에 터를 두고 살아온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가정 사정과 형편 때문에 도시 생활을 접고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마음 아픈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아정체성까지 갖추게 된 하늘이와 기운이, 다른 선배의 마음 아픈 사연을 방송으로 처음 알았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2학년 나라를 비롯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삶을 화면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았다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때로는 상처를 가진 부모의 반대에 부딪쳐서 방송 출연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처는 감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오히려 햇볕에 널어 말리고 소금으로 뿌려가면서 그 상처에 바람이 들게 해야 빨리 아문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철저하게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해줍시다.”
라고 설득을 해서 어렵사리 출연을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에 더 공감하고 같이 슬퍼하며 나누고 싶어 함을 알기에, 진솔한 삶의 현장을 찾아 서울에서 이 곳 산골까지 촬영을 부탁하는 지도 모릅니다.
사람 냄새가 폴폴 나는 시골, 물질문명에 지친 사람들에게 땅 냄새 가득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것도 자연 속에서 올망졸망 서로 어깨를 나란히 살아가는 산골 분교의 아이들 모습에서 아련한 고향의 모습을 찾고 싶어 하는 지도 모릅니다.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과 부부는 45cm 이내로 가까이 들어올 수 있으며, 보통 사이에서는 그 길이를 넘어야 서로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한 가족이기에 형식적인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학교들은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많아서 생기는 그 익명성은 서로를 타인이 되게 하며 대화의 부족에서 이해보다는 오해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은 모두 어른들의 손길이 부족하고 진솔한 대화 시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과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산골 분교가 알려지면서 요즈음은 행복한 전화를 받곤 합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주로 대도시에 아이들을 보내는 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학교는 산골에 있어서 생계 수단을 보장해 줄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꼭 오고 싶은 사람은 ‘유학’(?)을 와야 하니까요.
폐교의 위기를 딛고자 시작했던 특기․적성 사업인 바이올린 전교생 지도로 인하여 학부모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찬사를 한 몸에 받게 된 지금, 이제 우리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사라져가는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모델을 꿈꾸며 더욱 정진하고자 밤에도 반딧불이처럼 학교의 불을 밝히며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으니 한 사람의 꿈이 아닌 전교생과 모든 학부모님, 전체 교직원이 함께 꾸는 꿈은 이제 이상만이 아닌 현실로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3년을 보내는 마지막 해, 현재의 선생님 세 분이 내년 봄에 모두 나가시더라도 더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계곡 물소리만 흐르는 피아골의 어두운 밤하늘을 지키며 이 글을 씁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