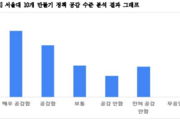퇴근 무렵.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퇴근길에 집에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시장에 들러 사오라고 부탁을 하였다. 오랜만에 찾은 시장은 새삼 낯설기까지 했다. 하물며 재래시장은 경기가 없어서인지 문을 닫은 가게들이 많았다.
아내가 불러 준 물건을 다 사고 난 뒤, 시장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저 멀리서 아기를 업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나를 보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얼떨결에 답례로 목례를 하였지만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다.
그 아주머니는 마치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러고 보니 얼굴이 왠지 낯익어 보였다. 제자인 듯 했다.
"혹시 OO고등학교 선생님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 신지?"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글쎄."
얼굴 생김새는 학창시절의 모습이 조금 남아 있어 그나마 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제자의 이름은 영 떠오르지 않았다. 본인의 이름이 불리어 지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제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할 수 없이 어슴푸레 생각나는 이름 하나를 말했다.
"그래, 너 OOO이지?"
그러자 제자는 실망스런 표정을 지으며 보채는 아기를 달래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제자의 배려로 여겨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의 이름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직생활 15년이 넘은 지금 가르친 제자의 이름 모두를 기억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였다. 하물며 결혼까지 하여 아기를 둔 제자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낸다는 것 자체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제자는 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듯 정색을 하며 정중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선생님, 저 O회 졸업생 OOO입니다."
"그래 맞다. 너였구나. 그러고 보니 네가 졸업한 지도 십 년이 넘었구나."
그제야 제자는 자신을 기억해주는 내가 고마운 듯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잠시나마 제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다. 그런데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아마도 그건 제자가 먼저 이름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제자의 이름을 불러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기 때문이었으리라.
초임시절. 내가 가르치는 모든 아이들의 이름은 물론 학급번호까지 모두 외워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아이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못 외우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궁색한 변명인 듯싶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퇴색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가끔 아이들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불러주곤 했던 '멋쟁이(남학생)', '예쁜이(여학생)'라는 호칭에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무엇보다 졸업을 한 후에도 아이들에게 이 호칭을 불러줄 수는 없지 않은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한편으로 먼 훗날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난 뒤, 나를 떠올릴 때 혹시 이름을 못 외우는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조금은 늦었지만 아무튼 내일은 출근을 하자마자 학생명부를 꺼내놓고 아이들의 이름부터 외워야겠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