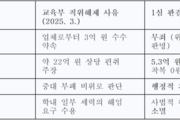그동안 나라 전체가 개발로 몸살을 앓은 것이나 흘러간 세월이 짧지 않았음을 생각할 때 고향에서 옛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또한 지형이 안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대서 '소래울'이라 불려오던 옛 지명이 지금까지는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한다.

그중에서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작은 소래울'은 마을 앞에 충북선이 놓여 있어 수시로 기차가 지나간다. 중부고속도가 충북선을 가로지르며 지나가 꼬리를 무는 차량의 행렬도 바라본다. 시간만 되면 청주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마을 위에서 하늘 높이 비상한다. 그렇다고 생활이 편리할 만큼 역, I.C, 공항과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어서 모든 것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순진한 내 고향 사람들은 잇속과도 거리가 멀다. 복선으로 놓인 철길에서 여러 번 사고가 났고, 고속도로가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 덥고, 비행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TV 시청을 방해하니 불평불만을 일삼을 만한데 고향마을에서는 그런 소리를 듣기가 어렵다.
청주시에서 인근에 쓰레기장을 건립할 때도 훗날 그것 때문에 불편이 많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 잇속 하나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고향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주장이 너무 과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될까 걱정한 것도 아니다. 그냥 착해서 정부시책대로 따랐을 뿐이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의 봄은 여전히 옛것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흙벽돌이 드러난 벽, 누릇누릇 익어가고 있는 보리, 별 모양을 닮은 예쁜 꽃을 매달고 있는 감자, 열심히 풀을 뜯고 있는 소가 고향에 있었다. 옛 추억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 이곳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몸에 좋다는 게 알려지며 돈 많은 사람들이 바닥이나 벽을 황토로 만든 집에서 사는 세상이 되었지만 내가 어린 시절에는 흙벽돌로 지은 작은 초가집이 가난의 상징물이었다. 누구나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가난한 시절에는 뿌리에 주렁주렁 매달린 감자만 보아도 배가 불렀다. 불에 그슬린 보리이삭을 손바닥에 놓고 비벼 껍질을 벗긴 후 입으로 '후' 하고 불어 손바닥에 남은 알곡만 먹던 보리때기는 배고픔을 달래는 유일한 간식거리였다.

그 시절은 무나 배추 따위의 꽃줄기인 장다리를 많이 꺾어 먹었다. 밭에서 흔히 보던 꽃이 유채꽃을 닮았다는 것은 훗날에야 알았다. 그때 소는 품앗이를 하는데 이용될 만큼 집안에서 대들보 역할을 하는 가축이었다.
논밭의 두렁에서 소깔을 베고, 작두로 여물을 썰고, 쇠솥에 소죽을 쑤던 추억만 있는 게 아니다. 아이들에게는 소를 끌고 다니며 풀을 뜯어먹게 하는 소 풀 뜯기기가 귀찮은 일거리였다. 길게 끈을 만들어 풀이 많은 곳에 소를 매어놓고 실컷 놀다 보면 금방 해가 넘어갔다.




뱅뱅 원을 그리며 더위와 싸우느라 배가 쑥 들어간 소를 보고서야 어머님께 꾸중 들을 일이 걱정되었다. 급히 냇가로 몰아넣으면 목말랐던 소는 단숨에 물을 주~욱 주~욱 빨아들였다. 소의 배가 부르기만 하면 마냥 즐거웠던 철부지 시절이었다.
그때도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밤이면 바깥마당에 펴놓은 맷방석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이웃들이 모이는 모임장소였다. 물배를 채운 날은 어김없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옛날이야기를 듣는 맷방석 옆에서 좌~악 좌~악 소가 설사를 해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돌이켜보면 부모님께 들킬 것을 알면서도 물배를 채우는 날이 많았던 아이들의 천진난만함과 사건의 자초지종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시던 부모님들의 너그러움이 같이 빛나던 시절이었다.

그때의 훈훈한 인정을 알고 있다는 듯 시멘트를 뚫고 나온 꽃들이 담장 옆에서 예쁜 모습을 하고 오가는 사람들을 반긴다. 이런 맛에 고향을 찾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추억과 낭만이 많은 곳이라서 고향을 더 그리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