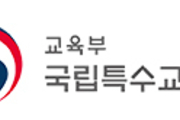교육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급박한 현실 문제에 매달려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장기적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면서 인적자원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증거는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선진국은 이미 지식 중심의 경제 발전을 이뤄가고 있으며, 국제적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 현재 교육제도는 젊은이들이 꿈과 끼를 찾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그 증거가 올 수능에도 재수생이 늘고 재학생이 줄고 있다. 그만큼 제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지 못한 채 대학만 진학한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잠재성과 창의성을 찾아주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미래에 대두될 인적자원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핀란드 공교육을 설계한 살베리 교수는 "한국과 미국 등은 교육제도를 표준화하고 일정 기준에 맞출 것을 교사와 학생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 보다는 학생의 창의성을 강조하고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교육하며 잠재성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도 지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잠재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실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면서도 "1년에 한두 번 운동한다고 건강해지지 않듯이 자유학기제를 1학기 동안 진행한다고 청소년들이 곧바로 꿈과 끼를 찾고 자유로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핀란드는 자유학기제 같은 방식을 전체 학교 시스템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비판 속에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도록 도와준다는 원칙이 꾸준히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개혁의 방향에 대해 살베리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면서도 "학생들이 종일 노트북이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면서 깊은 생각과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아이들은 남과 눈을 마주치며 15분 동안 대화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며 공감능력과 이해력, 사고력 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살베리 교수는 모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한국과 핀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코딩 교육 등이 각광받고 있지만 모든 학생이 프로그램 언어를 배울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학생이 코딩을 배우는 것은 자원 낭비이며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만 선택해서 배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살베리 교수는 30년간 핀란드 교육 개혁에 참여하면서 공교육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한 인물로 하버드대 객원교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분석가, 세계은행 교육 전문가 등을 지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