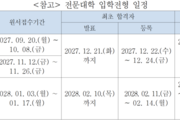솔직히 말하자면 ‘살다 보니 참 별 일이 다 있구나’ 싶었다. 너를 지도하면서도 정작 모르고 있었던 네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낸 편지를 받게 되었으니 말이다. 너의 밝은 표정과 환한 미소만 보아도 까닭 모르게 좋았던 기분을 떠올려보면 그래, 그것은 차라리 감동이라 해야 옳다.
사실은 32년 국어선생을 하면서 제자로부터 받은 편지가 나의 추억함에는 수북하단다. 그런데도 너의 편지가 유독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응당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감동은 네가 부쩍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었기 때문이다.
네가 기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보인 화난 모습 기억나니? 그래 한 마디로 그것은 충격이었다. 배신감이었다. 다시는 제자들 예뻐하지 않을 것이란 다짐도 했었지. 그래도 왜 그런건지 이유는 알아야 목구멍까지 차오른 분이 풀릴 것 같았단다.
그런데 선생님에게 불려온 너의 태도는 뜻밖에도 온화한 것이었다. 사람이란 역시 대화의 동물일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오해’를 풀게 되었지. 네 편지를 보니 인터뷰 펑크내고, 기자까지 그만 두겠다고 말한 것에 스스로를 미워했다니, 너의 그 자책이 또 다른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더 구나.
이제야 하는 말이다만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난 깜짝 놀랐다. 왜냐고? 너는 너무 빼어난 미인이었거든. 게다가 나로선 미인박명이란 말은 들은 적 있어도 미인이 글 잘 쓰는 건 별로 본 바가 없거든. 교내백일장 이후 벚꽃예술제 전북학생백일장에서 차하상을 받은 ‘바다’가 그런 느낌을 확실히 했달까.
그러나 그뿐이었지. 너는 글쓰기에 대한 소질이나 가치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바빴어. 엄마의 반대, 알바, 보컬활동 따위 이유를 들며 한사코 글쓰기에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어. 결국 나는 너를 버릴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그런 날이 한 1년 화살처럼 지나가버렸어.
나의 지도방식대로 하자면 너는 그렇게 버림받은 제자로 나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어야 맞는데, 참 이상도 하지! 나는 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거든. 30여 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어. 이를테면 나의 첫경험인 셈이지.
아니나다를까 네가 글쓰기와 함께 기자활동까지 한다고 다소곳이 내게 알려왔던 2학년 2학기 초 난 두 개의 바위틈을 지나 청춘을 다시 찾은 뱀 같은 기분이랄까, 아무튼 되게 기뻤단다. 글쓰기와 학생기자 지도를 통해 너와 수시로 만난다는 것이 되게 즐거웠어.
나의 기분이 옆구리 터지도록 낄낄거릴 만큼 좋은 것은 “선생님의 제자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도 했어요”라는 너의 느낌 때문이란다. 그것은 ‘썩은’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선생님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했던 거야. 맡은 수업외의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심심하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원동력!
그러나 3학년 2학기 시작과 함께 현장실습을 떠난 너는 기말고사 무렵 편집실에 경우지게도 박카스 한 박스까지 들고 왔었지만 그뿐이었어. 졸업 후 너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 나도 연락할 수 없었지만 너에 대한 생각이 내 주위를 빙빙 맴돌곤 했어.
거의 1년 반 만에 너의 연락을 받은 나는 뛸 듯이 기뻤단다. 게다가 너는 나를 만나러 오기까지 했어. 그리고 한 달쯤 후 너는 내게 “생각나는 게 선생님밖에 없었다”며 돈 얘기를 했지. 간 이식까지 내비친 아빠의 입원비를 일부나마 내드리고 싶다며.
돈 거래할 사이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네가 금방 허물어져버릴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나를 괴롭혔다할까.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돈을 갚기는커녕 너는 2년이 넘도록 연락조차 끊어버렸지. 내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 메일을 보내도 읽지 않고….
나는 정녕 제자도 잃고, 돈도 잃고, 셰익스피어의 금언을 잠시 망각했던 바보일까? 그랬을망정 나는 지금도 처음 너에게 받았던 감동 그대로란다. 너는 돈을 못갚아 연락조차 못하는지 모르지만, 내게 간절한 것은 소식이야. 너를 진짜 보고 싶은 마음이란다.
막상 퇴직을 하고나니 네 생각이 더 간절해진 것인지도 모를 일이긴 하다. 르포며 공모전 시상식 등 너와 함께 하며 찍었던 사진들을 보니 더욱 그렇구나. 그렇더라도 나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빛나야 할 청춘을 너 스스로 옥죄고 있는 것이 너무 싫어. 너무 싫다구!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