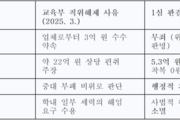질문 없는 기자회견, 정답만이 선(善)인 교실, 정답 권하는 사회.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과거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한강의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의 씁쓸한 이면을 발견하게 된다. 정답 아니면 오답으로 승패가 갈리는 ‘필답고사’는 지난날 ‘개천에서 용 난’ 수재들의 등용문이었으나 세상은 점점 ‘정답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동영상이 하나 있었다. 바로 EBS가 지난 1월 방영한 다큐멘터리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의 일부 편집본인데, 지난 2010년 한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마지막 날의 모습이다. 이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 기자들에게 예정돼 있지 않은 질문 기회를 줬고,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자 결국 중국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된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면서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지만 사실 나 역시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국 기자들의 특성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힌다. 우선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짧은 영어실력이 한 가지 원인이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유달리 영어로 말할 때 남의 눈을 의식하고, 또 누군가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어려서부터 10년 넘게 영어를 배워왔지만 외국인과 능수능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영어에 한이 맺힌 부모들은 자녀들만큼은 나보다 나은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 어학연수는 물론이고 조기유학도 서슴지 않고 보낸다.
다른 원인으로는 영어 그 자체가 아니라 질문의 내용에 자신이 없었을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아마도 이 경우가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연설을 했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기자들을 대표해 질문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아마도 자신 있게 손을 들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 같다.
한국 기자들의 이 같은 특성은 다른 나라 기자들과 취재를 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곤 한다. 어쩌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기자들과 함께 기자회견 등에 참석해보면 늘 듣는 말은 “한국 기자들은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 기자들이 자신들만의 관심사를 서슴없이 물을 때, 잠자코 있던 한국 기자들은 공식 회견이 끝나고 별도의 시간이나 일대일 대화를 통해 취재하려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기자들의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그저 평범하거나 앞에 언급한 내용을 되묻거나, 회견 참석자에 걸맞지 않은 내용을 던질 때도 있다. 대답하는 사람이 “앞에 다 설명했다”거나 “그건 내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다해도 질문자는 부끄러워하거나 주눅 들지 않는다.
‘정답을 찾는 노력’대신 ‘사고의 다양성’을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