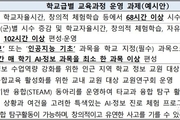오는 4월부터 추진하려는 ‘경기 꿈의 대학’이 준비 부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꿈의 대학은 고교생들이 야자 대신 수도권 대학을 찾아가 진로를 탐구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이재정 도교육감의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일선 고등학교나 지역 대학이 연구나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려니 졸속으로 흐를게 뻔하다. 일선 고등학교의 참여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공청회 한 번 없다보니 참여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한 사업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 가운데 교육부가 지정한 ‘정부 재정숫자지원 제한대학' 일명 부실대학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운영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야간 이동에 따른 학생안전관리, 교직원 관리지원단 파견 문제 등 크고 작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학생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더 생각하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터놓고 얘기하면, 교육감은 시·도의 유·초·중·고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지방교육의 수장이다. 그래서 이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을 관리하면 된다. 고등학교 학생의 진학은 온전히 고등학교의 학교장의 몫이다.
일선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에 목을 맨다 싶을 정도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좋은 대학을 위해 학교내신은 물론 수능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정이 맞춰 있다. 이러한 일정에도 만족하지 않아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다시 자녀를 사교육 시장에 내몰고 있고 극소수는 개인과외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이 아닌 대학의 기초교육이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하겠는가?
교육감은 즉흥적인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세간의 새로운 관심을 사기 위한, 주목을 받기 위한 극히 정치적인 교육 포퍼먼스의 하나다. 고교야자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보기엔 매우 교육적이지 못한 허상의 정책이다.
9시 등교도 학교의 자율이라고 강변하지만 일선학교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주기적으로 지역교육청을 통해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야자 역시 한 발 물러서 학교재량이라는 가면을 씌운 것과 다르지 않다.
진정, 교육자답게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을 만들려면, 야자 폐지 같은 결정을 교육감이 내릴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