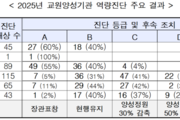김정한 단편소설 ‘모래톱 이야기’는 1960년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조그만 모래톱으로 만들어진 섬, 조마이섬이 배경이다. 을숙도가 모델이라고 해서인지 갈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나’는 부산 K중이라는 일류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반 학생 중 조마이섬에서 나룻배를 타고 통학하는 건우라는 학생이 있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갖는다. 소설은 가정방문차 나룻배로 강을 건넌 다음, ‘갈밭 속을 뚫고 나간 좁고 긴 길’을 따라 건우라는 학생네 집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작가는 조마이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주민들과 싱싱하게 자라는 갈대를 대비시킨다.
길가 수렁과 축축한 둑에는 빈틈없이 갈대가 우거져 있었다. 쑥쑥 보기 좋게 순과 잎을 뽑아 올리는 갈대청은,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하늘과 땅과 계절의 혜택을 흐뭇이 받고 있는 듯, 한결 싱싱해 보였다.
“저 갈대들이 다 자라면 지나다니기가 무서울 테지? 사람의 길이 훨씬 넘을 테니까.”
나는 무료에 지쳐 건우를 돌아보았다.
“괜찮심더, 산도 아인데요.”
그는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다. 아직도 짐승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는 것을 미처 모르는 모양이었다.
건우 아버지는 6·25 때 전사했고, 삼촌은 원양으로 삼치잡이를 나갔다가 죽었다. 건우 할아버지는 ‘갈밭 속에서 나고 늙어 간다는 데서’ 별명이 ‘갈밭새 영감’이다. ‘나’는 건우의 일기와 가정방문을 가서 만난 건우 할아버지 등을 통해 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조마이섬 소유자가 주민들과는 무관하게 일본강점기엔 동양척식주식회사, 해방 후엔 국회의원, 현재는 매립 허가를 받은 유력자 등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듣는다. 주민들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 라고 믿어 오던 땅이었다.
그런데 그해 처서(8월 23일쯤) 무렵 낙동강 일대에 60년 만의 폭우가 쏟아진다. 나는 조마이섬 주민들을 걱정하며 강변에 나갔다가 조마이섬이 이미 물에 차 있는 것을 목격한다. 섬 주민들은 부실하게 쌓아놓은 둑을 허물지 않으면 섬 전체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하고 둑을 허물었다. 이 과정에서 건우 할아버지는 둑을 유지하려는 유력자의 하수인 중 한 명을 탁류에 던져 숨지게 한다. 이후 9월 개학을 했지만 건우를 볼 수는 없었다는 것으로 소설이 끝난다.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고 갈색이라 ‘갈대’
이처럼 소설은 실제로 그 땅에 살면서도 외세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한 번도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을 담고 있고, 건우 할아버지의 저항은 그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투박한 어투로 민중의 현실을 증언하는 ‘모래톱 이야기’는 ‘우리 의식 바깥에 있던 민중의 존재와 민족 현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작품이었다(부산일보, 2008년 ‘새로 쓰는 요산 김정한’ 시리즈).
작가 김정한(1908∼1996)은 평생을 일제, 독재와 맞서 싸우는 반골의 생애를 살았다. 동래고보(현 동래고) 재학시절부터 독립운동에 앞장서면서 두 번이나 옥고를 치렀고, 해방 후에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성품으로 문단에서 존경을 받았다. 작가는 고향인 경상남도 동래(지금의 부산광역시)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고향 땅에 묻힌 보기 드문 문학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낙동강 파수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작가는 또 우리말과 야생화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후배 문인들이 ‘이름 모를 꽃’이라는 표현을 쓰면 “세상에 이름 모를 꽃이 어딨노! 이름을 모르는 것은 본인의 사정일 뿐, 이름 없는 꽃은 없다. 모르면 알고 써야지! 모름지기 시인 작가라면 꽃의 이름을 불러주고 제대로 대접해야지!”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우리말 노트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고, 손수 주변 식물들을 정리한 노트도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모래톱 이야기’에도 ‘쑥쑥 보기 좋게 순과 잎을 뽑아 올리는 갈대청’,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무나 배추의 꽃줄기에 핀 꽃)들’, ‘사립 밖에 해묵은 수양버들 몇 그루’ 등과 같이 생생한 식물 표현들이 많다.
작가의 생가(부산 금정구 남산동) 옆에는 선생의 문학과 생애를 기리는 요산문학관이 있다. 여기에는 선생이 만든 8권의 우리말 노트와 2권의 향토식물조사록 등이 남아 있다. 문학평론가 김윤식은 한 기고에서 이 우리말 노트와 식물조사록을 회상하며 “엄숙한 문학 정신의 영역”이라고 했다.

여고생 머리처럼 단정하면 억새, 산발한 것은 갈대, 엉성하면 달뿌리풀
갈대는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고 갈색이라 갈대라 부르는 것이다. ‘모래톱이야기’의 배경인 을숙도만 아니라 순천만, 충남 서천 신성리(금강 하구)도 갈대밭으로 유명하다. 신성리 갈대밭은 영화 ‘JSA 공동경비구역’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갈대는 냇가·강 하구 등 습지에서 자라지만, 억새는 주로 산이나 들에서 자란다. 가평 유명산, 포천 명성산, 정선 민둥산, 창녕 화왕산 등이 억새로 유명한 산들이다.
벼과 식물인 갈대, 억새, 달뿌리풀은 언뜻 보면 비슷하게 생겼다. 이중 억새는 대체로 사는 곳이 다르고, 열매 색깔도 은색이 도는 흰색이라 갈대·달뿌리풀과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다. 억새는 또 잎 가운데 흰색의 주맥이 뚜렷하지만, 갈대 등은 잎에 주맥이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다. 억새의 이삭은 한쪽으로 단정하게 모여 있다. 사람들은 대개 꽃이 피었다가 이미 지고 열매가 익어 은빛을 띠면 흰 억새꽃이 피었다고 말한다. 갈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억새를 얘기할 때 ‘야고’를 빠뜨릴 수 없다. 야고는 제주도, 전라도 섬지방에서 억새에 기생해 자라는 식물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에서도 야고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늘공원에 억새밭을 조성하면서 제주도에서 뿌리째로 옮겨 심었는데, 야고도 따라와 적응한 것이다. 9~10월 하늘공원에 가서 억새 뿌리 부분을 잘 살피면 담뱃대처럼 생긴 야고도 볼 수 있다.
갈대와 달뿌리풀은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갈대는 비교적 꽃과 열매 이삭이 촘촘히 달렸고 산발한 느낌을 준다. 반면 달뿌리풀은 꽃과 열매 이삭이 대머리 직전처럼 엉성해 휑한 느낌을 준다. 달뿌리풀은 줄기를 감싼 잎이 자줏빛을 띠는 점도 구분 포인트다. 또 뿌리가 갈대는 아래로, 달뿌리풀은 옆으로 뻗는 것도 차이점이다. 달뿌리풀이라는 이름이 ‘뿌리’가 땅 위로 ‘달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정리하면 이삭이 여고생 머리처럼 한쪽으로 단정하게 모여 있으면 억새, 무성하고 산발한 것처럼 보이면 갈대, 대머리 직전처럼 엉성하면 달뿌리풀로 구분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