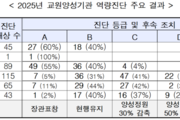고향 동네 근처 야산에는 큰 상수리나무가 있었다. 한여름 이 나무엔 풍뎅이들이 잔뜩 모였다. 나무에 있는 상처에서 나오는 수액을 먹으려고 몰려드는 풍뎅이들이었다. 운이 좋으면 등이 금빛으로 빛나는 황금풍뎅이, 뿔이 특이하게 생긴 사슴벌레도 잡을 수 있었다. 다 잡아도 그다음 날이면 다시 풍뎅이들이 가득 몰려 있는 화수분 같은 곳이었다. 나는 지금도 상큼한 듯하면서도 썩는 내가 살짝 섞인 참나무 수액 냄새를 잘 기억하고 있다. 산길을 가다 그 냄새가 나면 혹시라도 풍뎅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버릇이 있다.
우리는 여름방학 때 심심하면 이 나무로 몰려가 풍뎅이를 잡아서 놀았다. 지금 생각하면 좀 심했지만, 풍뎅이를 잡아 목을 한번 비튼 다음 바닥에 놓으면 날개를 펴고 빙빙 도는 것이 신기했다. 풍뎅이를 주머니에 가득 넣으면 풍뎅이들이 간지럼 태우듯 꼼지락거렸다.
내가 “풍뎅이를 잡을 수 있는 나무가 있다”고 하자, 초등학생 우리 딸들은 너무나 풍뎅이를 잡아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그 나무에 가보았지만, 풍뎅이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채집통에 젤리를 넣어둔 다음 밤새워 나무 아래 놓아보기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많던 풍뎅이는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위기철의 소설 <아홉 살 인생>은 초등학교 3학년 여민이의 눈을 통해 서울 산동네 가난한 이들의 고단한 삶을 때로는 가슴 아프게, 때로는 정겹고 따뜻하게 그린소설이다. 여민의 단짝 기종이는 산동네에서 부모 없이 누나와 사는 ‘뻥쟁이’다. 산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토굴 할매는 토굴 같은 집에서 외롭게 죽고, 골방에 갇혀 고시 등으로 성공을 꿈꾸는 골방 철학자도 비극적인 선택에 몰린다.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검은제비,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담임, 부잣집 딸인 피아노 선생 윤희 등 다양한 군상들이 나온다. 아홉 살짜리 꼬마 눈에 비친 삶은 그리 녹록지 않음을 등장인물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은 주인공이 숲에서 상수리 나뭇가지를 타고 노는 것이다.
숲은 내가 단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신비하고 무궁무진한 조화가 있는 놀이터였다. 숲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상수리나무와 아까시나무, 그 밖의 이름 모를 나무들로 뒤덮여 있는 한여름의 숲속은 더위를 느끼지 못할 만큼 서늘했다. (중략) 나는 숲에서 키 작은 상수리 나뭇가지를 타고 노는 걸 아주 좋아했다. 그 상수리 나뭇가지는 아이들이 말처럼 타고 놀기에 좋도록 적당히 휘어져 있었다. 그 가지에 올라 몸을 흔들면 쉽게 출렁출렁거렸고, 더구나 고삐 대신에 쥘 손잡이까지 달려 있어서 진짜 말을 탄 것 같은 상상을 하게끔 해주었다. 인근 동네의 온갖 꼬마들이 상수리 나뭇가지를 타고 놀았던 탓에 그 가지는 아예 말안장처럼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였다.
주인공 여민이가 다른 동네 아이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것도 이 상수리나무 때문이다. 짝궁 우림이에게 자랑하면서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여민이가 상수리나무를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인생을 배운 것이다.


굴피집을 짓는 ‘굴참나무’, 짚신 밑바닥에 깔던 ‘신갈나무’
상수리나무는 마을 근처 산지의 낮은 곳에 흔한 나무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 갔을 때 상수리나무 도토리로 묵을 만들어 올렸는데, 나중에 궁궐에 돌아와서도 계속 올리라고 해서, 수라상에 올랐다고 이런 이름이 생겼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상수리나무는 밤나무 비슷하게 생겼지만, 상수리나무 잎톱니는 엽록소가 없어서 하얗게 보이지만, 밤나무 잎 톱니는 엽록소가 있어서 녹색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수리나무는 참나무의 한 종류다. 그런데 ‘참나무’라는 종은 없다. 참나무는 어느 한 나무를 지칭하지 않고 참나무 종류를 모두 아우르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들국화라는 종은 따로 없고, 벌개미취·쑥부쟁이·구절초 등 가을에 피는 야생 국화류를 총칭하는 말인 것과 마찬가지다. 영어로는 오크(oak)여서 ‘오크밸리’ 같은 지명이 있다.
상수리나무는 참나무의 한 종류다. 그런데 ‘참나무’라는 종은 없다. 참나무는 어느 한 나무를 지칭하지 않고 참나무 종류를 모두 아우르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들국화라는 종은 따로 없고, 벌개미취·쑥부쟁이·구절초 등 가을에 피는 야생 국화류를 총칭하는 말인 것과 마찬가지다. 영어로는 오크(oak)여서 ‘오크밸리’ 같은 지명이 있다.
참나무에 속하는 나무는 상수리나무 말고도, 나무껍질이 굵어 굴피집을 짓는 데 쓰이는 굴참나무, 잎이 무리 중 가장 작은 졸참나무, 늦가을까지 황갈색 단풍이 물드는 갈참나무, 옛날에 잎사귀를 짚신 밑바닥에 깔창 대신 쓴 신갈나무, 잎으로 떡을 싸서 쪄 먹었다는 떡갈나무 등이 있다.
순서대로 둘씩 짝지어 기억하면 좋다.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 잎은 밤나무 잎처럼 길쭉하게 생겼다. 나머지 나뭇잎은 넓죽한 편이다. 나머지 나무 중에서 졸참나무·갈참나무는 잎자루가 긴 편이고, 신갈나무·떡갈나무는 잎자루가 없거나 아주 짧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 애들에게 ‘상굴, 졸갈, 신떡’으로 외우라고 했다. 이중 신갈나무가 우리 숲에서 가장 흔히 만날 수 있는 참나무인데, 우리 숲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무이기도 하다.
이들 참나무의 열매가 도토리다. 잎과 도토리깍정이를 같이 볼 수 있는 가을이 참나무 공부를 할 수 있는 적기다. 깍정이에 털이 많이 난 건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떡갈나무이고, 밋밋한 것은 신갈나무나 졸참나무·갈참나무 등이다. 특히 졸참나무 열매는 길쭉해서 구분이 쉬운 편이다.
 이 나무들을 처음부터 한 번에 구분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 특히 갈참나무와 신갈나무 잎 모양이 비슷하고 입자루 길이가 어중간한 경우도 있어서 구분이 어렵다. 더구나 이들 사이에 교잡이 일어나 두 나무의 특징이 반반씩 섞인 나무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인천수목원에서 아예 이름표를 ‘떡신갈나무’라고 붙여 놓은 나무도 보았다. 필자는 참나무 종류를 만날 때마다 언젠가는 구분하는 눈이 생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십수 년 동안 그냥 지긋이 바라보았다. 물론 특징들을 눈여겨 살펴보면서 말이다. 요즘은 구분하는 눈이 생긴 것 같기도 하다.
이 나무들을 처음부터 한 번에 구분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 특히 갈참나무와 신갈나무 잎 모양이 비슷하고 입자루 길이가 어중간한 경우도 있어서 구분이 어렵다. 더구나 이들 사이에 교잡이 일어나 두 나무의 특징이 반반씩 섞인 나무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인천수목원에서 아예 이름표를 ‘떡신갈나무’라고 붙여 놓은 나무도 보았다. 필자는 참나무 종류를 만날 때마다 언젠가는 구분하는 눈이 생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십수 년 동안 그냥 지긋이 바라보았다. 물론 특징들을 눈여겨 살펴보면서 말이다. 요즘은 구분하는 눈이 생긴 것 같기도 하다.
참나무는 밑동을 잘라도 어느샌가 다시 움을 틔우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다. 그래서 어딜 가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무다. 참나무는 한반도에서 소나무와 경쟁 관계였다. 기본적으로 참나무는 햇볕이 조금만 있어도 잘 살고, 소나무는 햇볕이 충분해야 잘 자라는 나무라 자연 상태에서는 참나무가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은 소나무를 보호하면서 참나무를 주로 땔감으로 베어내 균형을 이룬 편이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숲을 자연 상태로 놓아두면서 차츰 소나무가 밀려나고 참나무 숲이 늘어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