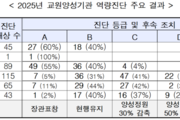박완서 단편 <거저나 마찬가지>는 한번 읽기 시작하면 한 번에 다 읽을 수밖에 없다. 가난하지만 순박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운동권 출신 이야기가 충격적인 데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에 책을 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인공 ‘영숙’은 대학을 중퇴하고 친척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했다. 한창 운동권이 위장취업을 할 무렵이었다. 주인공은 동료 직원이자 고교 선배인 ‘미스 서’ 언니의 부탁으로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글을 써주다 해고를 당한다. 그런데 ‘미스 서’ 언니는 운동권 남편 옥바라지를 하면서 겉으로는 민중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다. 주인공에게 원고 윤문을 시키고 쥐꼬리만 한 대가밖에 주지 않았다. 언니는 시골의 허름한 농가를 500만원 전세금만 내고 쓰라고 내준다. 500만원이면 ‘거저나 마찬가지’라는 말과 함께.
주인공이 언니의 농가에서 텃밭을 일구며 주변을 잘 꾸미며 살자 주변 땅값이 크게 오른다. 시대가 바뀌어 언니와 남편은 각각 시민단체와 공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언니는 주말에 친구들을 몰고 와 자기 별장이나 주말농장처럼 사용하고 영숙을 파출부 취급한다. 주인공은 처음부터 언니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영숙은 밀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무능력한 남자친구에게 아이를 갖자고 하지만 남친은 자식까지 고생시키기 싫다며 거부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더 이상 ‘거저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지 않겠다고 외친다. 그 집 근처 숲에는 ‘꽃이 하얗게 만개해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있는’ 때죽나무가 있었다. 그 대목을 읽어보자.

‘꽃이 만개한 때죽나무 아래는 순결한 짐승이나 언어가 생기기 전, 태초의 남녀의 사랑의 보금자리처럼 향기롭고 은밀하고 폭신했다. …(중략)… 나는 그가 머뭇거리지 못하게 얼른 그의 손에서 길 잃은 피임기구를 빼앗아 내 등 뒤에 깔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눈높이로 기남이의 얼굴이 떠오르든 때죽나무 꽃 가장귀가 떠오르든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때죽나무 꽃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아래에서 보는 것이 최고다. 드러누워도 좋다. 때죽나무 아래에서 보면 꽃송이들이 일제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하얀 꽃이 일제히 핀 모습이 장관이다. 영숙이 눈을 떴을 때 무엇이 보였을까. 박완서는 이 글을 통해, ‘운동’을 내걸며 서민들을 이용해 먹고 나중에 권력과 부를 차지하면 ‘서민의 삶’ 따위는 나몰라라 하는 인간의 위선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박완서는 꽃을 주인공에 이입(移入)시키는 능력이 탁월한데, 이 소설에서는 때죽나무꽃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꽃을 그리 길지 않게 묘사하고 지나가면서도 단숨에 특징을 잡아내는 것이 박완서 스타일이다.
이 소설에 나오는 때죽나무는 산에서는 물론 공원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마취시키는 성분을 갖고 있어서 잎과 열매를 찧어서 물에 풀면 물고기들이 기절해 떠오른다. 그래서 물고기가 떼로 죽는다고 때죽나무라 불렀다는 얘기가 있다. 또 가을에 주렁주렁 달린 때죽나무 열매를 보면 꼭 머리를 깎은 스님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떼중’이 변해 때죽나무라 불렀다는 설도 있다. 꽃이 작은 종처럼 생겨 영어로는 ‘Snowbell’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졌다.
아래서 봐야 더 예쁜 때죽나무
이승우의 장편소설 <식물들의 사생활>에도 때죽나무가 비중 있게 나온다. 주인공 형제와 순미라는 여자의 삼각관계가 소설의 뼈대인데, 형은 집 근처 왕릉 산책길에 있는, 소나무를 감싸고 있는 때죽나무를 보면서 이를 자신과 순미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긴다. 동생이 이 두 나무를 처음 목격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그 나무, 때죽나무가 있었다. 보는 순간, 그때까지 전혀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 때죽나무구나, 하고 곧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금방 눈에 들어왔다. 그만큼 인상적이었다고 해야 하나. …(중략)… 정말로 옷을 벗은 여자의 매끈하고 날씬한 팔이 남자의 몸을 끌어안듯 그렇게 소나무를 휘감고 있는 관능적으로 생긴 나무가 있었다. 흙을 파보면 모르긴 해도 뿌리들이 지상의 줄기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모습으로 소나무를 휘감고 있을 것 같은, 그곳에 그런 나무가 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승우는 작가 후기에서 “(집 앞의 왕릉에서) 굵은 소나무의 줄기를 끌어안고 있는, 매끄럽고 가무잡잡한 피부의 여체를 연상시키는 때죽나무를 보았다”고 했고, 다른 글에서는 이 나무들을 본 것이 ‘식물들의 사생활’을 착상한 계기였다고 밝혔다.
나는 이 나무와 소나무를 보고 싶었다. 취재해보니 이 왕릉은 고종과 순종이 잠든 남양주 홍유릉이었다. 처음 홍유릉에 가서 이 나무들을 찾는데 실패했지만, 소설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2주 후에 갔을 때 이 나무를 찾을 수 있었다. 홍릉과 유릉 사이 오솔길로 들어섰을 때 정말 소나무를 두 팔로 감싸 안은 듯한 나무가 있었다. 뿌리에서 두 줄기가 올라와 한 줄기는 오른쪽으로 퍼지고, 다른 한 줄기는 소나무 쪽으로 자라 두 팔을 벌린듯 소나무를 감싸 안고 있었다. 같이 간 아내는 “두 나무는 전생에 인연이 깊은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사랑을 나누듯 안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때죽나무와 아주 비슷한 나무로 쪽동백나무가 있다. 쪽동백나무는 등산하다 보면 산 중턱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두 나무는 꽃과 열매, 나무껍질이 모두 비슷하지만, 잎과 꽃이 달리는 형태가 다르다. 때죽나무는 잎이 작고 긴 타원형이며 끝이 뾰족한 반면 쪽동백나무는 잎이 손바닥만큼 크고 원형에 가깝다. 꽃이 달리는 형태도 때죽나무는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꽃차례에 꽃이 2~6개씩 달리지만, 쪽동백나무 꽃들은 20송이 정도가 모여 포도송이 같은 꽃차례를 이룬다. 쪽동백이라는 이름은 기름을 짜는 나무의 대명사인 ‘동백’에다 쪽배에서처럼 ‘작다’는 의미의 접두사 ‘쪽’을 붙인 것이다.
서울 인왕산 생태탐방길을 걷다 보면 때죽나무숲이 있다. 애들이 어릴 때, 까까머리 동자승들이 모여있는 듯한 때죽나무 열매들을 만지며 그 길을 자주 걸었다. 때죽나무 꽃이 진한 향기를 뿜어낼 무렵, 다시 그 길을 걸으며 영숙이 눈을 떴을 때 무엇이 보였을지, 소나무를 감싼 때죽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