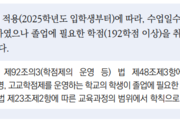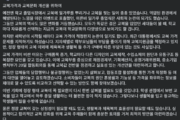[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혀가 얼어붙었다.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의 말은 늘어났고 늙어갔다. 교단에서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그때였다. 윤동주 시인의 묘비에 새겨진 글, “나이 스물아홉. 그 재질 가히 당세에 쓰일 만하여 시로써 장차 울려 퍼질 만했는데, 춘풍 무정하여 꽃이 피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아아! 아깝도다.” 깊게 새겨진 구절들이 잠자던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김일형 충남 서산고 교사는 작품을 응모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회고했다. 우울하고 절박했던 어둠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시’였다. 그가 최근 ‘월간 시’와 ‘서울 시인협회’가 주최한 ‘제1회 윤동주 신인상’에서 최종 수상자로 선정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밤이고 낮이고 시 쓰기에 몰입해 쏟아낸 300여 편의 작품 중 응모한 5편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만장일치로 수상자에 선정됐다.
김 교사의 시에는 윤동주 시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서정성과 따뜻한 시선, 생명력이 담겨있다. ‘너에게로 가려면 몸을 웅크려야 한다’는 <겨울새>, 따스한 햇볕이 겨울의 심장으로 파고드는 고요한 아침에 ‘거기 누구 없나요?’ 하고 불러보는 <새벽길>에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아프리카 소년과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쓴 <하쿠나마타타>에서는 인류애적 시선이 보인다.
사실 그는 3년 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상태로 2년 동안 싸워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진실은 밝혀졌어도 그와 가족이 입은 상처는 컸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딸아이와 노모, 아내를 생각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시 <평범한 아침>에는 그런 김 교사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콘크리트에서 튀어나온 녹슨 쇠꼬챙이가 찌를 듯 노려보고, 도로변 하수구에서 넘쳐흐른 흙탕물이 인도를 점령’한다. 매일 절박하게 하루하루 버텨내는 출근길이 그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음을, 사실 그런 절박한 출근길은 우리 모두의 삶이자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선한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신뢰가 깨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면 사람보다는 자연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들과 산, 나무, 구름과 같은 것들이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벗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 이번 생은 숲을 두리번거리다 갈 모양’이라며 끝을 맺는 <결>에서는 이처럼 평소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방황했던 김 교사가 자연에서 치유 받는 모습이 담담하게 드러난다. 그는 벼랑 끝에 섰던 시절, 상처를 문학과 시로 승화시키며 살아냈다고 했다. 시를 쓰는 동안 마음에 박혀있던 수많은 가시들이 하나씩, 하나씩 뽑혀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는 “마음속 진솔한 영혼이 자연과 맞닿는 순간 시를 통해 스스로를 다독이고 치유했다”며 “응모를 준비하면서 윤동주 시와 함께했던 시간은 얼어붙었던 제 혀가 새로운 세계를 찾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현재 학교에서 문예창작 동아리 ‘탱자성 겨울나무’를 지도하고 있다. 비록 지역에서 학력이 낮은 편에 속하나 문학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의 잠재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줄 수 있었다는 것. 그는 “맑고 순수한 영혼 덕분에 각자가 지닌 탁월한 지점을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아이들한테 상처받았지만, 결국 아이들로부터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분에 그가 지도한 제자들은 지난해 ‘제9회 여성·청소년 충남 문예 대전’에서 소설 부문 최우수상 2명, 시 우수상 1명 수상이라는 쾌거도 거뒀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고, 아직도 저를 오해하는 시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싶어요. 억울한 누명을 쓴 선생님이 있다면 제발 목숨을 끊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서 진실을 밝히시라고요.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벼랑 끝에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선생님들께 힘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가슴 따뜻한 글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평범한 아침>
허물만 벗어놓고 사라져간 뱀 껍질이
너덜거렸어
비는 아침까지 내려
간판 기둥이 모로 쓰러져 있고
은행나무 가지 끝에 닿을 듯한 먹구름은
집에서 멀어질수록 어둠을 밀어내고 동쪽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
먹구름에 배려를 기대하는 건 무모한 일
콘크리트에서 튀어나온 녹슨 쇠꼬챙이가 찌를 듯 노려보고,
도로변 하수구에서 넘쳐 흐른 흙탕물이 인도를 점령했지
어스레한 출근길 주변은 절박해 보였어
현관문을 밀고 나온 아침이
시간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
모퉁이를 돌아 간헐적으로 뒤뚱거리며 황량한 도심을 질주해오는 마을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야 늦지 않은 것은 아니야
물보라를 튀기며 버스가 지나갔을 때
어깨를 짓누르는 가방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지
주변이 보이지 않았을 때가 되어서야
아침이 시작되었던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