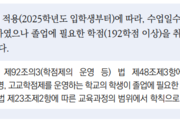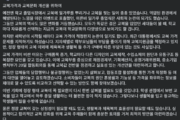해마다 5월이면 가슴 저편에서 밀려드는 그리움 같은 것이 있다. 싱그러운 햇살과 파릇파릇한 나뭇잎 사이로 떠오르는 얼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지 마냥 보고 싶고 궁금하다.
1991년 3월 진주교대를 졸업한 나는 거제 오량초등학교에서 첫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북신동이 집이었던 나는 매일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항상 거제대교를 지나다녔다. 출근길에 펼쳐진 견내량은 나의 첫 교직 생활에 대한 희망을 한없이 부풀게 했다. 출근길에 거제대교를 지나면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까?’ ‘자상하고 다정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생각하면 어느새 버스는 종점에 도착하곤 했다. 퇴근길 역시 넓고 푸른 바다를 보며 ‘오늘은 아이들 속에 내가 있었어!’ ‘오늘은 너무 화만 낸 것 같아.’ ‘내일은 또 다른 시도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3년 동안 견내량과 함께했다. 바쁜 가운데 1년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고 이듬해 3월, 5학년을 배정받아 아이들과 첫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됐다.
유난히 머리가 반짝이는 녀석이 내 신경을 건드렸다. 소매에는 콧물인지, 흙인지 모를 고장물이 적당히 묻어 있고 코 밑은 헐지 않을 정도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무엇을 하는지 자기 일에만 열중이었다. 머리는 왜 또 그렇게 빡빡 밀었는지……. 그렇게 그 녀석과 나는 처음 만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녀석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녀석은 ‘벽담사’라는 절에서 동생과 함께 학교를 다녔다. 그러니까 동자승이었던 것이다. 부모님은 이혼했고 아버지가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 절에 맡겨진 아이다.
녀석은 수업이 끝나면 언제나 내게 와서 냄새나는 머리를 내 가슴에 묻고 숨소리를 듣고 집으로 가곤 했다. 처음 녀석이 내 가슴에 머리를 묻고 숨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가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와! 신기하고 재밌다." 그 말에 난 "다 큰 녀석이 징그럽게 이게 뭐하는 짓이고" 하며 녀석을 밀쳤다. 그러나 녀석의 그런 행동이 애정 결핍에서 오는 전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전보다 녀석을 더 꼭 안아 주었다. 녀석도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 항상 말썽꾸러기에 공부는 겨우 문자 해득, 거기에다 도벽까지 누가 봐도 문제아였지만, 나에겐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제자였다. 내가 녀석에게 하는 만큼 녀석도 조금씩 변해 갔고, 남의 물건에 손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던 5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쓰러짐으로 인해 난 일주일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병간호를 해야만 했다. 다행히 아버지가 회복의 기미를 보여 그동안 보고 싶고 걱정되었던 반 아이들을 만나러 학교에 갔다. 그날이 바로 스승의 날 앞날이었다. 일주일 만에 나를 본 아이들은 기쁜 얼굴로 맞이해 주었고 그동안 옆 반 아이들에게 당한 서러움을 하나, 둘 나에게 하소연하며 그들을 응징해 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그 녀석도 친구들 틈에서 내 손을 잡으려고, 그리고 내 가슴을 찾아 몸부림을 쳤다. 눈에는 눈물도 글썽이고 있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쩌나?’ 내심 아이들은 걱정을 많이 한 모양이었다. 그렇게 오랜만에 아이들과 시간을 갖고 있는데 교내 방송에서 나를 찾았고, 그것은 불길한 예감이었다. 집으로 급히 갔으나 결국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못난 자식이 되고 말았다.
그 후로 며칠을 더 결근을 하고 나서야 학교로 갈 수 있었다. 학교에서 난 옆 반 선생님으로부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다. 스승의 날에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아이들은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교실에 풍선도 만들고 자기들이 직접 마련했는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보내줬는지 모를 선물을 교탁 위에 잔뜩 진열해 두고 선생님을 기다렸단다. 옆 반 선생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지만 내가 학교에 오지 못한다고 말했단다.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도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더란다. 그러더니 하나둘 울음을 터뜨리더니 나중엔 온 교실이 울음바다가 되더란다. 한 시간을 그렇게 울던 아이들은 배가 고픈지 선생님을 위해 준비한 초코파이를 나누어 먹고선 힘없이 집으로 갔단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학교. 선생님들도 퇴근 준비를 하는데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가 보았더니 글쎄, 나의 심장 소리를 듣던 녀석이 술에 취해 울고 있더란다.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선생님들이 업고 절로 보냈단다. 녀석도 스승의 날이라고 선생님께 무엇인가 선물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모은 돈으로 (훔친 돈 절대 아님) 선생님 드릴 선물이라고 소주를 두 병 샀단다. 다른 친구들 선물은 양말이니, 우산이니……. 자기가 보기엔 다른 친구들의 선물은 좋은 것 같은데 자기 선물은 초라해 보였던지 차마 교탁에 내어놓을 수가 없어 선생님께 직접 드리기로 마음먹고 가방에 넣어 두었는데 선생님이 오지 않자 실망한 나머지 많이도 울었단다. 다른 친구들이 집에 간 후에도 ‘선생님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단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 기다리기를 반복한 녀석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던지 남아있던 초코파이와 소주를 물로 착각했는지 1병을 전부 다 비우고 두 병째 마시던 중이었단다. 술에 취한 아이를 일으켜 세워 달래 집으로 보내려고 했으나 아이는 이리 쿵, 저리 쿵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면서도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는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더란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해 녀석은 잠이 들었고 남자 선생님이 아이를 업고 차에 태워 절에 데려다주었다고 한다. 어쨌든 그날의 우발적인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고 녀석의 어이없는 행동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뭔가가 느껴졌다. 이렇게 녀석과 한 해를 보내고 우리는 6학년이 되어 또 같은 반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해 9월. 녀석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다. 행동과 말이 점점 또다시 거칠어졌고 쉽게 짜증을 내는가 하면 예전의 도벽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녀석은 더 이상 내 가슴의 숨소리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가을 운동회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 그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녀석의 아버지와 새엄마가 학교에 찾아왔다. 그리곤 그날로 녀석을 데리고 마산으로 전학을 가버렸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동안 잊고 지내던 부모에 대한 증오가 되살아났던 모양이다.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새엄마가 싫었고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모양이다. 이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불만스럽고 거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고, 전후 사정을 몰랐던 난 녀석의 행동에 당황해하며 꾸짖기만 했었다. 녀석에게 좀 더 잘해 주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불쌍한 녀석. 녀석은 그렇게 친구들과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부모님의 손에 끌려 그렇게 가고 말았다.
전학 간 지 일주일 후 난 전학 간 학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녀석이 그곳에서도 적응 못 하고 말썽만 부리다가 결국 가출을 했다는 소식이었다. 안타까웠다. 녀석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줄 사람이 있었다면 녀석은 훌륭히 자랄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이후로 난 녀석을 찾기 위해 직접 마산까지 가 보았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옛날 빡빡머리 녀석의 잊지 못할 스승의 날 헤프닝과 함께 가슴 허전함을 느낀다. 또 언제 내 가슴에 묻혀 숨소리를 들으며 "선생님, 이상한 소리가 나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라고 말해줄 아이를 기다리며…….
-------------------------------------------------------------------------------------------------------
<수상 소감> 아이들을 기다리며….
한국교육신문에서 교단 수기를 공모한다는 글을 보고 지난 교직 경력 30년을 되돌아보았다. 1991년부터 시작된 나의 교직 생활은 20세기와 21세기를 함께 지내 온 시간이며 변화가 다양했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세계의 모든 사회, 문화, 경제가 위축되고 교육에서도 학교가 아닌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의 나는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많은 시간보다 훨씬 짧은 교직 생활을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교단 수기에 지난 30년의 교직 생활을 되돌아보며 첫 발령 때 설레이며 맞이했던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주제로 참여하게 되었다. 고이고이 접어두었던 나만의 추억이며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20~30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공감하며 이해하실지 궁금하기도 하다. 아마도 나와 같은 공감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 40~50대 선생님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나의 글을 통해 그 시절의 제자들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잠깐의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제자들을 응원으로 마음으로 남은 교직 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 끝으로 수상하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지금의 나는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많은 시간보다 훨씬 짧은 교직 생활을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교단 수기에 지난 30년의 교직 생활을 되돌아보며 첫 발령 때 설레이며 맞이했던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주제로 참여하게 되었다. 고이고이 접어두었던 나만의 추억이며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20~30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공감하며 이해하실지 궁금하기도 하다. 아마도 나와 같은 공감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 40~50대 선생님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나의 글을 통해 그 시절의 제자들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잠깐의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제자들을 응원으로 마음으로 남은 교직 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 끝으로 수상하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