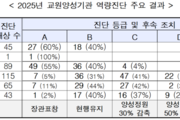매서운 겨울 이겨내는 감태나무 단풍
얼마 전 서울 홍릉수목원 숲에서 한겨울인데도 잎을 그대로 달고 있는 나무를 보았다. 주변 나무들은 상록수 빼곤 거의 다 잎을 떨구었는데 이 나무만 잎을 다 달고 있었다. 황갈색으로 단풍이 들긴 했지만 나뭇잎이 쭈그러들거나 상하지 않고 온전한 것도 이채롭다. 잎 사이엔 작은 가지 끝마다 새순이 수줍은 듯 숨어 있었다. 이 나무가 감태나무다.
감태나무는 이처럼 겨우내 단풍 든 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무들은 ‘시댁에 온 며느리’처럼, 단풍이 드는가 싶으면 어느새 잎을 떨구고 말지만 감태나무는 늦으면 봄이 무르익는 4월 초까지 잎을 온전히 달고 있다.
감태나무를 처음 본 것은 몇 년 전 3월 말 보춘화를 보러 안면도수목원에 갔을 때였다. 보춘화는 물론 노루귀·수선화·생강나무 꽃까지 다 피었는데 여전히 묵은 잎을 매달고 있는 나무가 있었다. 도대체 무슨 나무인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감태나무는 4월 초 새잎이 날 즈음에야 묵은 잎을 떨군다.
 전북 고창 운곡습지는 우리나라에 24곳 있는 람사르습지 중 한 곳이다. 한국관광공사가 ‘11월의 걷기여행길’ 5곳 중 하나로 이곳을 추천했다는 기사를 보고 가보았다. 운곡습지생태길 중 1코스를 걸었는데, 단풍이 거의 다 져서 좀 아쉬웠지만 원시적인 느낌을 주는 데다 정말 운치도 있어서 ‘이런 곳이 있구나’ 감탄하며 걸었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감태나무가 셀 수 없이 많았다는 점이다. 운곡습지 1코스는 감태나무길이라 불러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 나무가 많았다. 다른 곳처럼, 주변 나무들은 다 헐벗었는데 감태나무만 홀로 잎을 다 달고 있었다. 그래서 감태나무를 찾으려면 겨울이 좋다는 말이 있다. 초록이 무성할 때는 다른 나무들과 섞여 잘 보이지 않다가 겨울엔 쉽게 눈에 띄는 것이다.
전북 고창 운곡습지는 우리나라에 24곳 있는 람사르습지 중 한 곳이다. 한국관광공사가 ‘11월의 걷기여행길’ 5곳 중 하나로 이곳을 추천했다는 기사를 보고 가보았다. 운곡습지생태길 중 1코스를 걸었는데, 단풍이 거의 다 져서 좀 아쉬웠지만 원시적인 느낌을 주는 데다 정말 운치도 있어서 ‘이런 곳이 있구나’ 감탄하며 걸었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감태나무가 셀 수 없이 많았다는 점이다. 운곡습지 1코스는 감태나무길이라 불러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 나무가 많았다. 다른 곳처럼, 주변 나무들은 다 헐벗었는데 감태나무만 홀로 잎을 다 달고 있었다. 그래서 감태나무를 찾으려면 겨울이 좋다는 말이 있다. 초록이 무성할 때는 다른 나무들과 섞여 잘 보이지 않다가 겨울엔 쉽게 눈에 띄는 것이다.

낙엽수들은 날이 추워지면 잎자루가 줄기와 붙는 쪽에 ‘떨켜’라는 분리층 조직을 만들어 잎을 떨군다. 더는 기능을 못하는 잎을 제 발밑으로 떨어뜨려 남은 영양분이라도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감태나무는 무슨 미련이 남아서 묵은 잎을 떨구지 못하고 겨우내 버티는 것일까. 감태나무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새순의 추위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겨우내 묵은 잎으로 감싸고 견딘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는 조상이 상록수여서 잎자루와 가지 사이에 떨켜가 잘 생기지 않는 데서 원인을 찾는다. 상록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감태나무는 녹나무과라는, 아열대에서 주로 자라는 상록수 집안이다. 생강나무·비목나무가 같은 녹나무과 형제 나무들이다. 하지만 칼바람 속에서 단단히 잎을 매달고 있는 것이 어미 나무가 새끼를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였다. 상술이 뛰어난 일본인들은 입시철에 감태나무 잎을 포장해 수험생들에게 주는 선물로 팔고 있다. 감태나무 잎처럼 떨어지지 말고 꼭 합격하라는 의미다.


감태나무는 서해안과 충청 이남의 양지 바른 산기슭에서 자란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서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 이 글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아, 이 나무가 감태나무구나’ 할 것이다. 그만큼 겨울엔 남부지방에서 눈에 잘 띄는 나무다. 4월 중순쯤 잎과 함께 작고 연한 황록색 꽃이 우산 모양으로 피고 가을엔 콩알만 한 열매가 달린다. 흑진주를 연상시킬 만큼 새까만 것이 생강나무 열매와 닮았다. 감태나무로 지팡이를 만들면 중풍이나 관절에 좋다고 해서 남벌당하기도 한다.


감태나무라는 독특한 이름의 유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는 책 <우리나무 이름사전>에서 “잎이나 어린 가지를 찢으면 나는 향기가 바다에서 나는 해초 감태 냄새와 닮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했다. 제주도 등 일부 지방에서는 백동백나무라고 부른다. 얼핏 동백나무를 닮았고 수피가 밝은 회색인 점 때문인 듯하다. 북한 이름은 흰동백나무다.

지극한 모성애 보여주는 박태기나무 꽃
감태나무야 한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는 것을 운치로 볼 수 있지만, 요즘 가로수로 많이 심는 대왕참나무에 이르면 얘기가 좀 다르다. 도입종인 대왕참나무는 잎이 임금 왕(王) 자 모양이라 이런 이름이 붙었다. 수형이 아름답고 잎이 무성해 가로수로 나무랄 데 없는 나무다. 그런데 이 나무도 잎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감태나무와 다른 점은 겨우내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겨울에 대왕참나무 주변에는 낙엽이 뒹구는 것을 볼 수 있다. 거리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눈이라도 내리면 낙엽이 눈과 섞여 더욱 지저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에서도 참나무 종류들이 비교적 잎을 오래 매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감태나무에서 보듯, 어미 식물들의 자식 사랑은 동물 못지않다. 자식을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 눈물겨울 정도다. 초봄에 피는 처녀치마는 꽃이 필 때는 한 10cm 정도 크기다. 그러나 수정한 다음에는 점점 꽃대가 자라기 시작해 50㎝ 정도까지 훌쩍 크는 특이한 꽃이다.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뒷산에서 60cm 이상 꽃대를 높인 처녀치마를 본 적도 있다. 꽃대를 높이는 것이 꽃씨를 조금이라도 멀리 퍼트리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할미꽃도 꽃이 필 때는 허리를 푹 숙이고 있지만 꽃이 지면 꽃대가 똑바로 서며 열매를 높이 매단다.


박태기나무의 새끼 사랑도 특이하다. 박완서 소설 ‘친절한 복희씨’에서는 순박한 시골 처녀가 이성에게 처음 느낀 떨림을 “봄날 느닷없이 딱딱한 가장귀에서 꽃자루도 없이 직접 진홍색 요요한 꽃을 뿜어내는 박태기나무”에 비유했다. 계명대 강판권 교수는 한 글에서 “박태기나무의 꽃은 어린 자식이 혹여 어미를 잃어버리기라도 할까 봐 엄마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처럼 나무줄기에 딱 붙어 있다”며 “박태기나무가 꽃을 몸에 바짝 붙여 달고 있는 것은 자식을 많이 낳고 싶은 모성애 때문”이라고 썼다.
감태나무는 단풍 색깔이 곱고 수형이 아름다운 데다 너무 크게 자라지도 않아 마당에 심기에도 적절할 것 같다. 서울 근교에서 자생하지는 않지만 서울 홍릉수목원, 광릉 국립수목원, 인천수목원 등에서 겨울에 줄기 싸주기 같은 방한 조치가 없어도 잘 자라는 것을 보면 전국 어디에 심어도 문제없을 것 같다. 언젠가 마당이 생기면 꼭 감태나무를 심어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