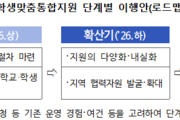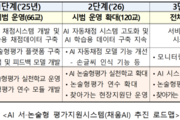언제부터인지 사람들 사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알려져 있다. 이렇듯 일찍부터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 인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식에 의해 오늘날의 생존과 성장이 가능했다. 이는 어우러져 살아가는 힘이 절대적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척박한 환경과 적대적인 외부의 위협에도 꿋꿋이 작동하여 생존의 결과를 남긴 인류의 위대한 투쟁이자 정신적 진화의 열매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인류는 그 기나긴 역사를 거치면서 뼛속 깊게 자리하고 있는 공존의 DNA를 변이시켜 왔다. 경쟁으로 인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팍팍한 삶이 그를 증거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장기간에 갈친 코로나19 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를 통해 어우러져 살아갈 희망마저 상실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최근 코로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이 독일에서 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 작가 율리 체(Juli Zeh)가 신작 『인간에 대하여』를 내놓았다. “우리는 과연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를 화두로 하여 팬데믹 시대에 나타나는 편견과 나약함, 그리고 불안에 대해 가장 절박하게 현실을 그린 최초의 코로나 소설이다. 2년 전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봉쇄되기 직전이던 2020년 3월부터 3개월 동안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독일 아마존에서 49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은 “당신은 네오 나치의 이웃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거칠게 재요약할 수 있다. 내용인즉, 주인공 도라는 로켓이라도 타고 대도시의 쳇바퀴 같은 생활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거기다 연인인 로베르트는 특정한 ‘정치적 올바름’에 과도하게 집착해 도라를 미치게 한다. 기후 위기와 코로나라는 재앙에 앞장서서 세상이 멸망한다는 시나리오도 끔찍하지만, 도라에게는 자기 생각만을 강요하는 연인이 더 끔찍하다.
결국 도라는 원래 살던 곳과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간다. 복잡한 윤리적 고민에 시달리다 시골로 도망쳐 왔건만, 옆집에 사는 고테라는 남자는 ‘이 마을 나치’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런 표현을 쓰다니,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는 것은 머리 아픈 일이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뿐이랴. 선량한 얼굴을 한 또 다른 이웃은 아무렇지도 않게 인종차별적 말을 내뱉는다. 도시에도 시골에도 적응하지 못하던 도라는, 계속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얽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소설에서 “당신들 대도시 여자들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모두 나치라 부른다”는 고테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제각각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으며 살아가지 않는가. 도시화, 기후 위기, 코로나, 빈부격차 등으로 삶이 팍팍해질수록 생각의 폭은 좁아져만 간다. 작가는 “인간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느냐?”라고 물으며 함께 살아가는 데 어떤 행동과 말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는 법, 도덕, 품위, 취향 등에 의해 갈라지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마주하는 걸 힘들어한다고 말한다. 이런 경향은 사람들을 더욱 외로운 존재로 만들고,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나눌 수 있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방해한다.
어우러져 사는 삶! 이어폰을 끼고 다니며 주변의 소음을 참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공허하게 다가온다. 온통 혼자 지내기만을 꿈꾼다. 주변을 보라. 1인 가구의 오피스텔, 혼밥을 즐기는 사람들..... 모두가 나홀로족들이 압도적이다. 그래도 작가는 이 소설을 출간함으로써 코로나 위기에서도 우리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찾으려고 오백 페이지가 넘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이는 인류의 공존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의 행복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의 앞길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