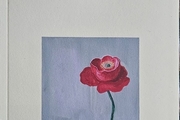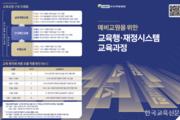처음 학교에 임용되었을 때만 해도 교권 침해 사건이 자주 보고되었고, 선생님들의 사기는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학술지에는 ‘교사 소진(burnout)’ 연구가 부쩍 늘었고, 학회에서 만나는 상담자들은 “요즘 내담자 중에 선생님이 많아요”라는 말을 자주 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 상담센터도 교육청과 MOU를 맺고 교사 마음돌봄과 소진을 주제로 워크숍, 집단상담, 개인상담을 진행했다. 사회적으로도 ‘자기돌봄’, ‘마음돌봄’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시기였다. 나 역시 그 일을 의미 있고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러던 중 2023년 여름,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대학원에 다니던 선생님을 위한 지지집단 모임을 열었는데,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모인 분들 대부분이 “사실 나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다”고 고백했다. 그 고통의 깊이와 무게가 오래 마음에 남았다. 동시에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고발당하고 모욕감을 느낄 때 옆에서 위로하고 함께 분노하기는 했지만, 정작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교사 소진과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 교육공동체 문화의 문제를 상담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상담효과는 사회구조 변화서부터
상담이론은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다 보니 상담은 주로 ‘개인 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마음을 돌보는 데 초점을 둔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어떤 고통은 사회문화 속 불평등이나 제도적·구조적 억압으로부터 생겨난다. 이런 경우, 아무리 상담을 받고 마음을 다잡아도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어려움은 반복되고 변화는 어렵다. 교사의 소진과 무기력, 분노와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마음돌봄은 잠시 버티는 힘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상처는 반복된다.
이러한 한계를 자각하면서, 최근 상담 분야에서도 ‘사회구조 상담역량(structural competency)’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개념은 원래 의학교육 분야에서 의사가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진료 과정에서 반영하는 능력을 의미했다. 상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상담자의 역량을 뜻한다.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내 탓’으로만 여기지 않도록 돕고, 문제의 원인을 사회·문화·제도적 맥락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실 안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변화를 찾아가되, 상담실 밖에서는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마음과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연대와 행동이 교육공동체 지켜
상담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버티는 힘을 키워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 아닐 때, 불합리한 사회제도의 변화 없이 고통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때 문제를 바꾸는 힘은 연대와 시민행동에서 나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서이초 사건 이후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행동은 사회구조 상담역량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잘 보여준다. 교사들은 자신의 고통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았다. 교육제도와 정책의 구조적 불합리를 드러내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 연대의 움직임이 모여 법이 개정되었고, 그 변화의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법이 바뀌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은 상담을 통해 마음을 돌보는 동시에, 연대와 시민행동을 통해 자신과 교육공동체를 함께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상담의 효과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그 마음은 단순한 위로와 돌봄을 넘어, 선생님이 경험하는 사회적 맥락과 구조를 이해하고 함께 바꾸려는 태도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제 상담이 교사의 현실에 더 깊이 응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