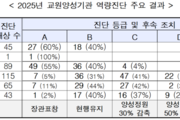단위 학교가 신학기 맞이에 여념이 없다. 입학식 준비와 새로운 학년, 학급을 배정받고 업무를 인수인계 하느라 분주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해야 할 학교 분위기가 침잠되어 가는듯해 안타깝다. 누구는 담임에서 배제돼 편하겠고, 또 누구는 육아휴직을 써서 좋겠다, 언제 명퇴를 할까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래서는 신임교사의 본보기도, 살아있는 교단도 될 수 없다.
물론 일부지만 이런 모습은 학생의 학력과 건강한 인성을 책임지겠다는 사명감, 철학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는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교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육자는 회초리를 들고라도 ‘교육’을 지켜나가겠다는 의기를 가져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급여생활자일 뿐이다. 학생에 대해 목숨을 걸어야 진정한 스승인 것이다.
특히 담임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보다도 더 오랜 시간 학생과 함께하는 담임교사야말로 존재 자체가 교육내용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새학기 배정받은 학생의 이름을 익히고 필요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은 기본이다. 급훈은 무엇으로 정할지, 상담은 어떻게 할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지도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스승으로 남을지 솔선해 고민해야 한다.
교육당국과 정치권, 사회도 이제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실은 갈수록 난장판이 되고 학생, 학부모의 교권 침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는 교사에게 폭언한 학생조차 전학시킬 수 없는 현실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판결하는 법원과 무책임한 ‘인권’만 들이대는 교육감이 변하지 않고는 신학기 교육에도 희망은 없다.
무엇보다 올해는 교육감들이 교육에만 신경 쓰기를 바란다. 교원과 학생을 ‘님’으로 생각하고 멍든 교육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상처를 깁는 일에 몰두하기 바란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