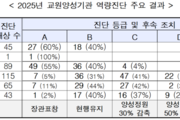역대 최악으로 평가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무엇보다 ‘상생과 협치’를 주문하고 있다.
백년지대계를 추구하는 교육계는 더더욱 그렇다. 교육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이야말로 상생과 협치의 가치가 가장 빛나야 할 지점임에 틀림없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미학을 발휘하는 지혜를 보여줄 때, 학교를 살리고 새로운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개원 초부터 삐걱대는 국회의 모습에 교육계는 벌써부터 앞날을 우려하고 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세 싸움은 물론이거니와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등을 놓고서도 일전을 벌일 태세다. 또다시 정파와 이념에 따른 극한 대결이 불보듯 뻔하다. 여기에 민선교육감까지 가세할 경우, 교육은 온통 정치화되고 교원들은 정치권 눈치를 살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일 수밖에 없다.
특히 20대 국회는 대선이 맞물려 있어 더 우려된다. 교육이 대선의 전초전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정치지형 변화에서 균형추를 잘 잡지 못한다면 학교는 또다시 당리당략에 휘말려 표류하게 될 것이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에서부터 행정, 정책, 제도 등 모든 부분이 국회의 입법 활동과 연관돼 있는 만큼 교육이 정치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어린 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 현장에는 결코 어떠한 정파적 이해나 이념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
교원들이 국회에 바라는 바는 소박하다. 그저 후보자였을 때 약속한 초심을 잃지 않고 학생과 교원을 중심으로 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교문위가 ‘불량’의 오명을 벗고 ‘우량’ 상임위로 거듭 나길 바랄 뿐이다. 정치보다 교육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