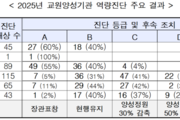지난달 23∼24일 서울과 제주에서 2000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해 150곳의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급식실 종사자, 방과후 돌봄전담사, 교무실무사, 전문상담사 등이 참여한 파업은 강원, 경기, 전북에 이어 도미노처럼 전개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이달에는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현장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일선 학교는 간편식 주문이나 도시락 지참, 빵·음료 등을 주문하고, 단축수업을 하거나 정교사들이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는 등 파업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교육현장의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누리과정과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집단 휴업이 학부모들의 교육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더 큰 문제는 교육현장의 파업·휴업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제도 변화에 출렁이며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교육감이 다수의 고용 주체라는 점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교육감들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부족한 교육재정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 학교 비정규직을 양산한 장본인은 교육감들이다.
학교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사람도 한 가정의 가장이다. 비록 넉넉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처우 개선이 수반돼야 교육에 헌신할 수 있다. 이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혼란과 불신을 막는 첩경이다.
동시에 교육현장의 파업과 휴업은 자제해야 한다. 어른들의 명분에 떠밀려 학생 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
잇따른 파업·휴업을 딛고 더 굳건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정부와 교육감의 책임이 누구보다 막중하다. 상생과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학교 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하길 기대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