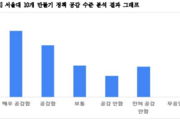엘리엇(T.S Eliot)는 그의 작품 <황무지>에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언급했다. 선생님인 나에게 있어서 잔인한 달은 5월이 아닌가 생각한다. 5월이면 우리 선생님들은 마치 도마 위에 오른 생선처럼 난도질당하기 일쑤이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를 보면 이건 가관도 아니다.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오늘 우린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교육 현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두가 자기 몫 챙기기에 분주하고 작금의 모든 일을 안하무인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학생들이 아닌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고사리 손으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아이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는 것은 선생으로서 아니 스승으로서 자책감 때문인지도 모른다.
교사인 나에게도 5월의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면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다. 누구나 마음 속 깊은 곳에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듯이 내 작은 마음 한구석에도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신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학교에 입학한 지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나와 선생님의 첫 만남. 자그마한 체구에 흰 모자와 호루라기 그리고 단정한 유니폼까지 그는 누가 보아도 체육선생님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나와 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그런 선생님과의 만남을 좋아했다.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시던 선생님,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런 선생님 모습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지 모른다. 선생님은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르셨다. 담당과목인 체육과 더불어 학교 봉사일 뿐만 아니라 사회 봉사까지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을 하셨으며 최선을 다하셨다. 체육 시간만 해도 그랬다. 틀에 박힌 체육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수업 형태로 우리들을 지도해 주셨다.
당신의 일에 열정을 다 바치시던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셨다. 교정 구석구석 선생님의 체취가 남아 있지 않은 곳이 없었기에, 선생님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그 후 며칠이 지난 후 우린 선생님의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정정하시던 선생님께서 백혈병에 걸려 서울 큰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동안 학교는 선생님의 얘기로 떠들썩했고 간간이 들려오는 얘기로는 오래 사시지 못한다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선생님에 대한 우리들은 안타까웠지만 그 아픔을 같이 하기엔 그 시간이 너무도 길었다. 그래서일까 선생님의 빈자리를 그 어느 누구도 채울 수는 없었다. 그만큼 우리들의 그리움이 컸기에...
우린 선생님을 영원히 못 보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선생님은 힘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다시는 학교에서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선생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오신 것이었다. 예전처럼 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미소만은 여전하셨다. 선생님은 여러 선생님들과 간단한 인사를 하신 후 학교 교정을 둘러 보셨다. 학교로 돌아오시기까지 너무나 힘드셨기에 교정을 돌아보시는 선생님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이셨다. 그 쓸쓸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후로 우린 학교에서 선생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다시 병이 재발하여 선생님은 입원을 하셔야 했다. 이제 다 끝난 줄만 알았는데 다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믿었는데 우리의 바람이 너무 컸던 것일까?
선생님과의 재회 기쁨도 잠시일 뿐 우린 또 다시 선생님을 떠나 보내야만 했다. 힘들게 다시 만난 기쁨도 잠시일 뿐 또다시 헤어져야만 하는 그 아쉬움과 슬픔은 만남의 기쁨보다 더 컸다. 어쩌면 선생님을 영원히 못 볼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한 달이 지난 뒤 선생님은 사랑하는 가족과 제자들만 남겨놓고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시고 말았다. 선생님의 유언대로 선생님의 영정과 더불어 선생님을 실은 영구차가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서 있던 전교생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은 가시는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걱정해 주셨다. 당신 자신보다 학교와 제자를 더 아끼셨던 선생님, 언제나 우리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주셨던 선생님,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어느 무엇보다 더 자랑스럽고 훌륭하게 보인 적이 없었다. 항상 선생님은 수업을 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곤 하였다.
"나는 죽어도 이 교단에서 죽으련다. 나는 교단에서 너희들을 가르칠 때가 제일 행복하단다. 그리고 나의 스승은 다름 아닌 바로 너희들이란다. 자, 선생님들 한 시간 잘 부탁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은 우리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 주셨다는 것이다. 꾸중보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생님. 그 분이 하늘 나라로 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와 선생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헤어짐이 있기까지 순간 순간이 소중함 그 자체였다. 어쩌면 선생님은 나의 이름과 모습을 잘 모르실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 영원히 선생님을 '내 마음속의 스승'으로 간직하며 살아가리라 라고 다짐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시던 그 모습을...
지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나로서는 선생님의 발자취 하나 하나가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쩌면 내 인생의 좌표를 그어 준 분이 바로 그 선생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말로써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신 선생님 당신은 정말이지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끝으로 이 순간에도 학생들을 위해 어디에선가 묵묵히 참교육을 실천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리라 본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을 뜻을 표하고 싶다. 교사로서의 자세가 흔들릴 때마다 그 선생님을 생각하며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처럼 사도헌장을 읊조리며 내 자신을 담금질 해 본다.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인 만큼 우리 교육 현장이 빨리 거듭나기를 바란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