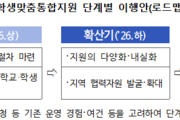추석 명절이 다가오자 연일 졸업한 제자들로부터 안부 전화가 걸러와 기쁨의 비명을 지른다. 어떤 제자는 문자 메시지로 온갖 문구를 써서 보내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온갖 아바타가 그려진 이메일을 보내는 제자가 있어 가끔은 격세지감을 느끼곤 한다.
가끔은 이름은 알겠는데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 때면 지나간 졸업 앨범 사진을 뒤척이며 얼굴을 확인하곤 한다. 제자들은 애교 섞인 말로 찾아뵙지 못함을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기 전에 다음에 꼭 찾아뵙겠다는 말을 덧붙인다. 사실 전화를 하지 않는 제자들도 많은데 그나마 전화라도 해주는 제자가 더할 나위 없이 고맙기만 하다. 이 모든 것들이 교사이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
그런데 문안을 하는 제자의 공통점이 있다. 학창 시절, 공부도 잘 하고 행동 또한 모범생인 학생들로부터 안부 전화나 편지를 받기란 여간 쉽지가 않다. 그나마 연락을 취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말썽을 많이 피워 학생과를 자주 드나들던 학생들이다. 선생님 또한 그런 제자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한다.
저녁 퇴근 무렵. 주머니 있던 휴대전화의 벨이 울렸다. 발신 전화번호가 낯설었다. 전화를 받자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울러 나왔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O회 졸업생 OOO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름과 얼굴 생김새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특히 졸업을 한 지 십 년이 넘어 제자의 얼굴을 떠올리기까지는 한참이나 걸렸다.
“맞다. 너였구나.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래, 잘 지냈니?”
그제야 제자는 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되었는지 말을 계속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제야 전화를 드려서 말입니다. 건강하시죠? 저 때문에 병이라도 나지 않았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원, 별 소리를 다하는 구나. 그래, 요즘 뭐 하고 있니?”
“예, 서울에서 자그마한 벤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성공을 했구나.”
“선생님,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사물함 깊숙이 묻어 둔 10년 전의 교무수첩을 꺼내 보았다. 누렇게 퇴색된 종이 위에 제자의 흑백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교사로서 노하우가 없었던 초임시절 오직 왕성한 혈기만 가지고 아이들을 다루었다. 유난히 문제가 많았던 우리 반은 모든 선생님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하루라도 사건이 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다. 온갖 방법으로 아이들을 다루어 보았지만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이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제일 내 말을 듣지 않은 녀석이 오늘 전화를 한 제자였다. 지각 내지는 결석, 싸움질, 금품갈취, 흡연 등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떠 맡아서 하는 녀석이었다. 그래서 나로부터 매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심한 말까지 들어야만 했다. 하물며 교사로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까지 했으니 말이다.
“네가 졸업하여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하기에 간신히 졸업은 시켰다. 졸업을 한 후, 이 녀석은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으며 나 또한 이 녀석에게 질려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전화를 한 제자는 내 생각과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문제아가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아가 된다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학창 시절 일그러진 영웅이었던 그 녀석이 당당하게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