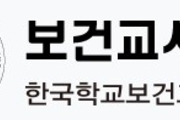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승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존경하고, 추모하자는 뜻으로 제정된 스승의 날을 선생님들이 선물이나 촌지를 받는 부정적인 날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풀이라도 하려는 듯 스승의 날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다보니 당사자인 선생님들에게는 오히려 괴롭고 부담스러운 날이 된지 오래다.
오죽하면 많은 학교들이 스승의 날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알면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자율휴업일로 정해 하루를 쉬기로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루를 쉬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스승의 날은 동내 북만도 못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법정 수업일수가 정해져 있는 학교에서 왜 굳이 기념일 날 쉬려고 할까? 다른 기념일마냥 제대로 대우받는 날이 아니기도 하고, 선물이나 촌지를 거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을 벌이되, 촌지를 받은 교사가 적발되면 행동강령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금 한겨레신문에 실린 현장리포트 ‘알면 다쳐 70년대 수학여행은 지금도 계속된다.’가 각종 인터넷 매체나 입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어쩌면 스승의 날을 앞둔 교사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이고 있다.
취재원에게는 때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기사가 있다. 기사의 내용대로 지금이 수학여행 철이고, 제보를 받아 취재가 시작되었을 수 있다. 그런데 하필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둔 이때냐다. 그래서 언론에서 관행처럼 하고 있는 ‘스승의 날 물먹이기’라는 의구심이 든다.
더구나 기사의 내용을 보면 80년대 자신의 수학여행 시 도시락의 단무지 사이에서 엄지손가락만한 벌레가 나왔었다며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직도 업체에서 부정적인 돈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양 묘사되어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기 이전에 수학여행에 관해 좋은 추억만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황스럽기도 하다.
또 수학여행뿐 아니라 체험학습이나 졸업여행 등 학교에서 실시하는 단체여행은 다 똑같다는 식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우리 학교도 며칠 전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는 소인수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담당한 교사의 애로점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전체인양 매도해도 되는지, 그런 것이 바로 일부 기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은 아닌지도 묻고 싶다.
조련사의 칭찬을 들으면서 고래는 춤을 춘다.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면서 각박한 사회를 만들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의 매스컴은 교육의 긍정적인 면을 알리는데 인색하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스스로 잔잔한 감동과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는 동료나 선배들을 찾아 소개하는 수밖에 없다.
제25회 스승의 날을 맞아 2006년 2월 28일자로 인천관교 초등학교에서 퇴임하신 김 경배선생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한다.
김 선생님은 37년간 초등학교 교단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온갖 정열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며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배출했다. 한편 아이들 곁에 있는 게 교사의 사명이라며 승진의 기회도 마다하고 평교사로 정년을 맞이한 걸 보람으로 느끼신 분이다.
정부에서 수여하는 훈・포장 수여식에서 황조근조훈장을 받으며 정년퇴임하신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는 김 선생님의 교육애는 스승의 날을 맞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만큼 남달랐다. 2005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정년기념 ‘날개 달린 아이들’ 사진전을 열었을 때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세계를 김 선생님 특유의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한 작품들을 전시해 학부모와 학생들을 감동시켰고 예술인들로부터도 찬사를 받았다.
이날 남들이 다하는 정년퇴임식을 마다하고 전시회로 대신한 김 선생님은 800여 만원 상당의 작품집을 제작하여 전교생에게 무료로 나누어주었다. 또 전시된 작품은 일일이 낙관을 하여 작품 속의 주인공들에게 기념품으로 줬고, 이날 전시되었던 대형작품 16점을 학교에 기증하여 아이들의 정서와 인성교육에 보탬이 되게 하였다.
3개월 전인 2006년 2월 17일 관교초등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는 37년간을 마무리하는 김 선생님의 수업이 있었다. 정든 교단을 떠나는 마지막 수업인 만큼 만감이 교차되는 가운데 시작 된 수업이었다.
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세상이 아름답듯 인생도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가짐, 나보다 남을 배려 할줄 아는 마음 갖기,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바 책임완수하기를 겨울방학동안 인도 여행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와 곁들여 더 넓고 아름다운 세계를 향하여 꿈과 희망의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보자는 내용으로 수업을 마쳤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큰 절을 올리며 인사를 드렸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커서 나라의 튼튼한 기둥이 되라’고 아이들에게 일일이 건네는 선생님의 덕담에도 촉촉하게 눈물이 배어났다. 김 선생님은 아이들을 한명씩 가슴으로 안아주고 악수를 나누며 교실에서 마지막 감회에 젖었다.
훌쩍거리며 복도에서 서성이는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창가에 선 김 선생님이 흐려진 눈시울로 그동안 뛰고 달렸던 운동장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창밖엔 4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손수 가꿔왔던 수생식물과 야생화단지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는 것을 왜 김 선생님만 알까.
소리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교단을 지켜온 김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교육계의 앞날엔 그래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김경배 선생님과 같이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정열을 불태웠던 선배 선생님들과 그동안 나에게 깨우침을 준 은사님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