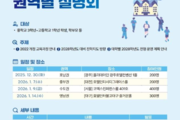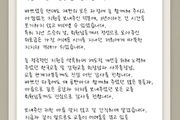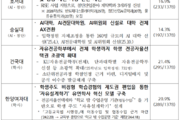2005.1.7. 금
호텔을 옮겨 200루피에 묵고 아침 7시 30분 쯤 눈을 떴다. 자항기르가 이제 나의 관광가이들 나서고 싶은 눈치다.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다. 어떤 미국인은 매일 20$씩을 주었고 어떤 독일인은 매일 7달라씩 주었다는 등, 또 일본사람을 들먹이기도 했다. 공연히 여자 얘기 섹스 얘기도 들먹이며 호감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도 같았다. 바라나시에서는 하루에 1,000루피씩 주기도 했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다.
어제 그저께 계속 안내를 했다는 얘기로 생색을 내며 오늘은 돈을 주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맞긴 맞는 얘기다. 한국이나 미국이라면 하루에 20달라 아니라 50달라라도 주어야 했을 것이다. 20달라래야 20.000정도 아닌가. 1,000루피래야 26,000원이 아닌가. 그의 말이 일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내 예산을 감안하면 그것은 터무니 없는 비용이다. 이제 결론은 났다. 그냥 식사와 교통비, 입장료만 제공하고 함께 지내보려고 했었는데 예산상의 부담으로 안되겠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그의 친절이 고맙고 그의 영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유창해서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지만 경비문제 때문에 오늘은 그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약속한 대로 오전 8시 30분 쯤에 그가 왔다. 만나 얼마 안되었는데 오늘은 돈을 주어야 한다고 미리부터 다짐을 받으려 한다. 그의 의도가 이제 확연해졌다. 나는 조금뿐이 줄 수 없다. 나는 여행자이고 돈이 떨어지면 큰 문제다.
나는 당신에게 안내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friendly guide(우정의 안내)를 하는 거란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면서 최소한의 수고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는 하지만 내 예산이 40만 원인데 하루에 그에게 10,000원씩만 더 써도 상당한 비용인 것이다. 외국에 나가니까 그 나라의 물가에 맞춰지게 되는 것 같다.
제 말로 friendly guide라고 하지만 그는 직업삼아 가이드를 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외국의 사정을 잘 알고 당신네 나라에서 돈을 쓰듯이 인도에서도 좀 돈을 쓰라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깔리사원에서 그가 3,000루피를 선뜻 냈을 때 나보고도 따라서 하라는 것 같아서 지금도 약간 불쾌하다. 혹시 만에 하나 그들끼리 짜고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1,000루피래야 26,000원이지만 예상하지 않았던 돈을 내고 후회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3,000루피를냈는데 그것은 80,000만원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정도면 인도의 보통 시민에게는 엄청나게 큰돈이다. 아무리 부모가 잘 살고 부모가 주었다고 했지만 또 그들의 신과 헌금에 대한 관례를 이해한다 해도 그들 형편엔 큰 돈임에 틀림없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 지 몰라 망설여 지기만 했다. 그의 경쾌한 성격과 상당히 유창한 영어, 또 캘커타 지리에 밝은 점은 좋은 데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타려하는 등 나와는 생각이 달랐다. 입장료, 음료수, 식사 모두 2중 부담인 것이다. 일단 Victoria Mrmorial(빅토리아 기념관)으로 가기로 하고 Sudder St,에서 걸어서 20여분 가니 넓은 정원이 나온다. Victoria Garden이다.
예전 여의도 광장보다도 더 넓은 광장에 잔디가 깔려 있고 초중고 학생들이 제식훈련, 크리켓 운동 등을 하고 있다. 여기저기 양떼들이 풀을 뜯기도 했다. 나는 공원을 거닐다가 말문을 열었다. 혼자 여행하고 싶다고 했다.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도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눈치다. 그의 태도에도 분명한 데가 있다. 우리는 몇 마디 대화를 주고 받고 약간 아쉬움을 느끼며 혜어졌다.
그 동안 수고비로 100루피를 주겠다 하니 200루피를 달란다. 안된다. 나는 예산이 짜여져 있다며 거절하고 100루피만 주었다. 100루피면 하루 숙박비 아닌가. 그는 다시 기분이 좋으냐 안좋으냐 확인까지 하고 자가 사진은 꼭 붙여달라며 주소가 적힌 명함을 주었다. 그리고 바라나시에 가면 자기 아버지가 하는 Guest House로 가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서운했는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던길을 되돌아 갔다.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디지털 카메라로 그의 뒷모습을 담기도 했다.
이렇게 홀가분 한 걸. 여행은 역시 혼자 하는 것이 묘미가 아닐까. 빅토리아 메모리얼에 도착하니 앞 뒤 그리고 양 옆으로 큰 정원이 있고 넙은 호수도 펼쳐져 있다. 앞 쪽은 한창 보수공사가 진행중이어서 뒤문으로 출입해야 했다. 건물의 내부엔 영국의 전성기인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회화작품이 주로 전시되어 있었다. 많은 지도자들의 대형 초상화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간디의 초상화가 없었다.
영국이 세운 기념관이라서 영국에 저항했던 마하트만 간디의 초상화는 없는 것이라고 내 나름의 해석을 해본다. 입장료가 또 150루피였다. 인도인은 10루피이다. 구경을 마치고 5분 거리에 있는 St. Paul Cathedral로 갔다. 두 번이나 파괴되어 원형은 볼 수없다는데 너무 쓸쓸하기만 하다. 오후 3시에나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부는 들어가 보지 못했다.
관광안내서엔 서쪽면의 색유리가 볼만 하다고 했는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정교한 색유리(stained glass)는 없고 회갈색의 평범한 유리로만 둘러싸여 실망스러웠다.뒷마당에서 한 여인이 몇 가지 성물을 놓고 팔고 있을 뿐이었다. 성당을 나와서 조금 걸으니 Rabindra Sadan이 있고 그 옆에 Academy of Fine Art가 있는데 마침 전 인도 미술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입장료가 5루피였다. 많은 인도의 현대미술작품을 관람했으나 미술에 문외한이어서 제대로 감상할 수는 없었다. 미술관을 나와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25루피짜리 egg fried rice(달걀과 볶은 쌀밥)를 시켰는데 의외로 양이 많아서 포만감을 느낄 정도였다. 식당에서 마주 앉은 젊은이에게 Zoological Garden(동물원)을 물으니 maximum two and half km(최장 2.5km)란다. 다리가 아픈 걸 무릅쓰고 부지런히 걸으니 한참 후에 간판이 보인다.
입구가 엄청 붐빈다. 인도인들의 가족나들이 단골 코스임을 직감한다. 5루피를 내고 들어가니 깔끔한 구석이라곤 없다. 찢기고 뜯겨 페허처럼 방치된 시설들이 수두룩하고 쓰레기와 먼지로 뒤덮인 길, 낡을대로 낡은 동물우리가 지은 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대부분의 건물이 그렇듯이 캘커타가 식민지 인도의 수도이었을 때 영국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닐까 짐작을 해본다.
곰, 사자, 호랑이, 낙타, 하마, 사슴 등 여러 가지 동물이 있지만 과천 동물원에 비하면 유치할 정도의 시설이다. 그러나 백호 몇 마리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어서 사진기에 열심히 담았다. 동물원의 후문을 나와 걷다가 노점에서 짜이 한 잔을 시켰더니1.5루피란다. 짜이 값은 장소와 상인에 따라서 1.5푸피, 2루피, 3루피, 4루피, 5루피 등 다 다르다. Indian Museum이 있는 Park Street로 가는 버스를 물으니 77A번을 타란다.
인도 박물관 앞에서 하차하여 호텔이 있는 Free School Street에 있는 Hotel Al-Gaus를 찾는데 그 길 앞으로 여러 번 다녔으면서도 찾지 못하고 헛걸음만 치다가 결국 한 호텔에 들어가 물었더니 한 노인이 앞장 서서 친절하게 알려 준다. 그에게 또 5루피를 주었다.
인도의 길거리엔 가끔 사탕수수의 즙을 내서 파는 사람들이 있다. 사탕수수대를 몇 번이나 압축기로 짜서 즙을 내서 한 컵에 4루피 혹은 5루피를 받는데 자연그대로의 음료수여서 여러 번 사먹었다. 옛날 시골 고향에서 먹던 사탕수수맛을 인도에서 맛보니 별미였다. 동물원에서 환타 비슷한 음료를 15루피에 사서 마시고 호텔 근처에서 콜라 한 병을 18루피에 사서 마셨다. 인도의 물가는 여행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다.
인도는 타고르와 간디의 나라가 아닌가. 인도의 모든 화폐엔 마하트마 간디의 초상화가 인쇄되어 있다. 동물원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오다가 파크 스트리트에서 내렸는데 근처에 간디의 동상이 우뚝 서 있었다. 십대 적에 나는 간디의 자서전을 읽으며 그의 무저항주의에 깊이 공감한 적이 있었다. 서점에 들렀더니 타고르가 저술한 서적이 십수 종이 있었다.
길거리에 차린 노점 서점에서도 타고르의 서적은 쉽게 만날 수 있다. 인도가 낳은 세계적 시인, 타고르는 캘커타 출신이다. 간디와 타고르가 인도 국민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길거리의 풍경에서도 감지할 수 있었다. 십대 적에 나는 타고르에게 매료된 적이 있었다. 단지 동양 최초의 노벨상 수상시인이라는 것과 수염이 덥수룩한 그의 모습, 그리고 단편적으로 읽은 그의 작품과 그의 사상을 접하며 나는 그에게 빨려들었었다. 그리고 타고르와 같은 시인이 되고 싶었다. 나는 그때 읽은 타고르의 시 ‘동방의 등불’과 시집 ‘기탄잘리‘ 중의 한 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동방의 등불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The Lamp of the East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 - 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Where the mind is without fear and the head is held high ;
Where knowledge is free ;
Where the world has not been broken up into fragments by narrow domestic walls ;
Where words come out from the depth of truth ;
Where tireless striving stretches its arms towards perfection ;
Where the clear stream of reason has not lost its way into the dreary desert sand of dead habit ;
Where the mind is led forward by thee into ever-widening thought and action --
Into that heaven of freedom, my Father, let my country awake.
19297년 일본을 방문했던 타고르에게 동아일보 기자가 한국방문을 요청했을 때 방문하지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하여 이 시를 썼다고 하는 데 1929년 4월 2일자 동아일보에 실렸다. 위 시는 당시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자긍심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위 시 말고도 ‘끝없는 세계의 바닷가에 아이들이 모여든다‘ 라는 시는 시집 ’기탄잘리‘의 60번 째 시로 내가 10대 적에 애송했었는데 그 평화의 이미지와 함께 아직도 생생하다.
끝없는 세계의 바닷가에 아이들이 모여든다.
무한한 하늘은 머리 위에서 꼼짝도 않고 쉴 줄 모르는 물결은 시끄럽다.
끝없는 세계의 바닷가에 아이들이 소리치며 모여든다.
그들은 모래로 집을 짓고 빈 조개를 가지고 논다.
가랑잎으로 그들은 배를 엮고 방긋 웃으며 허허망망한 바다에 띄운다.
아이들이 세계의 바닷가에 놀고 있다.
그들은 헤엄 칠 줄을 모른다.
그들은 그물을 던질 줄 모른다.
진주 캐는 이는 진주를 캐러 물속데 뛰어들고
상인들은 그들의 배를 타고 항해하나
아이들은 조약돌을모아서는 또 다시 흩뜨린다.
그들은 숨은 보물을 안 찾는다.
그들은 그물을 던질 줄 모른다.
바다는 웃으며 일렁이고 그리고 창백하게 바다 기슭의 미소는 반짝인다.
죽음을 거래하는 물결은 아이들에게 의미없는 노래를 들려준다
마치 애기의 요람을 흔들 때의 어머니 처럼
바다는 아이들과 더불어 논다.
그리고 창백하게 바다기슭의 미소는 반짝인다.
끝없는 세계의 바닷가에 아이들이 모여든다.
폭풍우는 길 없는 하늘을 헤매고
배는 길없는 바다에 난파하여 죽음이 넘치는데 아이들은 장난한다
끝없는 세계의 바닷가에 아이들의 큰 모임이 있다.
-‘기탄잘리’의 6번 째 시-
On the seashore
On the seashore of endless worlds children meet.
The infinite sky is motionless overhead and the restless water is boisterous.
On the seashore of endless worlds children meet with shouts and dances.
They build their houses with sand, and play with empty shells.
With withered leaves they weave their boats and smilinglyfloat them on the vast deep.
Children have their play on the seashore of worlds.
They know not how to swim, they know not how to cast nets.
Pearlfishers dive for pearls, merchants sail in their ships, while children gather pebbles and scatter them again.
They seek not for hidden treasures, they know not how to cast nets.
The sea surge up with laughter, and pale gleams the smile of the seabeach.
Deathdealing waves sing meaningless ballads to the children, even like a mother while rocking her baby´s cradle.
The sea plays with children, and pale gleams the smile of the seabeach.
On the seashore of endless worlds children meet.
Tempest roams in the pathless sky, ships are wrecked in the trackless waters, death is aboard and children play.
On the seashore of endless worlds in the great meeting of children.
노점에서 나는 타고르의 시집 ‘Stray Birds, Lover`s Gift and Crossing`을 샀다. 100루피를 달라는 걸 50 루피에 사고 뒷 표지를 보니 정가가 60루피가 아닌가. 잠시 싸게 샀다고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다. 책의 내용에 비하면 아까울 게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루를 보내고 조용히 캘커타의 인상을 적어본다. 까마귀의 도시, 차선이 있으나 마나한 도시, 소음과 먼지의 도시,길거리에 마구 똥을 싸는 아이들,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캘커타의 견공들은 한결같이 얼굴이 닮았다. 사람보다 차가 우선인 도시, 다양한 것이 뭉뚱그려져 있는 도시가 캘커타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