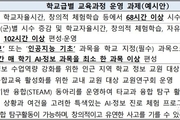산은 깊은 곳에 앉아 있어서 하늘처럼 깨끗하다. 암벽은 모두 말라 있어도 틈에서는 여지없이 물을 생산한다. 계곡에 앉아 있는 암반은 흐르는 물길과 잠시나마 인연을 함께 하려고 몸 전체로 어루만진다. 하지만 물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야속하게 이별의 소리를 내며 달아난다. 미지의 세계로 달리듯 한층 더 생기 있게 흐른다.
아름다운 곳에 가면 옛 선조의 일화가 남겨 있듯, 이곳에서도 우암 송시열 선생의 역사와 만난다. 우암 선생이 효종의 죽음을 애달파 하며 새벽마다 엎드려 통곡하였다는 읍궁암은 여전히 묘한 울림이 있다. 그때의 슬픔이라도 전하는 듯 반들거리는 몸으로 햇살을 튕겨 낸다. 수정처럼 맑은 물에 모래 또한 금싸라기 같아 금사담이라 했다는 풍경은 흔한 말로 한 폭의 그림이다. 우암이 머물렀다는 암서재의 풍경은 화양계곡에서도 백미(白眉)라 할만하다. 금방이라도 우암 선생이 앉아서 책장을 넘길 듯하다.

동행하는 후배는 자연이 베푸는 풍경에 숨이 막힌다면서 갑자기 말이 많아진다. 후배가 뜬금없이 옛날 사대부의 사치를 못마땅해 한다. 깊은 산속에 자연을 훼손하고 집을 지었다는 이유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우월을 통해 자연을 소유하겠다는 오만을 부렸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곳에 집을 지으면서 아랫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을 것이라고 제법 구체적으로 회고를 한다.
순간 나는 우리의 진부한 삶이 끝없는 순환에 벗어나지 못함을 느낀다. 그것은 빈약한 관념으로 타인의 삶에 비난의 침을 꽂는 못된 버릇이다. 우리는 그때의 시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우리는 그 시간에 관하여 주절거릴 특권이 없다. 직접 보지 못했던 과거의 삶을 예단하려는 것은 또 다른 의식의 폭력이 아닐까.
물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욕망을 이루지 못하면 금방 세상이 무너질 듯 다가온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면 마음을 포근히 하는 봄을 기다리는 것도 인간뿐이다. 부질없는 탐욕이나 공허한 욕망을 버리고 봄을 기다리는 소박함도 선비들의 삶의 일부였을 것이다. 그들이라고 이러한 소망이 없었겠는가. 온갖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고요한 계절의 울림을 타고 흐르는 나직한 음률에 가슴을 적시고 싶은 삶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이곳에 머묾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상의 안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바위 절벽 위로 우뚝 선 누각은 풍광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속세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절제와 단아한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의 표현이다.
선비는 벼슬을 하면서 대의에 맞지 않으면 스스로 물러났다. 물러난 것이 아니라, 낙향을 했다. 낙향은 현실에 대한 또 다른 대응 방식이다. 당파성에 매몰되어 허약한 논리로 자신을 치장하던 생활을 돌아본다. 정의와 신념의 파도와 싸웠지만, 밀려온 현실의 힘에 무너져 버렸다. 소통하겠다고 말하지만 야만적으로 변하는 언어의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못 찾는다. 이제 현실의 치열함을 벗어나고, 삶의 욕망도 잠재운다. 그리고 한적함 속에서 자연을 벗 삼아 정신을 다듬는다. 그들은 현란한 말보다 침묵하는 내면의 풍경을 들여다보면서 삶의 충만함을 느낀다. 우암이 굳이 물 건너편에 누각을 지은 것도 자연과 교감을 하는 은둔의 길을 가기 위함이다.
선비들이 정자를 지은 것도 자연의 훼손이 아니다. 정자는 치장도 없이 열려 있다. 열림은 풍광을 오롯이 담기 위한 장치다. 열려 있기에 물소리가 들리고 계곡의 풍치가 몰려온다. 열려 있다는 것은 자연과의 소통을 의미한다. 열고서 자연을 채우고, 채우기 위해서 비워내는 정신의 과정이 시작된다. 그들은 비움으로써 정신의 충만을 즐긴다. 열려 있는 누각에서 세상을 향해 여전히 치열한 내공을 다지고 있다. 아울러 치장이 없는 것은 절제와 검약의 삶과 통한다. 그것은 선비의 삶이고, 정신이다. 따라서 선비들은 정자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울창한 숲과 정신적 은유를 즐기기 위한 자리이다. 선비는 정자에서 정신의 가치를 맑게 했다. 그래서 정자는 별천지가 된다.
세상사는 욕망과 쾌락이 있어 좋기도 하지만, 우리를 해롭게 하는 나쁜 소식도 많다. 자연이 생성․소멸하는 생존의 의미는 아름다움이 있고, 삶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자연이 보여주는 정직하고도 확연한 진리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깊은 진리의 함축성을 느끼게 된다.
현대인은 뒤늦게 속도와 시간에서 벗어나겠다면 또 다시 아등바등 살아간다. 우리는 모두 물질의 풍요를 채우면서 오히려 마음의 괴로움에 빠져 있다. 이곳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때로는 지극히 맑고 고독한 평화가 풍요롭다는 인식이다. 산속에서 한가로움을 즐기다보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 불환삼공지락(不換三公之樂)이란 옛말이 그대로다. 푸른 나무, 푸른 산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달빛 속에서도 의연하게 솟아올라 있는 봉우리들을 본다. 그 모두가 단단한 침묵으로 나에게 묻는다. 어느덧 나도 산중에 있는 이름 없는 봉우리가 되어 말을 건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