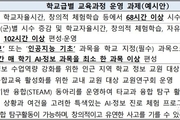까치집은 나뭇가지가 곧게 뻗다가 옆으로 슬쩍 비켜간 골에 터를 잡았다. 꽁지가 유독 길어 보이는 까치는 필시 암놈일 것이다. 단아하게 빗어 넘긴 머릿결에 흑색이 유난히 반짝인다.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를 날렵하게 옮겨 다니는 자태에 맑고 정숙함이 배인 몸짓이 수놈의 기질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수놈은 입에 물고 오는 삭정이 크기로 알 수 있다. 한 집안의 가장처럼 제법 큰 나뭇가지를 물어온다. 부부 까치가 집을 짓는 데서 볼록한 가슴을 내밀고 지절대는 저 까치는 이 집의 맏딸인 것 같다. 배의 털이 새하얗고 수다스럽게 따짝거리는 것을 보면 혼기가 꽉 찬 딸임이 틀림없다.
까치집은 짓는다는 작위적 의미보다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그것은 애초에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까치가 지은 집은 엉성한 듯해도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는다. 나무의 일부인양 초연히 솟아 있다.
까치는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지상에 흩어져 있는 삭정이를 본다. 그 높은 곳에서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필요한 것만 고른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먼 곳에서 사물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능력이 놀랍다. 까치둥지는 어느 것을 보아도 크기가 같다. 어떻게 모양도 크기도 같은지 감탄이 절로 나온다. 저마다 집을 키우느라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뿐이다.
흔히 까치는 길조(吉鳥)라는 속신(俗信)이 있다. 까치가 와서 울어주면 반가운 소식이 든다고 믿었다. 해서 예부터 사람들은 까치를 집 가까이 불러들이는 지혜를 발휘했다. 들녘 추수를 끝내고 앞마당의 감을 따면서, 예닐곱 개씩 남겨둔다. 그것이 까치밥이다.
인간은 수구초심의 본능이 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잠자리가 추워지면 떠돌이 장꾼들도 하나 둘 고향의 산하로 흘러들어가게 마련이다. 이러한 귀소 본능과 가을 추수를 끝내고 막연하게 무엇인가 기다리는 우리네 마음을 담아 놓은 것이 까치밥이다. 그러면 까치가 날아와서 가을 볕살에 더욱 붉어진 감을 쪼아 먹고는 답례로 울어준다. 이제 노부부는 동구 밖을 보면서 서성이고, 며느리는 남편이 돌아와 입을 옥양목에 풀을 빳빳하게 먹이느라 바빠진다.
어린 날 엄마에게 듣던 까치 이야기는 의조(義鳥)였다. 과거를 보기 위해 길을 재촉하던 선비가 구렁이에게 잡혀 먹히려는 까치를 보았다. 선비는 활을 쏘아 구렁이를 구해 주었다. 이번에는 산속에서 선비가 죽을 위기에 있었다. 죽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여인네로 변신한 구렁이를 만난 것이다. 이때 어디선가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따앙, 따앙, 따앙’하는 맑은 종소리가 달빛에 실려 왔다. 그러자 구렁이는 하늘로 올라가고 선비는 목숨을 건졌다. 선비가 아침에 절을 찾았을 때, 종 밑에는 까치 세 마리가 온 몸에 피를 묻힌 채 죽어 있었다.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까치가 죽음으로써 보은(報恩)을 했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영리적인 삶을 꾸짖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많은 동물 중에서 유독 까치가 소재가 된 것은 인간에게 신뢰감을 주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영물로써의 느낌이 전해 왔기 때문이다. 까치는 우리 전통 그림에도 새해 복을 비는 새다. 까치에 얽힌 말도 많다. 두 발을 모아 뛰는 종종걸음은 까치걸음이요, 까치설은 설 바로 전날을 이른다.
이런 까치를 나는 정조(凈鳥)라고 하고 싶다. 까치가 맑게 울어대면 먼지가 쌓인 내 폐부에 시원스럽게 쏟아져 내린다. 현대인이 앓는 병이 세포 병리설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이 많다고 한다. 도시에 사는 나도 예외가 아니다. 까닭 없이 뒷짐을 지고 창밖을 기웃거리는 때가 많다. 이렇게 고적한 배회를 할 때 내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가 까치 울음소리다. 메마른 마음의 한 끝을 촉촉이 적셔주는 까치 소리….
그런데 요즈음 그놈의 울음에 여인의 애틋한 흐느낌이 묻어 있다. 잃어버린 터전에 대한 마음의 앙금을 삭이지 못하고 울어대는 소리인지 내 가슴을 아리게 훑어 내린다.
최근 사람들의 삶이 변하면서 까치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해서 다급한 처지에 있던 까치들이 높은 전신주에라도 매달려 살림을 꾸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전 사고방지를 위해 관계 회사에서 까치집을 허물어 버리고 있다고 한다.
언제부터 우리의 사는 모습이 이렇게 이악스럽게 변했단 말인가. 까치밥을 남겨주던 우리네 정은 어디 갔는가. 까치는 본래 사람들이 사는 집 가까이에 둥지를 튼다. 손길을 뻗어서 까치들에게도 살가운 정이 닿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비록 어린아이 치마폭만한 앞마당일지라도 집집마다 감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 놓으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