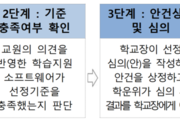요즘 사춘기 아이들과 소통하기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에서 "아이들은 왜수업을 듣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선생님들로부터도 많이 듣는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대하기가 쉽지 않다는게 직접 필자가 수업을 하면서 몸으로 느끼고 있다. 무엇에 그리 쏠려있는지 부모간에도 오붓이 마주 앉아 정을 나울 시간도 없고 어쩌다 시간이 되어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 서지만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바로 글쓰기이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지만 인문학적으로는 여러 번 태어나고 죽는다. 몸의 세포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앎과 믿음, 감각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까지 나를 사로잡았던 생각이 시시해지고,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산 세상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학교 수업을 톻하여 이뤄낼 수는 없는 것일까?
교육은 소통이다. 삶이 힘든 것은 소통이 안되기 때문이다. 삶에서 소통의 문제는 내가 접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어내어 학생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편지라는 그릇에 담아 글을 쓸 것인가이다. 내가 일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아이들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여 아이들의 마음을 감지하는 일이다. 그래서 수업을 강의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마지막 10분 정도는 학습한 내용, 느낌을 한 번 되새김하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수업 성찰의 글쓰기이다.
수업성찰의 글을 쓰는 학생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 가르친 사람이 이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수업을 듣는 학생의 자세와 글쓰기가 상당히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수업을 열심히 메모하면서 들은 학생은 쓴 내용도 풍부하다. 아는 만큼 보인 것처럼 아는 만큼 쓸 수 있다. 어떤 학생은 전혀 알맹이가 없는 내용을 적는다. 잘 듣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니 쓸게 없을 것이 뻔하다. 이런 학생의 경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해주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일차적으로 학습의 시작은 정보의 전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집중하여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와 메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한편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것을 모두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많다. 아이들은 듣는 척한다. 하지만 대부분 소화 불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칠판에 판서를 하고도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는 학생도 있다는 사실을 잊고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학생들의 글은 '여러 가지를 배웠다. 다른 것을 느꼈다'는 표현 등 구체성이 많이 떨어져 잘 이해하기 어렵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어 사용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사실을 연결지어 설명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로 '빗대어서 설명하여 주셨다'라는 표현 등이다. 아마도 잘 모르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전을 찾거나 확인하고 쓰는 습관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스마트 폰에 심취하고 학교학습에서도 '바르게 쓰고 생각하는 학습'보다는 활동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생각의 시간을 제대로 갖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인간이 생각하여 글을 쓰는 것은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것과 같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꿀벌은 밀랍으로 자기 세계를 짓지만 인간을 글로서 자기 삶을 만들고 세계를 짓는다. 우리의 깨우침과 배움이 거기에서 시작하고 거기에서 나타난다. 인간의 삶은 평생 말하고 글을 써야 하는 시대이다. 생각의 틀이 굳어지기 전인 중요한 중학교 시절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아이들이 조금은 힘들지라도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하여 노력하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