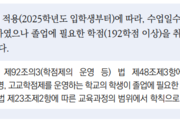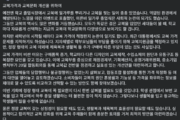덕담(德談)의 계절이 되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사람들은 덕담을 나눈다. 올 한 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덕담’에 담아서 서로 전하기 때문이다. 원래 덕담은 설날 세배 풍속으로, 세배 자리에서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새해의 기원(祈願)으로 주시던 좋은 말씀을 일컫는다. 그러고 보면 세뱃돈이라는 것도 세배 덕담이 변해서 그리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요즘은 선의(善意)의 기원이 담긴 말들을 그냥 ‘덕담’의 범주에 넣는다. 심지어는 ‘악담(惡談)’의 반대 개념 정도로도 쓰이는 말이 되기도 했다.
얼핏 들으면 악담인데 듣고 보면 덕담의 효과를 내는 말 중에 “그 놈, 제 애비보다 낫다”라는 것이 있다. 겉으로 들으면 ‘나 못 났다’는 지적인데, 돌려서 생각하면 ‘내 자식 잘 났다’는 칭찬으로 들리기 때문이란다. 부모 된 자의 자식 사랑 본능을 잘 반영하는 경우라 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덕담 내용이 확고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덕담의 시제를 미래형으로 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말하기도 한다. “너 공부 열심히 했으니 네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말하는 방식이 바로 그렇다. 말하는 이의 확신감이 느껴져 좋고, 상대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구나’하는 느낌을 가지게 해 주어서 좋다.
덕담의 가장 큰 적(敵)은 상투성이다. ‘에이, 누구나 흔히 하는 소리잖아!’ 이런 느낌을 주는 덕담이 바로 상투적 덕담이다. 정성이 담기지 않으니 ‘덕의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한다. 덕이 없는 덕담은 덕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쪽의 무관심만 상대에게 확인시켜 준 격이어서,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있다.
1980년대 초반쯤이었던가. 한국교육개발원에 근무하던 필자는 충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식에 내빈으로 참석한 적이 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어려운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일반 고등학교에 부설한 학교이다.
일요일에 출석하여 수업 받고, 매일 교육방송으로 강의를 청취하며,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그런 연유로 한국교육개발원을 대표하여 그 졸업식에 간 셈이었다.
졸업생은 40명 정도 되었다. 졸업장 수여 순서가 되자, 교장 선생님이 단상 앞으로 나오셨다. 그분은 뒷날 충북도교육감을 하시고, 국립교육평가원 원장을 지내셨던 유성종 선생님이다. 교장선생님은 졸업생을 하나하나 단상으로 오르게 했다. 흔히들 졸업식이라면 졸업생 대표 1명을 단상으로 불러, 졸업생 대표 아무개 외 몇 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비하면, 자못 진지했다.
아무튼 그렇게 불러 낸 졸업생 하나하나에게 유성종 교장은 졸업장을 건네면서, 무어라고 개별 안부 묻듯이 말씀을 건네준다. 졸업생마다 각기 다른 말씀을 주는데, 단상 뒷자리에 앉아서 들어보니 재미있다. 아니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그게 어렴풋 감동으로 느껴진다.
“지난 가을 송아지 낳은 것은 잘 자라느냐, 돈 되게 잘 키워라.”
“부모님 병환 돌보면서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자네 효성이 자식들 복으로 갈 거다.”
“시댁 어른들이 좋아하겠다. 공부 한을 풀었으니 남편 사업도 이제 잘 풀릴 거여.”
“자네 이 공부, 중간에 그만둔다 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졸업하니 참 장하네. 장해!”
“지난여름 태풍 때 자네 농장 비닐하우스 망가진 것, 복구 좀 했는가. 기죽지 말게.”
덕기(德氣)가 넘치는 덕담임을 느낄 수 있었다. 말씀을 받는, 어른 졸업생들도 더러는 눈시울이 붉어진다. 필자는 그날 교장 선생님이 보여 준 살아 있는 덕담의 장면들을 잊지 못한다. ‘나도 언젠가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로 돌아가면 저런 선생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온갖 어려움을 딛고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어른 학생’들에게 교장은 진정한 ‘덕담’을 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 덕담의 장면을 지켜보는 나에게도 그것은 얼마나 덕스러운 감화가 되었는지!
도대체 교장선생님은 이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일상적 삶과 형편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게 어디 표피적 말기술 따위로 감당이나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상대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아무도 모르게 안으로 분비되는 과정 없이는, 덕담은 출현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덕담을 하는 사람은 덕담인 줄 모르고 덕담을 한다. 이런 경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를 ‘덕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덕담이 점차 사라져 간다. 덕담을 너무 의식하면 오히려 덕담에서 멀어진다.
덕담의 자격을 가지려면 상대에게 어떤 감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힘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상대를 간곡하게 배려하는 덕(德)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형식이 반듯해야 한다. 이를테면 일종의 예(禮)가 실려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진실함과 진정성이 녹아 있는 말이라면, 감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덕담은 유창한 말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예(禮)와 덕(德)이 극단적으로 훼손되어 민망하기 그지없는 덕담 상황을 경조사(慶弔事) 장면에서 더러 본다. 상가(喪家)에 문상을 온 사람들이 무심코 접수시킨 부조금 봉투의 겉면이 간혹 ‘축의(祝儀)’라고 씌어진 것들이 있단다. 유족에게 멱살잡이 당하기 딱 좋다. 반대의 경우도 민망의 극치를 겪기는 마찬가지이다. 결혼 축의금을 내어야 하는 상황에서 무심코 ‘부의(賻儀)’라 쓰인 조문용 봉투로 부조금을 내어 놓는 경우, 받는 쪽에서는 순간적으로 기가 막힌다. 고맙기는커녕 상대의 극단적 무신경에 내 존재 자체가 무시당한 듯한 서운함을 느낀다. 설사 그 봉투에 부조금을 두툼하게 넣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내 것 주고 뺨 맞는다는 속담이 여실하게 들어맞는 상황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당사자는 ‘단순한 실수’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본의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발적 사고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영어식 표현으로 이런 걸 ‘해프닝(happening)’이라고 한다. ‘해프닝’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일 아니라 변명하고 사태를 수습하려 애를 쓸 것이다. ‘해프닝’이란 의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찌어찌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우발적으로 일어난, 한갓 우스개와도 같은 실수란 뜻이 들어 있는 말이다. 물론 남의 흉사/경사를 일부러 조롱하듯 하려는 것이라고까지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축하하고 위로하는 일이란 그 본질이 덕스러움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경조사에 부조금 봉투 내는 일도 일종의 덕담 나누기이다. 경조사에서의 인사가 그냥 봉투 하나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한 감정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애써 외면했기 때문에 해프닝이 생긴 것이다.
부조금 겉봉투에 못쓰는 글씨로라도 직접 축하와 위로의 글자들을 써 넣고, 깔끔한 속종이 한 장 마련하여, 상대를 향한 내 진정한 마음을 두어 줄 글귀에나마 정성들여 쓰고, 그걸로 다시 부조금 정성스레 싸서 내어놓는 과정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도 덕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다. 미리 인쇄해 놓은 표준형 부조금 봉투에 알돈 불쑥 집어넣고서는, 밀린 곗돈 내듯 내고서는, 서둘러 끼니 한 그릇 때우고 오는 과정 속에는 아무리 보아도 덕(德)이 없다. 축하든 위로든, 내 마음의 언어를 내 스스로 지어내는 정도의 수고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덕담이 된다. 그런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은 천국도 담고 지옥도 담는다고 했던가. 인간은 신처럼 고상한 경지에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짐승의 수준으로 비루해질 수도 있다. 인간의 말이 꼭 그러하다. 덕담은 천국의 언어이고, 악담은 지옥의 언어이다. 말은 덕과 나란히 같이 가기도 하지만, 말이 덕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
덕담이 존중되는 사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인격으로 맺어지는 사회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인격 아닌 것’들로 매개될 때, 덕담은 사라진다. 인격(人格)이 물격(物格)처럼 다루어지는 사회에서는 덕담이 사라진다.
이보다 더 고약한 것은 덕담에서 덕이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돈으로 맺어진다든지, 부당한 권력으로 맺어진다든지 하면, 덕담에서 덕이 빠져 나간다. 이때 남는 것은 ‘가짜 덕담’이다. 겉만 덕담의 형식을 취하고 안으로는 속 좁은 이익이나 챙기는 것이다. 이런 세태에서는 가짜 덕담이 판을 친다. 덕담이랍시고 하는 것이 닭살 돋는 아부로 변질된다. 속임수를 가리기 위해 짐짓 덕담인 척 위장을 한다. 이런 것들이 무슨 괜찮은 처세술인 양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세태이다.
그러고 보면 세배 자리에 오로지 ‘덕담’만이 오가던 시절이 더 온전한 인격의 시대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덕담만이 있던 자리에, 덕담 대신 세뱃돈이 끼어들면서, 덕담은 뒷전이고, 세뱃돈에만 눈과 귀가 밝아지는 모양새가 되지는 않았는지. 설날 아침 세배 자리 풍경도 변해만 간다. 세배 자리 집안 어른들의 덕담을 마음에 두고 헤아려 보는 대신에, 집안 형제들끼리 서로 경쟁하듯 세뱃돈 헤아리는 데에 여념 없는 아이들을 보며, 이래저래 변질되어 남루해진 덕담의 운명을 아쉬워한다.
‘덕담(德談)’은 설날 세배 풍속으로, 세배 자리에서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새해의 기원(祈願)으로 주시던 좋은 말씀을 일컫는다. 덕담이 자격을 가지려면 상대에게 어떤 감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힘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덕담은 유창한 말기술이 아닌, 상대를 간곡하게 배려하는 덕(德)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형식이 반듯해야 한다. 이를테면 일종의 예(禮)가 실려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진실함과 진정성이 녹아 있는 말이라면, 감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박인기 경인교대 교수ⓒ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