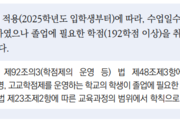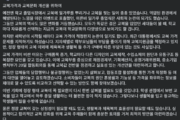1. 가족끼리 진짜 친해지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을 사는 것 같다. 그러기는커녕 불화와 갈등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이 가족인지도 모르겠다. 헐벗고 못살 때는 이런 걱정은 오히려 덜했다. 부자유친(父子有親)은 신화나 전설처럼 아득한 화석으로 남는 것일까. 자녀사랑이니 효도니 하는 것들에서도 왠지 이기적 술수들이 숨어서 넘실대는 느낌도 든다. 부모는 자애하고 자식은 효도하라는 것 사이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멀고 무관하다. 세태를 탓하기는 쉬워도 막상 진지하게 깨달아 실천하기는 날로 더 어려워 간다.
어린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과 어버이를 받들고 감사하는 일이 서로 힘을 보태고 정을 더욱 도탑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사이에는 어떤 필연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자. 자녀들 사랑하기는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마침내 어버이를 다시금 느끼고 생각하는 데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버이 받들기 또한 부모님들을 하루 호강시켜 드리는 이벤트로 끝나서는 모자란다. 어버이 공경하는 일로 인하여 마침내 부모가 자녀들을 다시금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데에 이르게 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녀 사랑이든 효도이든 베풀거나 섬기는 쪽에서 상대를 향해 그저 일방적으로 처리해 내는 행사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자녀사랑과 효도는 일방적이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서, 우리는 자녀를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심리적 결핍을 메우는데 억지로 끌어다 넣은 적이 너무도 많다. 부모 세대가 겪은 가난이 문화적 상흔(Trauma)로 작용하는 것일까. “아이구! 이것아, 엄마 시키는 대로만 해, 네 장래는 엄마가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아무소리 말고 따라와.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온갖 학원과 과외 공부로 아이들을 끌어간다. 이런 식의 ‘자녀 챙기기 모드’를 요즘 부모 세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이가 느끼는 억압과 부자유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아이가 해 보고 싶은 것에 대한 몰이해는 부모의 고유한 권한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부모 노릇, 자식 노릇, 그리고 돈 노릇 돈이 없으면 자녀를 사랑할 수 없는가. 돈이 없으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불가능한 것인가. 돈이 없으면 효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 주려는 노력을 왜 교육적 사회적 의제로 고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가. 돈이 없으면서도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효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도 많다. 우리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도 이제는 물질적 소비주의를 넘어서서 그런 정신적 사회적 지향을 가져야 한다.
박인기 경인교대 교수ⓒ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