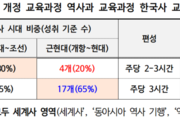탁 트인 바다가 있고 자연이 좋아 영종도에 산다는 조지욱 교사는 어렸을 때부터 ‘지도 찾기’와 ‘지리부도’ 보는 것을 즐겼다. 대학을 지리과로 진학해 교직이수 후 지리교사가 됐지만, 솔직히 학창시절부터 지리나 교직을 꿈꿔왔던 것은 아니었다고 회상한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동기들이 ‘나는 이런 교사가 될 거야’라고 말할 때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워낙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다 보니 교직이수보다는 답사를 좋아했고, 지도를 보며 여행 떠나는 것을 좋아했어요.”
유목민 기질이 다분한 그에게 정적이고 반복적이며 꼼꼼한 성격을 요구하는 직업인 교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자기 자신도 챙기기 힘든데 학생들을 이끌 자신도 부족했다. 그런데 막상 교생실습을 시작하니 기존의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 생활이 어떻게 정적일 수가 있겠어요. 5분 후가 예측 불가능한 게 이 시기의 학생들인데요. 게다가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동적인 직업이더군요.” 그는 처음 교사가 됐을 때만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5년은 참아보며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알아보자’는 마음가짐으로 교직에 섰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제는 교사가 천직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그래도 제가 선택한 직업인데 후회 없는 교직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짐한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실력 있는 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인문계 교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둘째는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셋째는 촌지 받지 않는 것, 마지막은 인간다운 교사가 되는 것이었죠. 학생들에게 매우 완벽한 모습만 보이기보다는 선생님도 빈틈이 많고,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걸,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다짐으로 처음 교단에 선 학교는 부천의 정명고등학교였다. 그 당시 부천은 비 평준화 지역이었고, 이 학교는 그 지역 꼴찌학교였다. 고3 학생 수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업해도 ‘잘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쳐다만 보는 학생들 앞에 좌절하기도 했다. 그때 한 결심이 ‘고등학교 인문계 평균치까지 올려보자’였다. 국·영·수는 안 돼도 지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지리를 흥미롭게 느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따로 있더군요. 환경관련 수업은 토론이 적합해요. 기후나 지형 같은 경우는 보여주면서 수업할 수 있는 동영상을 활용하면 이해가 빠르고요.
경제나 세계학은 직접 1:1 문답법으로 교과서 내용을 계속 묻고 답하며 수업을 이어나가죠.” 조 교사는 어떤 학문이든 잘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호기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토론과 문답법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학생들의 성적도 향상됐다. 조 교사의 목표였던 지리과목 인문계 평균치에 도달한 것이다. 이는 교사가 노력하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
열린 마음으로 학생을 대하게 해준 여행
자연과 여행이 좋아 다니다 보니 어느새 지리교사가 돼 있었다는 그는 교사가 된 뒤에도 여전히 여행을 즐긴다. 그래서 지금도 방학이면 가방 하나를 메고 국내로,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다고 한다. 베이징의 한 과일가게에서 ‘바가지’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베이징 호텔 앞에 있는 과일가게에서 체리가 맛있어 보여서 산 적이 있어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1만 4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체리는 귀한 과일이라 생각하고 그 가격에 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정도 양이면 2000원이면 충분히 사더라고요. 그래서 속았다고 억울해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군요. 중국 사람들은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장사수완이 좋아서 큰 이익을 남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단한 장사꾼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 같아요.”

단지 취미생활이었던 여행은 신기하게도 교직생활에도 도움이 됐다. 여행을 통해 넓어진 시야 덕인지 조 교사의 수업방식도 남달랐다. 그는 절대로 학생들이 교과서에 쓰인 대로 말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저는 학생들이 제 질문에 대답하면 무조건 점수를 줘요. 특히 정답이 아닌데도 논리가 탄탄하면 점수를 두 배로 주죠. 모든 학문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유효한 것’으로 생각해요. 500년 전까지만 해도 천동설이 정답이었지만 지금은 지동설이 정답이잖아요. 정설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확고한 정의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뒤에 학생의 대답이 정답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더 후한 점수를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방방곡곡에서 얻은 그의 경험들은 지식이 되어 수업에 활용된다. 여행을 다니며 본 것을 토대로 세부적인 설명을 하거나 학생들이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할 수있어 도움이 되는 것이다.
집필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다
다년간의 여행은 집필에도 영향을 끼쳤다. 1998년도 교직을 그만두기로 했을 당시 학생들이 지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선물했다. 그런데 이 원고를 본 출판사 관계자가 “교과서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해 7차 교육과정 교과서 <세계지리>를 집필하게 된 것이다. 이후 <세계지리 교과서>,
이런 그에게 작년 정명정보고등학교로 발령받으면서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겼다.
“실업계 학교로 와보니 인문계 방식으로 지리공부를 해선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군다나 우리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여서 수능을 봐도 사탐을 안 보고 직탐을 보거든요. 우리학교 학생에게 지리는 교양과목과 같은데 수능과정으로 배우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리를 가르쳐야 하는지가 지금 제 최대의 고민이죠.”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길을 떠날 조지욱 교사. 인터뷰를 마치며 이번 방학에는 어느 곳으로 여행을 떠날 거냐는 질문에 원래 계획하고 여행을 떠나지 않지만 분명 어딘가는 갈 것이라고 답했다. 방학인 지금도 그는 어딘가로 떠나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진 | 성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