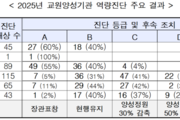지난달 28일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사회 각계가 폐기를 주장하는 가운데 교총은 절차의 투명성, 내용의 적절성과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정부는 편찬기준과 집필진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대사 집필자는 역사학자가 1명뿐으로 전문성을 의심받고 있다. 또 ‘대한민국 수립’ 표현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친일과 독재 미화 논란을 피하려는 듯 이승만 정부 독재, 5·16군사정변과 10월 유신, 민주화 운동의 성과 등을 중립적으로 서술하려 애썼지만 이 또한 한계를 드러냈다. 고교 한국사에서 근현대사 서술 분량이 절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을 정교하게 기술하는 등 비중을 높여 또 다른 편향성 시비를 낳고 있다. 검정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욕이 1년만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내놓는 무리수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왜 그토록 조급하게 국정화를 추진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검정과 국정의 찬반 논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는지도 이제 되돌아봐야 한다. 그간 검정을 주장하는 역사학계와 집필자, 일부 교사들은 편향된 집필과 수업을 하지 않았는지, 반미와 종북 그리고 자학적 사관을 기술하고 학생들에게 주입하지 않았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 또한 검‧인정 발행체제의 물꼬를 터놓고 방치한 책임이 크다. 시정·권고를 통해 내용 수정이 가능했음에도 때를 놓치고 국정화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육관료와 정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달 23일까지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본을 확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이 거부하는 교과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이 전회원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나아가 현장 교원들은 역사교과서가 더 이상 이념,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