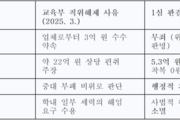겨울방학을 하는 날. 우리 학교의 방학 계획서에는 “눈이 내린 날은 가까운 마을의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학교에 나와서 운동장의 눈을 쓸기로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이 흠뻑 내린 오늘 아침에 우리는 바쁘게 자기 집 앞의 눈을 쓸고 서둘러서 학교를 향해 나서야 헸다. 집에서 학교까지 미끄러운 눈길을 달리는 버스는 엉기면서 40여분 거리를 두 시간이 너머 걸려서 겨우 도착하였고, 버스 종점에서 학교까지 약 1km의 거리를 걷기는 무척 힘이 들었다.
1980년대 초엽에는 모든 사회가 군대식으로 움직이고 있던 시절이었다. 마치 군대에서 눈이 내리면 별로 쓰지도 않는 연병장일지라도 제설작업을 하여야 하듯이 각급학교에도 눈이 오면 무조건 운동장의 축구장 정도 또는 운동장 트랙을 활용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눈을 치우도록 지시가 내렸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손만으로 운동장을 치울 수가 없으니까 학교 인군의 마을 어린이들도 나오라고 하여서 함께 눈치우기 작업을 해야 했다.
요즘은 눈을 치우는 눈삽이나 밀개 등의 도구가 많이 나와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었던가? 학교에서는 좀 두꺼운 베니어판을 각목에 붙여서 만든 커다란 밀삽<약 60 x90cm 정도>으로 밀고 가다가 앞에 많이 모이면 잠시 모아두고 다시 밀어다가 나중에 모아진 곳에서 또 밀어 내는 식으로 작업을 했다.
다행히 학교에서 가까운 마을의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운동장의 눈을 밀어내고 있었다. 너무 많이 내린 눈을 멀리 쓸어 낼 수는 없어서 우선 겨울 동안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의 트랙 부근을 쓸고 눈을 밀어내어서 길을 만드는 것이었다.
차가운 아침 기온이었지만 눈 속에서 한 바탕 땀을 흘릴 만큼 일을 하고 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장난기가 발동을 하였다. 드디어 장난스러운 G선생님이 여자라는 생각도 잊은 채 마치 아이들 마냥 눈덩이를 뭉쳐서 남자선생님들의 등짝에 밀어 넣는 장난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장난이 불씨가 되어서 온 운동장은 금세 눈싸움의 장이 되었고 여기 저기 편을 가른 것도 아니고 아군 적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자기에게 가까이 있어서 던지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적이 되어서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다. 선생님과 아이들, 아이들과 아이들, 선생님과 선생님이 모두 적이고 모두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온 운동장이 시끌벅적한 시장터보다 더한 소란이 일었다.
이러는 사이에 한강하구에서 일어난 안개가 소리 없이 밀려와 온 운동장을 덮고 지나면서 하얀 안개 속의 태양은 마치 은화 한 닙이 공중에 떠있는 듯 빛을 잃고 하얗게 떨고 있었다. 아침의 차가운 바람 대신에 밀려온 안개는 마치 비단 자락을 온 몸에 휘감은 듯 감미롭고 샤워장에서 온 몸을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흐르듯 온 몸을 휘감고 지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자 운동장의 눈싸움은 더욱 기운을 더해갔다. 소리 없이 흐르는 안개와 흐릿한 태양 빛은 마치 지금이 눈 내리는 밤을 연상케 해주었고 이런 느낌이 더욱 신나게 만들어 준 것 같았다. 이제는 눈 위에서 논다는 생각이 없어질 만큼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어가고 있었다. 모두들 입에서 내뿜는 하얀 입김이 희끗거리고 쫓고 쫓기는 사이에 쓸어 두었던 운동장의 트랙은 다시 엉망이 되어 버렸다.
눈싸움에 정신을 팔고 있는 사이에 눈 그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안개 속에서 흐릿한 눈길을 주고 있는 동안에 안개는 제법 그럴싸한 작품을 남기고 있었다. 한강 하구에서부터 밀려온 안개가 고봉산을 향하여 흘러가면서 나무 가지마다 한강 하구 쪽에는 하얀 눈꽃에 만들어 졌다. 불과 20여분 사이에 나무들은 야누스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다. 한강 하구 쪽은 하얀 눈꽃이라 부르는 상고대가 엉겨서 하얀 나무가 되었다. 하지만 반대로 고봉산 쪽에서 보면 나무들은 벌거벗은 흑갈색의 나무줄기를 들어내고 있어서 흑과 백이 반반씩으로 나뉘어져 있는 나무줄기가 신비롭기만 하니다. 그러나 모두들 그런 멋진 안개의 작품을 감상 할 여력이 없었다. 아이들은 아예 운동장에 누워서 뒹굴기도 하고, 눈으로 덮어 버리는 장난에 취해서 운동장은 그냥 한 바탕 눈 속에서 뛰어 노는 강아지들 같은 신나는 자리가 되었다. 그 때 한참 쫓기던 김 선생님이 나무 아래로 달려가다가 그만 이렇게 멋진 안개의 퍼포먼스<행위 예술>을 발견했다.
“야! 이 나무에 핀 눈꽃 좀 봐 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이 아닐까?”
이 소리에 운동장에서 뛰어 놀던 많은 사람들은 그 때야 새삼스럽게 안개의 작품을 바라보고 탄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와아. 정말 멋지다. 이거 눈꽃이라 부릅니까? 선생님?”
아이들이 소리치자 G 선생님이 당연하다는 듯
“그럼 이걸 뭐라 하노? 눈꽃이 아니고 뭐라노 말이다.”
하고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해 다그친다.
“에이. 그건 눈꽃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눈꽃이라 하지만 정식 이름은 상고대가 아닙니까? 이건 눈이 아니고 안개가 나무에 닿으면서 서리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고 나서는 선생님은 김 선생님이셨다. 늘 바른 말을 강조해 오신 분이기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그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G 선생님은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김 선생님의 말에 부아가 난 것인지,
“무슨 상고대가 뭡니까?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 내에. 다들 눈꽃이라 카는데 상고대가 뭐꼬. 방송에서도 눈꽃 축제라고까지 하지 않습디까?”
하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는 사이에 G 선생님은 휘늘어진 수양버들나무 아래에 서 있는 김 선생님의 곁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이걸 본 A 선생. 그 특유의 장난기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다. 두 사람이 [눈꽃]과 [상고대]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동안에 A 선생님은 그들 두 사람이 가까이 서 있는 수양버들 나무의 줄기를 발로 “꽝” 찍어 차고 달아났다. 수양버들나무가 그리 큰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 온 나무가 덜컹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나무에서 쏟아지는 [상고대]는 이만 저만 한 것이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상고대는 마치 눈사태가 난 듯 하얗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사라락‘ 소리와 함께 나무 밑에 선 두 선생님은 온통 눈을 덮어쓰고 말았다. 이제 위에서 불어오는 안개가 만든 상고대가 사람에게 덮어 씌워서 두 선생님은 눈꽃 눈사람이 되었다.
“와, 하하하.‘
달려가던 A 선생님의 박장대소가 터지고 다른 선생님들도 한 바탕 웃을 꽃이 피었다. 나무 아래에서 눈꽃을 덮어쓴 두 선생님들도 모두들 같은 소리로 함박웃음을 날리면서 온몸을 털어 내었다.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은 누가 나무 가까이만 가면 나무를 차는 싸움으로 장난이 옮겨가고 있었다. 한강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태양이 다시 허연 은화에서 조금씩 빛을 발하는 태양의 모습으로 돌아 올 때 운동장의 아이들과 선생님은 다시 트랙을 쓸어서 하얀 세상에 한 줄기 길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1983년 1월 어느 날 아침의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