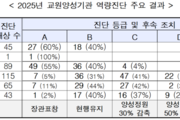“안심알리미가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죠? 학교에서 수리를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의 등하교를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때문에 교무실로 전화가 와요. ‘안심알리미가 안 되는데 왜 이런 것을 고치는 것도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느냐, 학교에서 직접 업체에 연락해서 고쳐와야 하는 것 아니냐?’ 항의하는 전화였지요.
고민이 되었어요. 그냥 들어주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할지, 아니면 이치에 맞게 조곤조곤 응대해야 할지 말이지요. 사람들은 가전제품을 사면 직접 AS 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하고는 해요. 자신이 쓰던 가전제품을 샀던 매장에다 고쳐내라고 요구를 하지는 않지요.
안심 알리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업체를 연결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를 해드릴 뿐 학교에서 만든 제품도, 학교에서 영리를 취하지도 않지요. 그런데도 기기의 수리까지 학교에서 책임지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닌 듯해요. 당사자가 업체에 전화하면 손쉽게 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학교에서 개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학교에서는 비상식적인 민원에 골치가 아파요. 주말에 다른 학교 아이가 놀이터에 놀러 와서 다쳤는데, 학교의 문이 열려있어서 들어오게 된 것이니 학교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민원. 방과 후에 아이들끼리 싸워서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안에도 교사는 뭘 하고 있었느냐며 화를 내는 전화. 교무실에 오는 민원 전화를 살펴보면 보통 반 이상의 전화에는 딱 네 글자로 대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글자가 뭐냐고요? 어쩌라고! 어찌해야 할까요? 합리적이지 않은 항의. 자신의 기분을 투사하는 짜증 섞인 말투를 말이지요.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타인에게 투사해요. 마치 빔프로젝터로 영상을 쏘듯, 스스로 짜증과 공격성을 타인에게 쏘아대지요. 앞에 있는 타인은 하얀 벽처럼 가만히 있는데도 마치 그 사람이 모든 잘못을 다 한 것처럼 화를 내뿜는 민원을 받는 일, 그건 비단 학교뿐만은 아닐 거에요.
마트의 고객 안내센터에서 상담원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자동차 리콜을 받으러 가면서 카센터 직원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카센터 직원이 차를 만든 건 아닌데) 학교에서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자신의 화난 마음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사람들에게 벽이 되어주고 싶지는 않지만, 학교라는 벽은 그런 사람들을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 민원에는 일단 응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부지불식간에 가지게 되니까요. 학교가 참 무서운 곳이에요. 우리가 거리를 둘 수 있는 일에도 노심초사하게 만드니까요.
어쩌면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우리들의 ‘무사유’ 때문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요. 민원인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는 태도. ‘그래, 민원이니까 처리를 해야지’라며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 그저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는 전화까지도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착각. 그런 잘못된 자세와 생각 때문에 단호하게 자를 수 있는 짜증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게 돼요. 교사 똥은 개도 안 먹는다잖아요. 예전에는 가르치는 일이 고돼서 그런 말이 나왔을 텐데, 요즘에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더 속을 썩지 않나 싶어요.
합리적인 민원에는 응대해야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일일이 대꾸하느라 너무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민원 전화는 모두 녹취를 해 놓고, 민원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아예 응대하지 않도록 매뉴얼도 바꾸면 어떨까요? 전화로 짜증 내는 일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직하게 막무가내의 민원까지 다 껴안고 가는 것보다는 슬기롭게 받을 건 받고 내칠 건 내치면서 학교의 행정력과 교사의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낭비하지 않는 체계적이고 슬기로운 민원 응대가 필요해요. 슬기로운 민원 생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본다면 그리 멀리 있는 일만은 아닐 거예요.
우직하게 막무가내의 민원까지 다 껴안고 가는 것보다는 슬기롭게 받을 건 받고 내칠 건 내치면서 학교의 행정력과 교사의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낭비하지 않는 체계적이고 슬기로운 민원 응대가 필요해요. 슬기로운 민원 생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본다면 그리 멀리 있는 일만은 아닐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