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말 가운데 외국어로 번역이 되어서는 그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말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선비다. ‘학문을 닦아 자신의 뜻을 세우고 권력이나 재물 등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사람’ ―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비다. 그리고 선비가 지닌 고결한 신념과 생활 자세를 뭉뚱그려 선비정신이라고 부른다.
다른 왕조 때도 그러했지만, 특히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해준 사회적 기풍은 바로 선비정신이었다. 선비의 신분으로 재야에 있다가 관직에 오르면 군주를 위해 직언을 마다하지 않았고 군주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귀양을 가거나 사약을 받더라도 굽히지 않았다.
번역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사례가 선생 또는 선생님이며 스승이다. 그 단어에는 ‘가르치는 사람’을 넘어서서 ‘정신적 감화로써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주는 인격자’라는 뜻이 들어있어, 영어의 ‘teacher’ 또는 ‘mentor’로는 도저히 전달될 수 없다.
최승렬 선생님을 회상하며
마침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필자는 필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훌륭한 선생님들을 떠올리게 됐다. 여기서는 그분들 가운데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국어를 가르치셨고, 또 문예반에서 3년 내내 지도해주셨던 최승렬 선생님(1921~2003)을 회상하기로 하겠다.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극도로 가난하던 일제강점기에 전라북도에서 태어나 매우 어렵게 컸다. 정규의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역경을 이겨내 교사자격 검정고시를 통해 준교사 발령을 받아 전주에서 가르치시다가 인천의 우리 학교로 오셨다. 곧 인천에서 경인열차를 이용해 통학하며 단국대학 야간부에서 국문학을 전공해 문학사 학위를 받아 정교사가 되셨다. 또 ‘한어(韓語)가 고대 일본에 미친 영향’(태멘기획, 1982)이라는 명저를 출판하셨다.
자신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받기도 해서인지 선생님은 자신이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것을 앞세우며 잘난 체하는 사람을 아주 많이 미워하셨다. 우리에게도 가끔 “너희들 인천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는 말을 듣는 학교에 다닌다고 뻐기지 말라. 사회적 인식에서 처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모두 그러한 사연이 있어서다. 시험점수나 석차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같은 맥락에서, 선생님은 ‘재승덕박(才勝德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재주는 좋지만, 덕이 박한 사람’은 ‘재주는 모자라지만 덕이 큰 사람’만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수재 의식을 버리고 겸허한 성격을 기르라고 가르치셨다. 무엇보다 “먼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다.
“올곧은 선비의 길을 걸어야 하네”
이 못난 제자가 교수가 되어 찾아뵈었을 때, 선생님은 우선 축하한다고 말씀하신 데 이어 “자네 조선의 선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지? 자네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올곧은 선비의 길을 걸어야 하네”라고 가르치셨다. 또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학생의 친구라는 생각으로 생활해야 하네”라고 덧붙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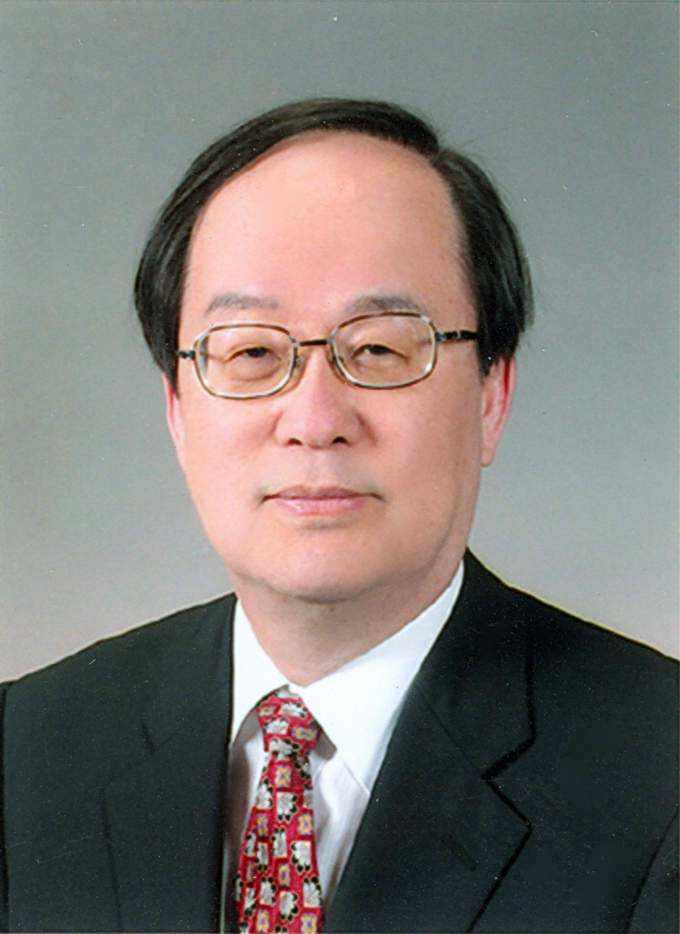 필자는 지난 2013년에 70세가 될 무렵에야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했다. 그사이 잊고 있었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자신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잘못을 많이 저질렀음을 새삼 깨닫게 됐다. 이제 곧 팔순을 바라보는 노령에 이르러, 옛 졸업생들로부터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고마움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낀다. “먼저 사람이 되라”던 선생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른다. “그때 내가 그렇게 언동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라는 회한마저 일어나면서 스스로 나무라게 된다.
필자는 지난 2013년에 70세가 될 무렵에야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했다. 그사이 잊고 있었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자신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잘못을 많이 저질렀음을 새삼 깨닫게 됐다. 이제 곧 팔순을 바라보는 노령에 이르러, 옛 졸업생들로부터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고마움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낀다. “먼저 사람이 되라”던 선생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른다. “그때 내가 그렇게 언동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라는 회한마저 일어나면서 스스로 나무라게 된다.
선생님, 가르침에 충실하지 못했던 못난 제자를 용서해주시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