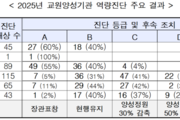민들레 무리가 곳곳에서 노란 세상을 만들고 있다. 공터는 물론 보도블록 사이 등 조그만 틈이나 흙만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민들레가 자랄 정도다.
사람들이 흔히 민들레라 부르는 것에는 토종 민들레와 귀화식물인 서양 민들레가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야생화 공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서양 민들레는 꽃을 감싸는 총포 조각이 아래로 젖혀져 있지만, 토종 민들레는 총포 조각이 위로 딱 붙어 있다. 민들레 꽃대를 젖혀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토종인지 외래종인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주 보다 보면 굳이 총포를 살펴보지 않아도 두 민들레를 구분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서양 민들레는 꽃 색깔이 샛노랗지만, 토종 민들레는 연한 노란색으로 담백하기 때문이다. 또 민들레는 잎 결각이 덜 파인 편이지만 서양 민들레는 깊이 파인 점도 다르다.
요즘엔 토종 민들레 대신 서양 민들레가 더 흔하다. 서울 등 도심에서는 토종 민들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서양 민들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양 민들레는 1910년쯤 들어온 귀화식물이다. 그런 서양 민들레가 토종 민들레를 밀어내고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이유는 왕성한 번식력 때문이다. 토종 민들레는 4~5월 한 번만 꽃이 피지만, 서양 민들레는 봄부터 초가을까지 여러 번 꽃을 피워 번식할 수 있다.
꽃송이 하나당 맺히는 씨앗의 숫자도 서양 민들레가 훨씬 많다. 토종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가 좋아하는 서식지는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서양 민들레가 그 자리를 선점하면서 토종 민들레는 설 자리를 잃은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시골에서도 토종 민들레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 다행인 것은 토종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는 교차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토종 민들레가 밀려나면서도 순수성을 지켜가고 있는 셈이다. 언젠가 계기를 마련해 토종 민들레가 대대적인 반격을 하리라 믿는다.
꽃 색깔이 하얀 흰민들레도 있는데, 역시 토종이다. 흰민들레는 시골에 가면 좀 볼 수 있다. 약으로 쓴다고 일부러 기르는 경우도 많다.
아무데서나, 눈물겹도록, 노랗게 피어나는 민들레꽃
박완서의 <옥상의 민들레꽃>은 어린아이 시선으로 한 고급 아파트 주민들의 세태를 바라본 동화인데, 민들레가 생명의 상징으로 나오고 있다. 1979년 샘터사에서 낸 작가의 첫 동화집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에 들어 있는 단편 중 하나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궁전아파트에서 할머니 자살 사건이 잇따라 생긴다. 주민들은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방지책을 논의하지만,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이 자리에서 어린 ‘나’는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민들레꽃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보다 어릴 때 ‘나’는 가족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에 핀 민들레꽃을 보고 자살을 포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때 나는 민들레꽃을 보았습니다. 옥상은 시멘트로 빤빤하게 발라 놓아 흙이라곤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송이의 민들레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봄에 엄마 아빠와 함께 야외로 소풍 가서 본 민들레꽃보다 훨씬 작아 꼭 내 양복의 단추만 했습니다만 그것은 틀림없는 민들레꽃이었습니다. (중략) 흙이랄 것도 없는 한 줌의 먼지에 허겁지겁 뿌리 내리고 눈물겹도록 노랗게 핀 민들레꽃을 보자 나는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주인공이 민들레는 옥상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곱게 웃으며 꽃을 피우는데, 자신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버리려 한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장면이다. 그리고 ‘나’는 집으로 돌아와 따뜻하게 반겨 주는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했다. 작가는 이처럼 민들레꽃을 통해 어린아이 눈으로 바라본 어른들 모습을 그려내면서 생명의 소중함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 데도 민들레처럼
민들레는 국화과 여러해살이풀로, 햇볕이 잘 드는 산과 들, 길가 빈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동화에서처럼 흙이 조금만 있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민들레는 꽃대 하나가 한 송이 꽃처럼 보이지만, 실은 수십 개의 작은 꽃송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국화과 식물의 특징이기도 하다.
민들레는 친근하고 서민적인 꽃이다. 또 밟아도 밟아도 견디며 꽃을 피우기 때문에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동화에서처럼 여러 예술분야에서 서민과 희망의 상징으로 많이 쓰였다.
민들레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2019년 나온 영화 ‘말모이’에서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은 민들레의 이름 유래가 ‘문둘레’라고 말한다. 옛날에 문 둘레에 민들레가 흔해 이 같은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야생화 고수(高手)인 이재능 씨는 책 <꽃들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꽃나들이)>에서 ‘문둘레’ 유래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어쩌면 숲도 밭도 논도 아닌 밋밋한 들판 아무 곳에나 피는 꽃, 그러니까 ‘민들에’ 지천으로 피고 지는 꽃으로 봐줘도 그럴싸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는 “수백 수천 년을 불러온 꽃 이름의 의미를 알아내기란 50대조 할아버지 초상화 그리기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민들레의 영어 이름은 댄딜라이언(dandelion)으로, 사자의 이빨이란 뜻이다. 잎에 있는 톱날처럼 생긴 결각 때문에 붙은 이름일 것이다.

민들레와 관련해 잘못 쓰이는 용어 중 하나가 ‘홀씨’라는 단어다. ‘민들레 홀씨 되어’라는 80년대 대중가요 때문인지 사람들이 흔히 ‘민들레 홀씨’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홀씨는 식물이 무성생식을 하기 위해 형성하는 생식세포를 말한다. 따라서 홀씨는 고사리 같이 무성생식을 하는 식물에나 맞는 표현이다. 엄연히 수술과 암술이 있는 민들레는 홀씨가 아니라 꽃씨 또는 씨앗이라고 해야 맞다.
민중가요 중 ‘민들레처럼’이라는 노래가 있다. 좌절을 느끼거나 자존심 상해도 참아야 할 일이 있을 때,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 데도 민들레처럼’,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흔하고 너른 들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라는 대목을 음미하면서 위안을 얻을 때가 있다. 이 노래에는 투혼·해방 같은 직설적인 운동권 용어도 나오지만, 그냥 서정적인 노래로 들어도 괜찮다. 아마 박완서 작가 마음도 이 노래에 나오는 가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