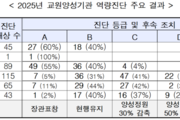노란 더듬이를 가진 푸른 나비
2016년 77세 작가 한승원은 ‘달개비꽃 엄마’라는 장편소설을 냈다. 등단 50년을 맞은 작가가 99세에 별세한 어머니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것이다. 소설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무덤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났을 때 (중략) 금잔디를 밟고 선 내 발 앞으로 국숫발같이 오동통한 달개비 덩굴 한 가닥이 기어나왔다. 그 덩굴의 마디마디에서 피어난 닭의 머리를 닮은 남보랏빛 꽃 몇 송이가 나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중략) 그 오동통한 달개비 풀꽃처럼 강인하게 세상을 산 한 여인, 나의 어머니를 위하여 이 소설을 쓴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달개비꽃에 비유한 것이다. 그 많은 잡초 중에서 강인하면서도 어여쁜 달개비를 고른 것은 탁월한 선택인 것 같다.
달개비 꽃은 7월쯤 피기 시작해 늦가을인 10월까지 피는 꽃이다. 밭이나 길가는 물론 담장 밑이나 공터 등 그늘지고 다소 습기가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꽃은 작지만 자세히 보면 상당히 예쁘고 개성 가득하다. 우선 꽃은 포에 싸여 있는데, 포가 보트 모양으로 독특하다. 남색 꽃잎 2장이 부챗살처럼 펴져 있고 그 아래 노란 꽃술이 있는 구조다. 이 모습을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책 ‘한국의 야생화’에서 “마치 노란 더듬이를 가진 푸른 나비를 보는 듯하다”고 표현했다. 꽃이 지고나면 생기는 밥알 모양 열매는 어릴 적 소꿉놀이할 때 쌀 대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달개비라는 이름은 꽃이 닭의 볏을 닮았다고 붙인 이름이다. 이 풀의 정식 이름은 닭의장풀인데, 이 식물이 주로 닭장 주변에 자란다고 붙은 것이다.


6월에 흰색 또는 옅은 보라색으로 피는 소박한 꽃
박완서의 대표작을 고르라면 당연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일 것이다. 그런데 몇 권을 더 고르라면 ‘엄마의 말뚝’ 연작도 빠지지 않을 것 같다. 박완서는 1981년 ‘엄마의 말뚝2’로 이상문학상을 받았다.
이 두 작품은 비슷한 대목이 많기도 하다. ‘그 많던 싱아’는 박완서가 고향(박적골)을 떠나 서울 생활을 시작해 대학생으로 6·25를 맞기까지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엄마의 말뚝’은 이 과정을 엄마의 관점에서 그린 소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겹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꽃으로 소설을 읽는 것, 소설에서 주요 소재 또는 상징으로 나오는 꽃을 찾아 그 의미를 알아보는 것은 필자의 오랜 관심사였다. 박완서 문학에서 ‘엄마의 말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이 소설도 한번 다루어보고 싶어 열심히 소설 속에 나오는 꽃을 찾은 적이 있다. 그러나 몇 번 읽었지만 마땅한 꽃을 찾지 못했다. 소설 초반에 살구나무·토종국화 등이 나오긴 하지만 고향 박적골의 상징으로는 몰라도 엄마의 상징은 아니었다.

한참 후에야 ‘엄마의 말뚝’이 아닌 다른 소설에서 엄마를 상징할 만한 꽃을 찾았다. 바로 ‘그 많던 싱아’에서였다. 소설에서 6·25 발발 직전 박완서와 엄마가 오빠가 근무하는 고양중학 사택을 둘러보러 갔을 때 장면이다.
<엄마는 집은 보는 둥 마는 둥 먼저 텃밭으로 들어갔다. 한참이나 밭고랑에 쭈그리고 앉았기에 나는 엄마가 거기서 오줌을 누는 줄 알고 일부러 딴 데를 보았다. 한참 있다가 돌아다보았더니 어린애처럼 흙을 주무르고 있었다. 나하고 시선이 마주치자 감자꽃처럼 초라하고 계면쩍게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난 하루라도 빨리 여기 살고 싶구나. 땅이 어쩌면 이렇게 거냐? 세상에 이 좋은 땅을 이대로 놀리다니.”>

이 장면 바로 뒤에 6·25가 터지면서 이사를 포기했을 때 ‘나는 불현듯 텃밭 사이에서 감자꽃처럼 웃던 엄마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깊이 아렸다’는 문장이 있다. 이런 대목들로 볼 때 감자꽃은 엄마를 상징하는 꽃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감자꽃은 6월에 흰색 또는 옅은 보라색으로 피는 소박한 꽃이다.

장미에 모성애를 담아낸 절묘한 조화
신경숙의 베스트셀러 ‘엄마를 부탁해’ 표지는 강렬한 빨간색에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듯한 여자가 기도하는 그림이다. 실제로는 밀레의 ‘만종’에서 모티브를 얻어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그림을 쓴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엄마를 부탁해’ 일본어판 표지는 장미 사진으로 뒤덮여 있다. ‘엄마를 부탁해’가 장미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런 표지를 쓴 것일까. 일본 출판사에 문의해본 것은 아니지만, 소설에서 장남이 서울에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 엄마가 담장 옆에 장미를 심어주는 내용에서 착안한 것이 확실하다.
<그가 집을 갖게 되고 처음 맞이한 봄에 서울에 온 엄마는 장미를 사러 가자고 했다. 장미요? 엄마의 입에서 장미라는 말이 나오자 그는 잘못 듣기라도 한 듯 장미 말인가요? 다시 물었다. 붉은 장미 말이다, 왜 파는 데가 없냐? 아뇨 있어요. 그가 엄마를 구파발에 쭉 늘어서 있는 묘목을 파는 화원으로 데리고 갔을 때 엄마는 나는 이 꽃이 젤 이뻐야, 했다. 엄마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장미 묘목을 사와서 담장 가까이에 구덩이를 파고 허리를 굽혀가며 심었다. (중략) 엄마의 그 모습이 낯설어 그가 담과 너무 가까이에 심는 거 아니냐고 하자 엄마는 담 바깥에 사람들도 지나다님서 봐야니께, 했다. 그 집을 떠나올 때까지 봄마다 장미는 만발했다.>

어렵게 집을 장만한 자식의 행복이 장미 향기처럼 세상에 퍼지기를 바라는 엄마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자신은 그렇지 못했지만 자식들은 화려하게 살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도 담겨 있을지 모른다. 화려한 장미와 시골에서 올라온 엄마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처럼 장미에 모성애를 담아내면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엄마를 부탁해’는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는 엄마의 사랑, 그리고 자식들과 남편의 때늦은 후회를 담고 있다. 엄마를 잃어버린 후에야 자신들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어머니의 사랑은 얼마나 컸는지 깨닫는 것이다. 에필로그에서 큰딸은 바티칸시티에 갔다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 가거든 장미나무로 만든 묵주를 구해다 달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낸다. 그리고 장미묵주를 사서 피에타상 앞에 내려놓고 ‘엄마를, 엄마를 부탁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는 장미가 엄마의 상징으로 선명하게 나오고 있다.
‘달개비꽃 엄마’, ‘엄마의 말뚝’, ‘엄마를 부탁해’를 읽으면 누구나 읽는 내내 어머니를 떠올릴 것이다. 필자도 위 소설들을 읽으며 어머니 이야기를 쓴다면 어떤 꽃에 비유하는 것이 좋을지 오래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