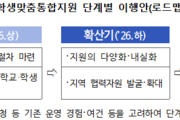인류의 발명품 중에 냉장고와 컴퓨터는 가히 역사를 가르는 획기적인 문명의 이기(利器)다. 우선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급히 음식을 해서 먹어야 할 때를 생각해 보자. 시장을 봐서 준비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라면으로 때우기는 싫을 때 냉장고 문을 열어 본다. 그리고는 이것저것 찾다가 때마침 눈에 보이는 몇 가지로 그럭저럭 식사를 해결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배움을 얻는다. ‘먹거리를 냉장고에 미리 넣어 두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이다.
컴퓨터는 어떤가? 평소 문서 작업하여 자유롭게 저장해 놓은 PC에서 급히 쓸 일이 있는 자료를 찾는다. 하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자료를 쉽게 찾지 못하고 그만 포기한다. 그때 가서야 ‘데이터를 잘 관리해 둘 것을!’ 하고 후회한다. 그런데 그 후에도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결국 없어서 못 쓰기보다는 있어도 관리를 하지 못해 못 찾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점은 식자재나 데이터 탓이 아니다. 결국 관리하지 못하는 본인 탓이다. 여기서 또 하나를 배운다.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 사례를 통해 무엇을 깨닫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쌓아 두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있음’의 반대는 ‘없음’이 아니다. ‘쓸모없음’이다. 냉장고에 넣어 두어도 유통 기한이 지난 것이나, PC의 데이터가 활용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한다. 물론 오랫동안 쓸 음식은 냉동 보관할 수도 있고, PC의 데이터도 별도 보관해 둘 수 있다. 하지만 대개는 이리저리 시간만 끌다가 어느 날 폐기하는 것은 공통된 운명이다.
데이터만 집중해서 살펴보자. 있어도 모두 ‘쓸모’ 있는 것은 아니다. ‘쓸모’는 쓰는 사람의 눈높이, 용도, 문제의식의 수준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그대로 가져다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복사 수준이다. 가공해서 쓰는 사람도 있다. 성의가 있다.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 이끄는 사람이다. 물론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 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좋은 그리고 유의미한 데이터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 유의미한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을 알고 그를 닮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데이터 그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데이터가 ‘앎’에 그친다면 이론일 뿐이다. 데이터는 ‘삶’과 연계돼야 비로소 제구실을 할 수 있다. 교사에게는 아이들이 생산한 각종 자료는 결과물이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과정’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데이터의 참가치다. 앎에 그친 평가는 성장중심 접근법이 아니다. 식탁에 놓인 음식으로 모든 것을 대변해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음식을 만들어가고, 요리하고, 결과물을 세팅하는 마지막까지가 다 맛에 포함될 때 제대로인 음식이지 않은가.
데이터는 어딘가에서 누군가로부터 공짜로 얻은 것은 대개 묵히기 마련이다. 내 것이 되기 쉽지 않다. 어쩌다 한번 쓰고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생산과정에 함께하지 않는 자료는 자신의 심장에서 뿜는 피가 돌지 않는다. 데이터에 자신의 붉은 피가 돌도록 끝없이 손질해야 하는 이유다. 혈액형이 다른 피가 들어 왔으니 어찌 저절로 동화될 수 있겠는가. 결국 손수 만드는 것이 훨씬 편하고 유의미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마지막 단계의 높은 배움에 올라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DIY(Do It Yourself)의 정신이다.
결국 요약하자면 냉장고에 아무리 많은 식자재가 들어 있어도 식탁에 놓일 수 있어야 반찬인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PC에 데이터 양이 넘칠지라도 수업에서 활용되도록 설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쓸모있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가지고 있음이 곧 쓸모 있을 때, 재고가 아니라 잔고로 남아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자기 주도적인 디자인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교사의 수업은 참된 멋과 맛이 담긴 좋은 수업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