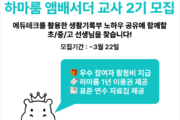아침에 일어나보니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두꺼운 겨울 파카를 꺼내 입고 밖으로 나왔다. 숨을 쉴 때마다 우윳빛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가을에 내리는 눈. 초원의 낙엽송은 노랗게 물들었는데 눈이 내리다니. 숲에서 쌍봉낙타 몇 마리가 느린 걸음으로 빠져나왔다. 눈 내리는 단풍숲을 지나는 낙타. 뭔가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

# 초원
토요타 랜드크루즈를 타고 테를지 국립공원 야마트 산 정상에 올랐다. 이곳에 커다란 늑대상이 있다. 몽골인은 늑대를 시조로 삼는다. 몽골인은 ‘보르항산’ 기슭에 펼쳐진 초원에서 하늘의 뜻으로 인간세계에 내려온 푸른 늑대(볼테치노)와 그의 아내 흰 사슴(고아바랄) 사이에서 시조 ‘바타치 칸’이 태어났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들의 10대손인 ‘알란코아’(북쪽에서 내려온 곱디고운 여자)가 태어났다. 몽골족의 시조모(族母)로 여겨지는 여인이다. 그리고 또다시 12대를 흘러 세계 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이 이 가문에서 나온다.
늑대상 옆에는 우리 서낭당에 해당하는 돌무더기 ‘어워’가 서 있다. 세 바퀴 돌고 소원을 비는 곳이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테를지의 풍경은 압도적이다. 곳곳에 거북바위·독수리바위 등의 이름을 단 기암괴석이 자리 잡고 있다. 중생대의 화강암으로 원래 바다였던 지역이 융기·침식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한다.
산에서 내려와 말을 타고 초원을 달려본다. 몽골을 여행한다면 말타기를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 어렵지는 않다. 처음에는 마부가 고삐를 잡은 말을 타고 걷다가 나중에는 고삐를 좌우로 당기며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말을 타고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기분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뺨에 닿는 바람이 다소 차갑지만,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진다.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과는 또 다른 기분이다. 말을 타고 가다보면 유목민이 양떼를 몰고 가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몽골의 젖줄이라 불리는 툴(Tull)강도 건넜다. 물은 검었고,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고삐를 잡은 손이 시렸다. 툴강은 몽골의 중북부에 위치한 칸 헨테인 누루 자연보호구의 헨티산군(Khentii Mountains)에서 발원해 테를지 국립공원과 울란바토르를 관통해 흐른다. 길이 704km의 이 물줄기는 하류에서 오르혼강(Orkhon River)과 세렝게강(Selenge River)과 합류되어 러시아의 바이칼호수로 흘러 들어간다.
테를지 여행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밤하늘의 별 감상이다. 밤이면 머리 위 까만 하늘에 별이 돋는다. 수만 개의 별이 불을 켠 듯 반짝인다. 이마 바로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손을 들어 하늘을 저으면 별들이 후드득 떨어져 내릴 것만 같다. 몽골을 여행하는 많은 이들이 별을 찍기 위해 커다란 카메라와 삼각대를 가져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 사막
초원 여행을 끝내고 울란바토르로 돌아와 하루 휴식 후 다시 사막으로 향했다. 울란바토르에서 칭기즈칸 시대 수도였던 하라호름으로 가는 길에 바양고비(Bayan Gobi)가 있는데 이곳에 엘승타사르하이라는 사막이 있다. 울란바토르에서 약 280km 떨어져 있다. 차로 네 시간 정도가 걸린다. 고비 사막까지 갈 시간 여유가 없는 여행자들이 주로 찾는다.
가는 내내 돌산과 드넓은 평원이 펼쳐진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평선. 가끔 나타나는 흰 점들은 게르이고, 검은 점은 양떼들이다. 가는 길에 자그마한 마을 한두 곳을 지난다. 운전사는 마을에 들러 민가 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간다. 얼마 후 나온 그의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 두 개가 들려있다. 뭐냐고 물어보니 석탄이란다. 오늘 밤 묵을 게르의 난로에 넣을 연료다. 보드카를 넉넉히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엘승타사르하이는 사막과 대초원이 공존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초원 한 가운데 80km나 이어지는 사막이 버티고 있다. 엘승타사르하이는 ‘모래의 단절’이란 뜻. 사구와 사막식생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아니라 중간 중간 나무가 서 있는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다. 실개천이 흐르는 곳도 있어 유목민도 살고 있다.
이곳을 찾은 여행자들은 낙타 타기를 경험한다. 초원을 달리는 승마와는 또 다르다. 승마가 달리기라면 낙타 타기는 산책이다. 낙타는 귀소본능이 강해 고삐를 놓으면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낙타주인이 맨 앞에 서서 일행을 이끌어야 한다. 앉아 있는 낙타 등에 올라타면 낙타가 벌떡 일어서는데 이때 높이가 생각보다 높아 놀란다. 낙타 타기를 마치고 게르로 돌아오니 몽골 전통 양고기 요리인 ‘허르헉’이 준비되어 있었다. 양고기를 큼직하게 잘라 감자·당근 등의 야채와 함께 양철통에 넣은 후, 불에 달군 돌을 통에 넣고 뚜껑을 닫아 1시간 정도 익힌 후 먹는 요리이다. 독특한 향신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양고기 특유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몽골인들은 고기를 정말 좋아한다. 아침에 양고기 국수를 먹고, 점심에 양고기 덮밥을 먹는다. 저녁에는 또 고기를 먹는다. 우리는 운전을 하며 과자나 견과류를 먹거나 껌을 씹지만, 우리와 함께 한 몽골인 운전사는 양갈비를 뜯었다.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에서는 양고기를 먹었다. 양고기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양고기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내 대답은 “어, 근데 정말 그랬어”다. 몽골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양 한 마리는 먹은 것 같다.

울란바토르에 유명한 북한식당이 있다고 하길래 바다라크 씨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냉면을 먹었다. 냉면이 나오자 바드라크 씨가 공기밥에 불고기를 잔뜩 올리며 말했다. “정말 한국사람들은 이 음식을 왜 먹는 겁니까? 차갑고 밍밍한 국물에 아무 맛이 안나는 면을 넣은 이 음식이 그렇게 맛있습니까? 게다가 고기도 겨우 두세 점 올라있을 뿐이잖아요.” 그는 면발을 밀어 넣는 나를 보며 이렇게 투덜거렸다.
언젠가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곳 몽골. 지금은 언젠가 꼭 한 번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됐다. 드넓은 초원과 메마른 사막, 밤하늘의 별, 들판을 붉게 물들이는 황혼, 그리고 게르에서 먹었던 양고기와 보드카, 함께 한 일행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던 마두금의 선율…. 이 모든 것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서울이다.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네온사인이 환하고, 오가는 차들의 불빛이 어지럽다. 세상이란 왜 이리 복잡하게 생겨먹은 것일까. 세상이 지평선과 노을, 강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심플하고 담백해지지 않았을까. 어딘가에서 긴 긴 말울음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밤이다. 몽골의 지평선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