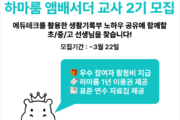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장의 부담과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최근 학점 이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행정예고안을 내놨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행정예고안의 핵심은 공통 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를, 선택 과목은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점 이수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세부 운영을 교육부 지침에 맡긴 구조는 유지됐다.
현장 교원들의 문제의식은 비교적 분명하다. 고교학점제의 어려움은 이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인력과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목 다양화를 감당해야 하고 평가와 기록에 따른 교원의 행정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입 제도와의 연계 불안까지 겹치며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온 것이 핵심이다. 기준 조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다.
출석 중심의 이수 기준 역시 신중히 봐야 한다. 관리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성취 기반 교육이라는 학점제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도 적지 않다. 기준 완화가 곧 학습의 형식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가 방식 개선과 학습 지원 체계 보완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는 충분히 타당하다.
학점 이수 기준을 법·제도적으로 분명히 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교원 증원과 과목 편성 지원 등 운영 여건 개선을 전제로 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대입과의 연계 문제 역시 외면한 채 제도만 밀어붙인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의 불안은 해소되기 어렵다.
고교학점제의 취지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형식적 완화와 부분 조정만으로는 지금 현장의 혼란을 멈출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속도를 앞세운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한 차분한 재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