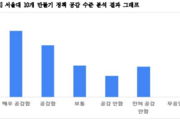지난 12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개인별 성적표가 발표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학입시가 시작되었다. 이에 각 대학은 대학별로 전형을 거쳐 1월 중순부터 합격자 발표를 시작하여 2월초까지 계속해서 발표가 될 예정이다.
퇴근 무렵. 우리 반 한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 학생은 내신이 좋지 않아 수시 모집을 포기하고 오직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아이였다. 그런데 방학이후, 대학 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내심 걱정을 많이 했던 학생이기도 하였다.
"선생님, 저 OO입니다."
"그래, 잘 있었니? 무엇보다 대학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저 OO대학 OO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원서는 어떻게 작성했니?"
"선생님, 제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그랬구나. 아무튼 축하한다."
그 아이와 전화를 끊고 난 뒤, 담임인 나와 상의 한번 하지 않고 대학 원서를 작성한 것에 조금은 서운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 그 아이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 그 아이는 방학을 하기 전, 원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학교주소, 졸업예정일자, 학교고유번호 등)과 정보 모두를 다 알고 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서접수 마감일 날, 마지막까지 눈치작전을 벌여 경쟁률이 제일 낮은 학과에 지원을 한 것이 적중했다며 그 아이는 좋아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 아이를 지켜본 담임으로서 느끼는 것이지만 그 과는 제자의 적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학과였다. 내심 그 아이가 끝까지 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마저 생기기까지 했다.
대부분의 수시 모집은 학기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 질 수가 있으나 정시모집은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하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서작성 또한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구태여 학교에 나와 담임선생님과 함께 의논을 하여 원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 생활기록부 또한 학생부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 교육부로 이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서접수 시 학생 본인이 온라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학생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학생 본인이 대학과 학과 선택을 잘 하여 합격을 하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합격을 하지 못해 재수를 해야만 할 경우이다. 특히 올해처럼 난이도 조정에 실패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어떤 대학 무슨 학과를 선택하기란 여간 힘들지가 않다. 하물며 일선학교 고3 담임뿐만 아니라 입시 전문가들조차 진학상담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상위권보다 중하위권의 학생들이 대학을 결정하는데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걸로 밝혀졌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원점수가 아닌 백분율과 표준점수로 대학을 결정하기란 여간 힘들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아서 결정하여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다. 본인의 적성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붙으면 된다는 식의 대물림되는 현행 입시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만약 그 아이가 학과에 적응을 못해 대학을 그만두게 된다면 자신을 끝까지 상담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분명 담임인 나를 원망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일선 학교 담임선생님은 수능시험이 끝난 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생들로부터 가채점을 하게 하여 사전에 진학상담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 대학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번 대학원서접수 마감일에 빚어진 인터넷 사이트 접속 폭주로 인한 피해에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가 도박이 아닌 만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선택만이 소질을 개발해 나가는 최선의 방책이며 이로 인해 국가 예산도 줄일 수 있다. 매년마다 학과에 적응하지 못해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일류대학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붙자는 식의 입시제도가 원인이라고 본다.
방학이후, 연락이 두절된 제자로부터 '대학 합격'이라는 희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아야 할텐데 오늘 왠지 모를 씁쓸함이 감도는 것은 왜일까?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