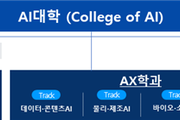그런데 이는 핵심어인 ‘염불’과 ‘잿밥’만 남겨두고 조금씩 변형해 쓰기도 한다. ‘제사보다 젯밥에 정신이 있다.’라는 속담이 그 예다. 이도 중요한 ‘제사’를 팽개치고, 사사로운 ‘젯밥’에 관심을 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속담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할 단어가 있다. ‘잿밥’과 ‘젯밥’이다. 두 말은 형태와 발음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다.
특히 ‘잿밥’보다는 ‘젯밥’에 익숙하다보니 ‘염불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이라고 틀리게 쓸 우려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잿밥’은 ‘재(齋)’와 ‘밥’의 결합이며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라 사이시옷(ㅅ)이 붙어 생긴 합성어이다. 이에 비해 ‘젯밥’은 ‘제(祭)’에 ‘밥’의 결합으로 역시 한글맞춤법 규정에 의해 사이시옷(ㅅ)이 붙은 것이다. ‘제삿밥’과 같은 말이다. 이는 제사를 지내려고 차려놓은 밥 또는 제사에 쓰고 물린 밥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재(齋)’는 불교 용어다. ‘절에서, 부처에게 드리는 공양. 성대한 불공이나 죽은 이를 천도(薦度)하는 법회. 승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공양(供養)을 올리면서 행하던 불교 의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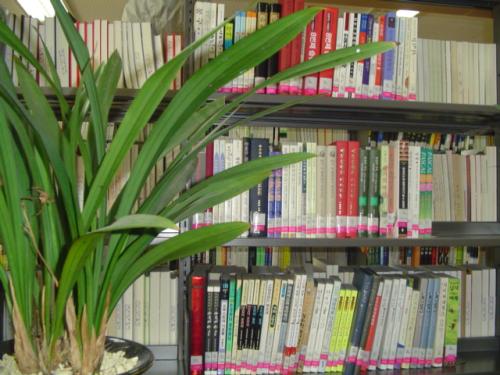
‘재(齋)’와 관련된 단어로 ‘사십구재’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죽은 지 49일 되는 날에 지내는 재이다. ‘칠칠재(七七齋)’라고도 한다. 이는 ‘천도재(薦度齋)’의 일종이다. 이것도 죽은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 의식이다. ‘영산재(靈山齋)’도 마찬가지다. 이도 49재 가운데 하나로 사람이 죽은 지 49일 만에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이다. 이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있다.
속담에도 ‘재’와 관련된 것이 있다. ‘재 들은 중(평소에 좋아하거나 바라던 일을 하게 되어 신이 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나 ‘재에 호 춤(재를 올리며 호나라 춤을 춘다는 뜻으로,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호사를 부려 흉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쓴다. ‘제’는 ‘제사(祭祀)’이다. 뜻은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을 말한다. ‘제사를 드리다./제사를 지내러 고향에 내려갔다.’라고 쓴다. 여기에서 나온 동사가 ‘제사하다’이다. ‘조상에게 제사하다.’라고 쓴다. 이와 관련된 속담은 ‘제사 덕에 이밥이라(무슨 일을 빙자하여 거기에서 이득을 얻는다는 말)’, ‘제사를 지내려니 식혜부터 쉰다(공교롭게 일이 틀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가 있다.
‘제’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제사’ 또는 ‘축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기우제/예술제/위령제/추모제’가 그 예다. ‘삼우제(三虞祭)’도 제사와 관련된 단어다. 이는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로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한다. 여기서 ‘우(虞)’는 ‘생각하다,근심하다’란 뜻인데 이를 ‘삼오제’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의미를 헤아려 바르게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