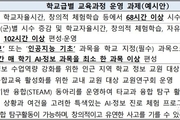지도에서 멀리 있는 만큼 가는 길도 멀다. 목포까지, 흑산도로 다시 홍도로 가는 뱃길이 제법 피곤을 몰고 온다. 그러면서 마음은 들떠 있다. 붉은 보석 같은 섬이 기다려진다. 지는 해에 몸을 붉히기에 홍도(紅島)라고 불렀다는 섬이 궁금해진다.
홍도는 짙푸른 바닷물에 떠 있는 보석처럼 보인다. 섬 전체가 소인국의 나라 같다. 나무와 바위가 아기자기하다. 기암괴석과 절벽에 위태롭게 자생하는 나무와 꽃은 멋을 부리고 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자란 것이 아닌 듯하다. 마치 조물주가 하늘에서 내려와 손으로 만든 작품처럼 느껴진다.
홍도는 푸른 색 천국이다. 자연으로 뒤덮여 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 천연보호구역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마을 이외에 산은 들어갈 수 없다.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채취나 반출이 철저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홍도의 첫인상은 충격적이다. 보이는 것이 온통 여관이다. 음식점들까지 산 중턱을 따라 닥지닥지 붙어 있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지정되어 있고, 인위적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인가.
짐을 풀고 홍도의 속살을 본다. 섬 전체가 비교적 기복이 큰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높은 곳에 올라서 보니 해안선의 드나듦이 심하다. 오랜 세월을 두고 파도가 암벽에 부딪쳐 이루어 놓은 흔적이다. 해안의 경사도 급하다. 주변 수풀이 원시림처럼 느껴진다. 짙은 바위 빛도 수천 년의 세월을 머금은 듯하다. 칼로 그은 듯 내리뻗은 절벽 사이로 조그만 나무가 앉아 있다. 노송, 백동백이 마치 솜씨 좋은 노인이 인공으로 분재를 심어놓은 것 같다.

섬을 돌고나니 허기가 동한다. 바다의 비린 냄새를 맡으며 숙소에 도착한다. 순간 다시 충격에 휩싸인다. 좁은 식당이 도떼기시장이다. 식당 주인은 여행사별로 앉으라고 호령이다. 모자라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해도 주인은 못 들었는지, 듣고도 모르는 체 하는지 갖다 줄 생각을 안는다. 관광지라 그렇겠지 하면서 마음을 비웠지만 차가운 인심은 못내 서운하다.
홍도에도 검은 밤이 내려온다. 홍도는 국토의 끝에 있어서 고요할 만도 한데 오히려 더 시끄럽다. 부두는 포장마차가 점령한다. 뭍사람의 호주머니를 열겠다는 호객 행위에 일찌감치 취해 버린 관광객의 소리가 부딪친다. 섬사람들은 우럭, 붕장어, 농어를 팔면서 자연산을 강조한다. 너무 그러니까 자연산이 아닐 거라는 의심이 생긴다. 파도 소리와 어둠에 막혀 버린 섬은 밤새도록 시장바닥 소리를 끌어 앉고 있다.
아침에도 마찬가지다. 귓가에 들려오는 것은 새소리도 아니다. 부두에서 유람선 승선 안내가 들린다. 가이드 아저씨는 아침을 먹어야 한다며 문을 두드리고 간다. 밤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부터 보챈다.
8시에 아침밥을 먹고, 유람선에 오른다. 홍도는 섬 밖에서 배를 타고 한 바퀴 도는 여행이다. 배는 출발과 동시에 바다로 빨려 간다. 그리고 나타난 비경에 사람들은 감탄을 한다. 우리나라 섬이 다 아름답지만 이곳 섬은 청청 해역에 떠 있어 더욱 빛난다. 맑은 바닷물과 어울려 있어 그림 같은 풍광을 만들고 있다. 작은 섬이라 애처롭기도 하지만, 저 도도하고 거대한 바다의 힘에도 끄떡 않고 버티는 야무짐이 있다. 순간 손에 잡힐 듯 앉아 있는 섬이 살아 있다는 생각이 스친다. 살아서 육지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느냐 몸을 꿈틀거리고 있는 듯하다.

유람선 가이드는 구수한 남도 사투리로 홍도의 아름다움을 늘어놓는다. 바위섬 하나하나에 감상 포인트와 전설까지 들려준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가이드가 사진 찍는 안내원으로 변한다. 사진 값은 물론 비싸다. 그 사이에 해상 회집이 등장한다. 어젯밤 부두에서 포장마차를 하던 사람들이 조그만 배를 타고 와서 회를 떠 놓고 판다. 가이드는 국내 최초의 바다 횟집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상업적 행위에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 씁쓸하다.

이틈에 선상에는 빠른 대중가요가 흐른다. 회가 올라오고 술 냄새가 풍긴다. 거기에 맞춰 일부 관광객은 엉덩이를 흔든다. 세상을 힘들게 살았는지 오늘 모든 근심, 걱정을 날려버릴 기세다.
일상에 쫓겨 살다보니 남도 여행은 처음이었다. 멀리 가는 만큼 기대도 많았다. 그러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내가 여행을 즐긴 것인지, 여행사에 몸을 맡긴 것인지 헷갈렸다. 밥 먹고, 배 타고, 관광지에 우르르 몰려다녔다. 내 의지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여행은 내 안의 나를 만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자연을 만나면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야 한다. 남도 끝자락에 있는 섬의 고요도 바다의 새소리도 듣지 못한 여행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