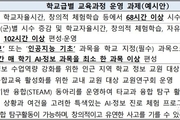월간잡지 「좋은 생각」에서 읽었던 한 구절이 생각난다.
어느 시인이 그의 친구들과 강원도 설악산에 탁족(濯足)을 하며 나눈 얘기로 기억한다.
“우리 조지훈 선생(시인)은 말이야, 한 학기에 강의를 세 번 하셨지. 한번은 개강, 다른 한번은 종강이고, 나머지가 학기 중간 봉급일이었지. 검은 두루마기 차림의 준수한 모습이었다네.”
“우리 장욱진 선생(서양화가)은 말일세, 강의실이 대폿집이야. 흥이 나시면 당신의 고무신을 벗어서 애들한테도 돌리곤 했었지.”
“구자균 교수(국문학자)는 어떤데, 학생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해놓고서 교탁 뒤에 쪼그리고 앉아서 소주병을 홀짝 거리셨지. 대취하셔서 제자가 연구실에 모셔다 드린 적도 있었고.”
“내(경봉선사) 큰 스님은 10년 동안 한 말씀도 안 해 주시다가 궁금해서 부처가 뭐냐고 묻자 주장자로 내 머리를 탁 치더란 말이지.”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길러낸 스승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스승도 제자도 없음에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왜 안 그렇겠는가. 자기 자신만 챙기는 개인주의 세태가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지 못하는 혼탁한 현실이 야속할 따름이다. 어렸을 적 스승들이 가르친 대로 생활 했더라면 세상이 이렇게 변했을까.
조선시대 대학자요 문자가인 송순이 87세 때 그의 제자 100여명이 그의 건강을 축원하고자 누각 면앙정에 모여 잔치를 한 일이 있다. 그 후에 제자 4명이 손가마를 하여 스승을 멘 후에 언덕을 내려온 것을 들면서, “누가 내 가마를 메주고 나는 누구를 메어줄 것인가” 라는 구한말 문장가 이건창 선생의 한탄은 고금(古今)을 통틀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말하는 것 같아서 씁쓸할 뿐이다.
이번에 교총에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자존감 상실과 교원과 학부모, 학생 간 신뢰가 낮아져서 점점 가르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났다. 그래도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국가의 백년대계이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을 존중하고, 학생을 배려하고 서로를 믿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에 대해 한번 말씀 드리고 싶다.
“우리 오광록 교수님(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말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데모하고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도 다른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시오? ‘자네를 믿겠네, 나는 자네를 정말 믿는다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었단 말이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