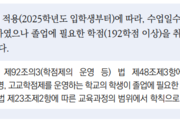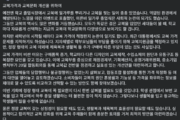1. 그 해 여름에 내가 겪은 일은 자못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20대 초반의 청년장교 시절에 겪은 일이라 나의 판단력과 인격이 미숙하기도 했겠지만, 그 당혹감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된다. 그리고 그 일을 겪고서도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 좀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40년 전의 일인데도, 짐짓 대범한 척 해도, 그 일이 자주 상기되는 것은 그것이 작은 ‘상흔(trauma)’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리라.
그 해 여름 그 날로 돌아가 보자. 그 날은 S시의 교사 예비군들이 내가 근무하는 부대에 들어와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날이었다. 나는 훈련 담당 교관이었다.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예비군 훈련을 하도록 한 것이다. 8시에 훈련 부대 편성을 마치고 9시에는 훈련에 들어가야 하는 일정이었다.
나는 늘 해 오던 편성 지침에 따라, 그 날 참석한 예비군들을 거주지별(동네별)로 계급 순에 따라 훈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먼저 개인별 훈련 참석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 그들이 살고 있는 동별로 집합을 시켰다. 그리고 현역 근무 시의 계급에 따라 소대와 분대를 편성하고 각 부대 편제에 맞는 개인화기와 장비를 보급하였다. 훈련 부대 편성을 마치고 대대장에게 훈련 시작 보고를 하려고 대대장실에 갔다.
대대장은 나에게 훈련 편성을 어떻게 하였느냐고 확인하였다. 나는 일반 지침에 따라 각자 살고 있는 거주지별로 계급에 따라 소대와 분대 편성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대대장이 편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병장으로 나왔다. 그런데 일부 예비군들은 거주지 중심으로 편성된 대오를 이탈하여 각기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별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류상 같은 동네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자주 만나지 않으니 동료 예비군이라고는 해도 낯설었을 것이다. 늘 함께 생활하는 근무지 학교의 동료 예비군은 친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대장은 즉각 지금 해 놓은 훈련 부대 편성을 해체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교사들이 근무하는 직장 중심으로, 즉 학교 단위로 훈련 부대를 편성할 것을 명령했다. 나는 일반 지침에 따라 유사시 거주지별로 예비군 편성이 되어 있고, 훈련 또한 그 원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음을 말씀드렸으나, 대대장은 오히려 나의 경험 미숙을 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