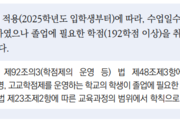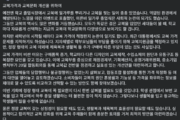논객은 검객과 닮았다. 어려운 상황에서 홀연히 나타나 나쁜 사람들을 혼내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런 검객···. 이처럼 논객은 어떤 문제 사태에 즈음하여 잠시 방향을 잡아주고 자유롭게 떠나야 한다. 하지만 지식과 논쟁도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날 논객은 한바탕 잘 싸워서 상대방 코를 납작하게 하려는 말싸움의 고수들 같다. 그리고 이러한 논객들을 열심히 모방하려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토론교육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첫째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耳鳴) 증세가 있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뜰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에서 앵하고 울리는 소리가 났다. 아이는 그 소리에 신기하여 혼자서 신이 났다. 그래서 동무에게 가만히 이렇게 속삭였다. “얘, 너 이 소리 좀 들어 봐. 내 귀에서 앵 소리가 난다. 피리 부는 소리, 생황 부는 소리가 다 들린다.”
그 동무가 귀를 가져다 맞대고, 아무리 들어보아도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이명이 있는 아이가 딱하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남이 자기 귀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시골 사람과 같이 잠을 자는데, 그 시골 사람이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았다. 마치 숨이 막히는 듯, 휘파람을 부는 듯, 탄식을 하는 듯, 한숨을 쉬는 듯, 불을 부는 듯, 물이 끓는 듯, 빈 수레가 덜컥거리는 듯한데, 들이쉴 때는 톱을 켜는 듯하다가, 내쉴 때는 돼지가 씨근거리는 듯했다. 같이 자던 사람이 흔들어 깨우자, 그는 불끈 화를 내면서 말했다.
“내가 언제 코를 골았단 말이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문집 <연암집(燕巖集)> 가운데 ‘공작관문고 자서(孔雀館文稿自序)’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연암이 이런 비유로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연암의 안타까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아하!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은 남이 몰라주어서 늘 걱정이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남이 일깨워주면 마땅찮다고 생각한다. 어찌 이명 있는 자와 코 고는 자에게서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데는 이보다 더 심한 바가 있다.”
사람들의 인식과 앎이 얼마나 자기 안에 갇혀 있기 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내가 남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동시에 내가 나를 이해한다는 것도 얼마나 높은 경지를 요하는 것인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고 보니 지금의 세태야말로 내 주장만이 넘쳐나는 시대이다. 주장이 센 사람들일수록 내가 아는 것만이 사실(fact)이라는 것을 강변하며 상대를 허위로 몰아 부치기에 매몰된다. 사람들은 마냥 “내가 아는 걸 너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만 맞다.”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모두 틀렸다.”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점점 더 그럴듯하게 말하려 한다. 꼭 거창한 것만 골라 말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미디어 앞에 나서보려고 한다. 소통의 형식과 채널은 많아졌지만 사람이 서로 알아서 훈훈해지는 진정한 소통은 메말라간다.
둘째
‘논객(論客)’ 전성기 시대이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만큼 더 강력하게 글 쓰라고 부추기고, 더 튀면서 말하라고 끌어내는 미디어의 유혹이 강렬하다고나 할까. 마치 무림(武林)의 즐비한 고수들이 각기 제 나름의 논리로 무장하여 반대 논리를 가진 상대와 수많은 전선(戰線)을 형성하며 치열하게 싸움을 해대는 것이다. 그야말로 논객들의 싸움이다. 주장의 깃발을 흔들면 금방 따르는 졸개들이 생겨서 호응의 박수가 따르기도 하고, 더러는 한판 겨루자고 딴죽을 걸고 덤비는 녀석도 있다. 논객으로서의 자족감을 느낀다. 한번쯤 해 본 사람은 논객의 무성함과 더불어 ‘논객스러움’의 묘미를 알리라.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